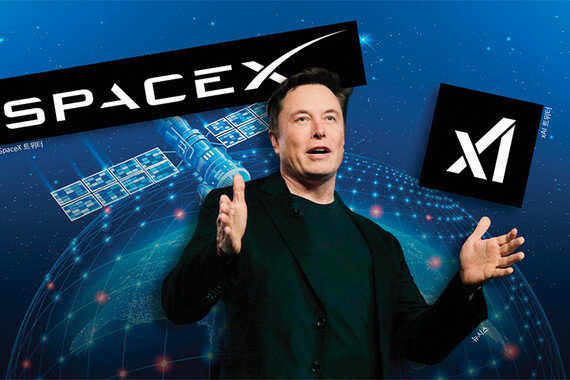최근 지하철 무대는 역뿐만 아니라 전동차 안에까지 진출했다. 7월30일 온수역과 태릉입구역 사이를 달리는 7호선 열차 안에서는 잉카의 민속음악과 인형극, 탭댄스의 흥겨운 공연이 벌어졌다. 도시철도공사에서 운영하는 문화열차 ‘위민 메트로’(Women-Metro) 안에서 70분간의 공연이 펼쳐진 것. 전동차의 구조상 제한된 관객들만 볼 수 있었지만 뜻하지 않은 공연을 만난 승객들은 무척 즐거워했다.
전동차 안에서 흥겨운 만남
지하철 ‘무대’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무대가 설치되어 있는 지하철역은 을지로입구역, 공덕역, 이수역, 김포공항역 등 손으로 꼽을 정도다. 개통된 지 오래된 지하철 역사일수록 공연하기에 열악한 상황이다. 출연자들이 역사 한구석에 자리를 깔고 공연을 하면 지나던 사람들이 그 자리에 서서 지켜본다. 물론 조명 같은 것은 꿈도 꿀 수 없다. 그야말로 가난한 예술인들의 가난한 무대다.

외국의 경우, 지하철역에서 공연하는 ‘메트로 아티스트’들은 대부분 ‘버스킹’(Busking)족이다. 이들은 악기를 연주하거나 간단한 장기를 보여주며 푼돈을 구걸한다. 자신의 예술을 선보이는 동시에 아르바이트도 하는 셈이다.
그러나 한국의 ‘메트로 아티스트’들이 받는 출연료는 전혀 없다. 또 누구나 공연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디션을 거쳐야만 공연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답답하고 탁한 공기 속에서 한 푼의 보수도 없이 땀 흘리며 공연을 하는 ‘메트로 아티스트’들은 어떤 꿈을 꾸고 있을까?

“반년 이상 지하철 무대에서 계속 연주하는 것은 그동안 나름의 음악적 발전을 이룰 수 있었기 때문이죠. 또 지하철역에는 내 음악을 들어주는 관객이 항상 있으니까요.” 이씨는 “적지 않은 연주자들이 정식 무대에 서기 힘든 현실이다. 지하철 예술무대는 관객도, 연주자도 불편한 부분이 많지만 그래도 많은 공연 기회와 자유를 준다”고 말한다.
올해 6월부터 지하철역에서 ‘색을 입자!’라는 무용 공연을 선보이고 있는 선나영씨도 순천향대 무용과를 졸업한 무용인이다. 그는 무용공연의 객석이 무용 관계자들로만 메워지는 현실이 아쉬워서 지하철 무대를 찾았다. “사실 무용은 아직 대중화되지 않은 부분이 많죠. 그런 데 비해 지하철 무대에서는 일반인과 함께 저의 무용을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무용의 경우는 부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무대 바닥이 갖춰져야 하기 때문에 준비 과정에 더 공을 들여야 한다. 바닥을 깔고 분장을 하는 데 2시간이 훌쩍 지나가지만, 정작 공연은 10분 정도에 그치기도 한다. 선씨는 ‘기본적으로 바닥이 고르게 되어 있어야 춤을 추는 데 지장이 없다. 그리고 작품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희망했다.
공연 사고나 에피소드 적지 않아

평균 관객 수 240여명, 올해 상반기에만 300여 회가 넘는 공연이 열린 지하철 예술무대는 도심 속의 페스티벌로 정착할 길을 도모하고 있다. “초창기에는 ‘땅속에서도 공연을 한다’는 자체가 화젯거리였죠. 이제는 지하철 무대가 제대로 된 공연문화로 정착되어야 할 시기입니다. 기획자의 입장에서는 보다 많은 예술 전공자들이 지하철 무대를 찾았으면 좋겠어요. 예술학교에서 음악이나 무용 등을 전공하고도 본격적인 무대에서 관객을 만나는 기회를 갖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학생들에게 지하철 무대가 기회와 용기를 주는 장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일공의 공연기획자 정성진씨의 말이다.
메트로 아티스트들에게도 바람이 있다. 좀더 무대다운 무대나 관객들의 진지한 자세를 주문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들의 가장 큰 희망은 재정적 지원. 현재 서울시나 지하철공사 등은 지하철 예술무대에 거의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 도심을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에게 ‘예술’이라는 신선한 선물을 선사하는 이들은 ‘큰 도움을 바라는 게 아니다. 교통비나 점심값 정도의 지원은 있었으면 좋겠다’는 소박한 바람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