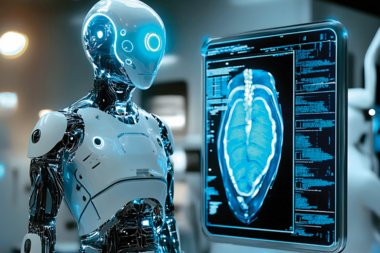역사상‘유럽 통일’에 가장 근접한 인물을 꼽는다면 카이사르, 샤를마뉴, 나폴레옹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이 정복한 영토를 보자면 통일에는 한참 못 미친다. 카이사르는 영국을 제외한 북부 유럽 쪽으로는 거의 진출하지 못했다. 샤를마뉴 대제는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주변의 땅을 차지했을 뿐이고, 나폴레옹은 그에도 미치지 못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유럽 통합 작업은 무력으로 하지 못했던 그 일을 정치적 합의와 국민들의 의사를 물어 하려는 것이다. 국경선을 아예 없애는 정도는 아니지만 수천년 유럽 역사-아니, 다른 어느 대륙을 통틀어서도-의 신기원을 여는 일대 ‘역사(役事)’다.
지난 수십년 동안 착착 진행돼온 이 통합 작업은 이제 막바지 피치를 올리고 있다. 그 고비는 유럽연합 헌법안에 대한 국민투표다. 첫출발은 좋았다. 2월에 스페인의 비준 국민투표 결과가 압도적인 찬성으로 나와 첫 번째 관문을 무사히 통과한 것이다. 유럽연합 헌법이 애초 계획대로 2007년 발효되려면, 내년 말까지 25개 모든 회원국에서 헌법안이 비준돼야 한다. 25개의 장애물을 넘어야 하는 만만찮은 ‘레이스’인 셈이다.
그 출발선을 스페인으로 한 데는 스페인이 유럽통합 찬성론이 높다는 사정이 많이 작용했겠지만, 이 나라의 역사나 문화적 특성을 놓고 볼 때도 적절한 선택이었던 것 같다. 유럽의 변방으로 어느 나라보다 종교적·인종적·문화적 갈등을 많이 겪은 나라가 스페인이기 때문이다. 몇 년 전 유럽에서 상당한 흥행 실적을 거둔 ‘스패니시 아파트먼트’라는 영화가 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로 1년간 어학연수를 간 프랑스 청년이 어느 아파트에서 유럽 도처에서 몰려온 6명의 학생들과 동거하면서 겪는 해프닝을 그린 영화다. 제목인 ‘스페인 아파트’가 흥미롭다. 글자 그대로 이야기의 무대인 숙소를 뜻하기도 하지만, 이 말에는 속어로 ‘여러 문화가 섞여 있는 곳’이라는 뜻도 있다. 이런 뜻을 갖게 된 데는 아마도 앞서 말한 스페인의 굴곡진 역사가 투영된 것이 아닐까.
아무튼 프랑스에서 독일, 벨기에, 이탈리아, 영국, 덴마크, 스페인까지 문화와 언어가 다른 학생들이 함께 어울리면서 갖가지 해프닝을 벌인다. 소란스러운 가운데서도 영화는 유럽통합에 거는 낙관과 희망을 암시하고 있는 듯하다. 첫 국민투표 통과를 미리 앞당겨 축하하는 가벼운 한바탕 파티쯤으로 봐도 무방할 것이다.
이 영화 속 젊은이들이 유학을 갈 수 있었던 것부터가 유럽통합의 선물이다. 이들에게 경비를 댄 것은 ‘에라스무스’라는, 유럽통합을 대비해 만들어진 대표적인 고등교육 교환 프로그램이다. 물론 유럽통합 전망이 낙관적인 것만은 아니다. ‘스패니시 아파트먼트’처럼 시끌벅적한 농담과 유머로 풀어낼 만큼 결코 느긋하지 않다. 남은 24개국 중 국민투표나 의회 비준 전망이 어두운 나라들도 상당수다. 통합의 성사뿐만 아니라 ‘통합 이후’의 미래에 대한 그림도 상큼한 수채화 빛은 아니다. 그 같은 기대와 불안은 좀더 진지한 작가들에 의해 탐색되고 있다. 잘 알려진 것처럼 키에슬로프스키의 ‘블루’ ‘레드’ ‘화이트’ 3부작이 그중 하나일 것이다. 키에슬로프스키는 유럽의 세 도시에 살고 있는 세 명의 여자의 이야기를 통해 유럽인들의 머릿속을 교차하는 명암의 감정을 은유했다. 예컨대 ‘블루’에서 여주인공의 죽은 남편이 유럽통합에 바치는 협주곡을 작곡하는 중이었다는 것은 그 희망과 불안이 뒤섞인 상황을 내비친다. 유럽통합이 원대한 청사진대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유럽인들은 왜 그처럼 통합을 원할까? 한두 가지 이유로 설명할 순 없겠지만 몇 가지 단서를 꼽을 수는 있다. 혹자는 유럽의 왕가 간에 혼인으로 맺어진 관계를 그 배경으로 들기도 한다. 절대강국 미국에 맞서기 위한 현실주의적 전략으로 설명할 수도 있다. 다만 지금의 통합 움직임은 유럽의 역사를 돌아보자면 오히려 예외에 가깝다는 점이 시사하는 역설적 이유를 생각해볼 수 있다. 유럽의 나라들은 과거 오랫동안 동반자 관계라기보다는 경쟁자, 적대자였다. 어느 대륙보다 숱한 전쟁으로 얼룩졌다. 제1·2차 세계대전도 말이 ‘세계’ 대전이지 사실상 유럽 내전이었다. 지금의 유럽통합은 그 끔찍한 비극에 대한 반작용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같은 침탈과 갈등의 역사를 경험한 아시아는 왜 그렇지 않은가. 여러 사정이 있겠지만 일본의 원죄에 대한 기억이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일 것이다. 그건 독일도 마찬가지지만 일본에 관한 기억은 과거형이 아닌 현재형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현재형이라는 데 대한 실감은 요즘 갈수록 더 확실해지고 있다.
지난 수십년 동안 착착 진행돼온 이 통합 작업은 이제 막바지 피치를 올리고 있다. 그 고비는 유럽연합 헌법안에 대한 국민투표다. 첫출발은 좋았다. 2월에 스페인의 비준 국민투표 결과가 압도적인 찬성으로 나와 첫 번째 관문을 무사히 통과한 것이다. 유럽연합 헌법이 애초 계획대로 2007년 발효되려면, 내년 말까지 25개 모든 회원국에서 헌법안이 비준돼야 한다. 25개의 장애물을 넘어야 하는 만만찮은 ‘레이스’인 셈이다.
그 출발선을 스페인으로 한 데는 스페인이 유럽통합 찬성론이 높다는 사정이 많이 작용했겠지만, 이 나라의 역사나 문화적 특성을 놓고 볼 때도 적절한 선택이었던 것 같다. 유럽의 변방으로 어느 나라보다 종교적·인종적·문화적 갈등을 많이 겪은 나라가 스페인이기 때문이다. 몇 년 전 유럽에서 상당한 흥행 실적을 거둔 ‘스패니시 아파트먼트’라는 영화가 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로 1년간 어학연수를 간 프랑스 청년이 어느 아파트에서 유럽 도처에서 몰려온 6명의 학생들과 동거하면서 겪는 해프닝을 그린 영화다. 제목인 ‘스페인 아파트’가 흥미롭다. 글자 그대로 이야기의 무대인 숙소를 뜻하기도 하지만, 이 말에는 속어로 ‘여러 문화가 섞여 있는 곳’이라는 뜻도 있다. 이런 뜻을 갖게 된 데는 아마도 앞서 말한 스페인의 굴곡진 역사가 투영된 것이 아닐까.
아무튼 프랑스에서 독일, 벨기에, 이탈리아, 영국, 덴마크, 스페인까지 문화와 언어가 다른 학생들이 함께 어울리면서 갖가지 해프닝을 벌인다. 소란스러운 가운데서도 영화는 유럽통합에 거는 낙관과 희망을 암시하고 있는 듯하다. 첫 국민투표 통과를 미리 앞당겨 축하하는 가벼운 한바탕 파티쯤으로 봐도 무방할 것이다.
이 영화 속 젊은이들이 유학을 갈 수 있었던 것부터가 유럽통합의 선물이다. 이들에게 경비를 댄 것은 ‘에라스무스’라는, 유럽통합을 대비해 만들어진 대표적인 고등교육 교환 프로그램이다. 물론 유럽통합 전망이 낙관적인 것만은 아니다. ‘스패니시 아파트먼트’처럼 시끌벅적한 농담과 유머로 풀어낼 만큼 결코 느긋하지 않다. 남은 24개국 중 국민투표나 의회 비준 전망이 어두운 나라들도 상당수다. 통합의 성사뿐만 아니라 ‘통합 이후’의 미래에 대한 그림도 상큼한 수채화 빛은 아니다. 그 같은 기대와 불안은 좀더 진지한 작가들에 의해 탐색되고 있다. 잘 알려진 것처럼 키에슬로프스키의 ‘블루’ ‘레드’ ‘화이트’ 3부작이 그중 하나일 것이다. 키에슬로프스키는 유럽의 세 도시에 살고 있는 세 명의 여자의 이야기를 통해 유럽인들의 머릿속을 교차하는 명암의 감정을 은유했다. 예컨대 ‘블루’에서 여주인공의 죽은 남편이 유럽통합에 바치는 협주곡을 작곡하는 중이었다는 것은 그 희망과 불안이 뒤섞인 상황을 내비친다. 유럽통합이 원대한 청사진대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유럽인들은 왜 그처럼 통합을 원할까? 한두 가지 이유로 설명할 순 없겠지만 몇 가지 단서를 꼽을 수는 있다. 혹자는 유럽의 왕가 간에 혼인으로 맺어진 관계를 그 배경으로 들기도 한다. 절대강국 미국에 맞서기 위한 현실주의적 전략으로 설명할 수도 있다. 다만 지금의 통합 움직임은 유럽의 역사를 돌아보자면 오히려 예외에 가깝다는 점이 시사하는 역설적 이유를 생각해볼 수 있다. 유럽의 나라들은 과거 오랫동안 동반자 관계라기보다는 경쟁자, 적대자였다. 어느 대륙보다 숱한 전쟁으로 얼룩졌다. 제1·2차 세계대전도 말이 ‘세계’ 대전이지 사실상 유럽 내전이었다. 지금의 유럽통합은 그 끔찍한 비극에 대한 반작용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같은 침탈과 갈등의 역사를 경험한 아시아는 왜 그렇지 않은가. 여러 사정이 있겠지만 일본의 원죄에 대한 기억이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일 것이다. 그건 독일도 마찬가지지만 일본에 관한 기억은 과거형이 아닌 현재형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현재형이라는 데 대한 실감은 요즘 갈수록 더 확실해지고 있다.














![[영상] “달러 수급 불균형 더 심화… <br>대비 안 하면 자신만 손해”](https://dimg.donga.com/a/570/380/95/1/ugc/CDB/WEEKLY/Article/69/52/0d/26/69520d26165ea0a0a0a.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