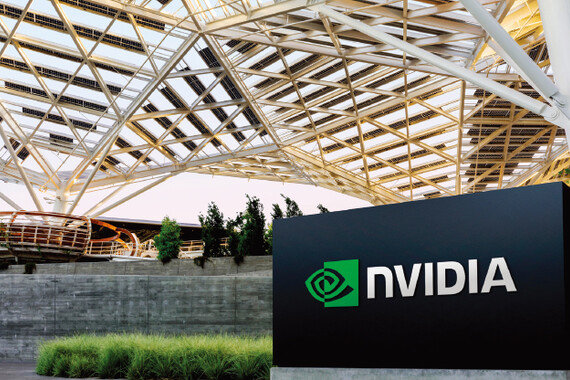국세청의 세금 추징 가운데 가장 논란을 빚는 부분이 무가지(無價紙)의 일정 부분을 접대비로 규정한 것. 전체 추징세액 5056억 원 가운데 무가지에 대한 법인세 추징이 688억 원으로 가장 많다. 손영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신문사는 무가지를 판촉을 위한 경비로 주장하지만 공정거래법상 신문고시 등을 감안해 유가지(有價紙)의 20%가 넘는 무가지는 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접대비로 간주해 세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접대비는 일정 한도 초과분은 비용으로 처리가 안 되어 세금을 부과한다. 반면 판촉비나 광고비는 전액 비용으로 처리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조차 “의견이 대립되는 무가지에 대해 국세청이 자체 규정인 예규에 따라 접대비로 규정, 과세한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기업회계 등을 담당하는 회계사들은 대부분 무가지를 판촉비나 광고선전비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회계연구원의 기업회계 담당 권성수 회계사는 “접대비란 업무와 관련있는 특정인에게 돈·물품 등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불특정 예비 독자층에 ‘우리 신문을 구독해 달라’는 의미로 나눠주는 무가지는 판촉비나 광고선전비로 보는 게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즉, 접대비란 △업무 관련성 △특정인이라는 조건을 충족할 때만 인정될 수 있다는 것. 예를 들어 A라는 기업이 길거리에서 불특정다수에게 자사 상품을 나눠주는 경우 이는 접대비가 아닌 판촉비라는 분석이다.
다인세계법인 한윤덕 대표도 “접대비란 공짜로 ‘기업의 생산물’을 받는 이들이 누구인가가 중요하다”며 “무가지는 판촉활동으로 보는 게 옳다”고 말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양로원이나 고아원에 무료 공급한 무가지 등은 아예 기부금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것.
특히 과세당국이 계속 비용으로 처리해 온 무가지를 돌연 접대비로 구분한 것에 대해서도 권한 남용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삼일회계법인의 한 회계사는 “회계에선 관행이 중요하다”며 “계속 비용처리한 것을 접대비로 변경하려면 과세당국이 회계 기준을 바꾼다는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세법에서는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처(신문사의 경우 지국, 제지업체, 인쇄소)에 지출한 비용이나 물품을 접대비로 보고 일정 한도(수입금액의 0.03∼0.2%)까지만 비용으로 인정한다”고 해명하고 있다.

공정위가 언론사들의 부당 내부거래를 조사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신고된 사안을 중심으로 무가지와 경품 등을 조사한 적은 두 차례 있었지만 언론기업을 재벌기업과 같은 기준에 놓고 계열사 간 부당거래를 직권조사하기는 이례적이다. 동아 조선 중앙 한국 국민 등 해당 언론사들이 공정위 조사 결과에 반발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과징금 규모가 가장 많은 동아일보는 공정위가 지적한 6개 부당 내부거래 유형에 대해 공정위 판정이 잘못되었다며 5쪽짜리 설명문을 내고 반박했다. 중앙일보는 공정위 발표 당일 오전에 4쪽짜리 소견문을 냈다가 나중에 한 장 짜리 의견서로 바꿨다.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는 즉각 이의신청과 행정소송 등 법이 규정한 모든 구제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언론사들은 공정위가 부당 내부거래라고 규정한 사안들이 대부분 회사의 설명이나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는 주장이다.
‘비판적 신문사’ 집중 타깃 흔적 뚜렷
공정위가 특히 크게 문제삼은 부분은 본사와 계열사 간 ‘지원’. 주로 인쇄 위탁이나 광고 게재 등 일상적인 신문발행 업무과정에 부당 지원 판정을 받은 것이 많다. 계열 인쇄소에 인쇄비를 많이 주거나 늦게 받거나 받지 않은 것과 계열사 광고 무료 게재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런 혐의가 적발된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는 승복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예를 들어 동아종합인쇄의 경우 동아일보 공무국이 93년 분사한 인쇄회사로 동아일보와 소년동아일보만 인쇄하고 있다. 따라서 시장에서 타사와 경쟁하는 회사가 아니며 신문업 특성상 중앙 일간지 인쇄부문에는 경쟁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동아일보의 입장이다. 계열 인쇄회사인 조광출판인쇄㈜에 인쇄비를 과다 지급했다고 적발된 조선일보도 “광주지역에 조선일보가 원하는 만큼 신문을 인쇄할 시설이 없기 때문에 조광출판인쇄의 단가가 높다”고 반박했다. 공정위는 또 동아일보와 한국일보 국민일보 판매 등이 비상장주식을 사주 등 특수 관계인에게 헐값에 팔거나 높은 가격으로 사들이면서 이들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 역시 납득하기 어려운 지적이라는 게 해당 언론사 입장이다.
동아일보의 경우, 동아닷컴 주식을 특수 관계인에게 매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것은 99년 2월이다. 당시 주당 5350원이라는 매도가는 대주주의 경우 주식 평가액의 10%를 가산해야 한다는 상속세법 규정의 평가 금액에 따라 결정한 것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것. 문제는 특수 관계인의 개인 사정 때문에 계약금과 주식 금액을 99년 10월에야 지급했는데, 공정위는 이때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주식 평가액을 근거로 부당 지원이라 판정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어쨌든 공정위의 이번 조사에 대한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이남기 공정위 위원장이 ‘클린 마켓 프로젝트’(포괄적 시장 개선 대책)로 6개 업종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신문 방송 잡지 등 언론사가 막판에 들어간 것은 아직도 그 배경이 속시원히 풀리지 않는 대목이다.
특히 공정위는 조사 착수 당시 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무가지와 경품을 집중 부각하면서 조사를 합리화했고, ‘경품 = 외화 낭비’라는 애국심에 호소하면서 언론사에 화살을 돌렸다. 그런데 이번 조사는 언론사들의 부당 내부거래에만 초점이 맞춰졌다.
이남기 위원장은 “클린 마켓 프로젝트는 공정위가 자체 기획 조사한 것으로, 일부에서 외압 의혹을 제기하였으나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언론사 조사가 위원장 총괄 아래 이뤄진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 말에 의구심을 품는 사람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