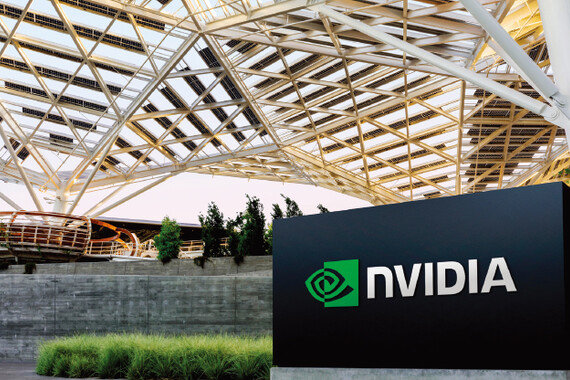2006년 10월10일 노무현 대통령(오른쪽)이 청와대를 방문한 김대중 전 대통령을 영접하고 있다.
꿈틀거리는 이 정치의 본질 앞에 김대중(DJ) 전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이 마주 섰다. 2002년 대선 후 4년 반 만이다. 범여권 진영의 대선 상수(常數)인 그들은 때로는 협력하고 때로는 경쟁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한나라당의 집권을 저지해야 한다는 원칙과 명분에는 서로 뜻이 통한다. 말 그대로 협력자이자 동업자다. 그러나 방법과 방향을 보면 엇박자다. 이해가 상충하는 그들은 곧바로 경쟁 모드로 돌입한다. 이런 협력과 경쟁 속에 전·현직 대통령의 보이지 않는 파워게임도 치열하다. 그들의 파워게임은 12월은 물론 내년 4월 총선의 주도권 싸움으로도 연결된다.
파열음을 내는 부분은 반(反)한나라당 대표주자를 뽑는 일이다. 외견상 두 사람은 다른 길을 선택했다. 노 대통령은 “열린우리당이 선택한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생각이다. 참여정부의 철학을 공유하면서 정책을 계승할 수 있는 인물들을 상정한다. 이해찬 한명숙 전 총리와 김혁규 의원, 유시민 전 장관 등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반면 DJ는 “정권을 창출한 민주당을 중심으로 범여권 후보가 나와야 한다”는 견해다. 결국 노 대통령은 우리당, DJ는 중도통합민주당과 탈당파 등을 아우르는 후보군에서 주자를 찾겠다는 말이다. 손학규 전 경기지사와 정동영 전 우리당 의장 등이 대통합파에 몸담고 있는 대선후보들.
DJ, 호남·충청 서부벨트 전략에 노 대통령 난색
자신이 선호하는 후보를 반한나라당 대표주자로 결정하려는 두 인사의 정치적 입김은 곳곳에서 감지된다.
먼저 DJ는 호남과 충청을 연결하는 ‘서부벨트’로 대선을 치르자는 전략을 공개했다. 이 구도는 1997년 ‘DJP 연합’과 2002년 대선의 호남·충청 연합을 통해 위력을 발휘했던 검증된 전략. DJ는 이번 대선에서도 이 구도로 선거를 치르면 승산이 있다고 본다.
그러나 노 대통령의 생각은 다른 것 같다. 그 길로 가면 ‘도로 민주당’이 기다리며, 그래서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이다. 노 대통령은 DJ의 지역연합론 외에 ‘플러스 알파’를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테면 97년의 이인제, 2002년도의 영남 후보 같은 플러스 알파를 말한다. 노 대통령은 6월8일 원광대 특강에서 “호남+충청으로는 죽었다 깨나도 못 이긴다”며 “97년에 호남 충청이 손잡아 이겼다는데 수판 놔보면 (아니라는 걸) 안다”고 했다. 영남표를 깰 수 있는 ‘이인제 같은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한다’는 노 대통령의 신념은 확고하다.
그러나 6월11일 이명박 박근혜 두 후보는 한나라당 경선후보로 공식 등록하면서 제2의 이인제가 등장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했다. 한나라당 경선에 출마한 후보는 당헌 당규에 따라 탈당 등을 통해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노 대통령의 선거전략은 바로 여기서 출발한다. 노 대통령 주변 인사들은 이번 대선을 후보 대 후보, 개인 대 개인 싸움으로 몰고 가야 승산이 있다고 주장한다. 개인간의 싸움으로 몰고 가면 살아온 과거에 대한 명분과 도덕성이 앞서는 사람이 유리하다. 검증 정국에서 터져나오는 이 전 시장과 박 전 대표의 여러 가지 의혹에 비춰볼 때 이 전략은 더 힘을 받는다.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하면 이런 의혹들을 체계적으로 들고 나와 한나라당 후보의 도덕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한편, 공약을 집중적으로 검증해 ‘준비 안 된 후보’임을 부각하면 지지율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것.
범여권 인사들 “두 사람 노선 결합해야 범여권 대선구도 제 모습”
지역의 견고한 표심은 되돌릴 수 없지만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서울과 수도권 표심은 이런 도덕성에 대한 공세와 공약 검증을 통해 허물 수 있다는 게 이들의 판단이다. 어떤 경우든 원칙과 명분을 가진 후보가 이길 수 있다는 노 대통령의 소신은 2002년 선거에서 일부 검증됐다.
두 인사의 이런 인식차는 범여권 대통합론에서 1차로 부딪쳤다. 우리당 탈당사태가 이어지면서 노 대통령은 1차적으로 타격을 입었지만 DJ도 적지 않은 상처를 입었다. 줄기차게 주장한 대통합은 아직 요원하기 때문이다. 대선 후보를 고르기 위한 전·현직 대통령의 주도권 다툼은 앞으로 더욱 불을 뿜을 수밖에 없다. DJ가 미는 후보가 대선후보가 될 경우 노 대통령의 개혁정책은 훼손이 불가피하고, 노 대통령이 미는 후보로 단일화가 이뤄지면 DJ의 햇볕정책 등은 또다시 시련을 맞을지도 모른다.
두 사람의 갈등에는 총선 지분을 둘러싼 다툼도 숨어 있다. 두 사람이 보는 총선은 대선만큼이나 입장 차가 확연하다. 대선이 지역구도로 흐르면 호남은 총선에서 유리한 지형이 구축된다. 그래서 김 전 대통령은 지역구도를 통한 집권전략에 더 비중을 두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노 대통령은 그 반대다. 대선이 지역구도로 흐르면 총선에서 설 자리를 마련하기 어렵다. 따라서 갈등관계가 오래도록 지속될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범여권 인사들은 DJ와 노 대통령이 결국 통합에 이를 것이라고 말한다. “JP와도 연대한 DJ 아니냐”는 말로 이기기 위해서는 더한 연대도 할 수 있는 게 DJ 정치의 유연성이라는 것.
노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정권이 바뀌면 그는 자신이 내세워온 원칙과 개혁정책을 잃게 된다. 따라서 후보단일화 작업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다. DJ의 지역과 노 대통령의 노선이 결합해야 범여권 대선구도가 제 모습을 갖춘다는 지적은 양 진영을 압박하는 좋은 수단이다.
마음만 먹으면 정국을 주도할 것처럼 움직이는 전·현직 대통령에게 국민은 어떤 평가를 내릴까. 칼자루를 움켜쥔 국민은 그들의 다음 행보를 지켜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