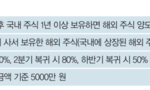여름이면 시냇가에서 수박만한 돌덩이로 피라미를 잡던 기억과 특히 대만에서 오신 이케마 담임선생님(아랫줄 오른쪽에서 네 번째)에 대한 추억은 지금도 생생하다. 눈이 쑥 들어갔다고 해서 올빼미라고 별명 지었던 것 기억나지? 선생님이 즐겨 부르던 ‘산타루치아’가 아직도 귓가에 맴맴 돈다.
나는 이제 82세의 나이로 7남매가 건강하게 사는 것만을 기도하며 지내고 있다. 70여년이 흐른 이제야 너를 찾아 미안하다. 이 글을 읽는다면 꼭 소식을 전해다오. 가슴 사무치게 궁금하고 꼭 만나보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