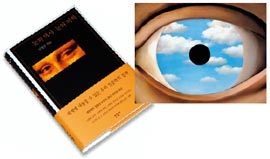
20년 동안 ‘눈’에 대해 인문학적 연구를 거듭해온 임철규 연세대 교수(영문학)는 ‘눈의 역사 눈의 미학’ 서두에서 이런 단정적 표현을 사용했다. 400쪽이 넘는 두꺼운 책 전체는 이 명제를 부연하는 데 쓰이고 있다. 이를 위해 그는 눈과 태양, 눈과 신, 눈과 성기, 눈과 문학사조, 그리고 동양의 비극성 등 백과사전처럼 풍부한 근거자료를 제시했다.
임교수에 따르면 눈은 감옥이다. 그 이유는 눈이 있다는 것은 본다는 것이고, 보는 것은 인식한다는 것이며, 인식한다는 것은 전체를 아우르지 못하고 부분만을 파악하는 것이고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부분이라는 틀, 인식의 틀 속에 가두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눈은 악한 눈이다. 서양의 역사는 이런 악한 눈이 지배한 역사다. 비극의 배태는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한다.
선사시대와 고대 이집트, 그리스, 로마, 중세, 르네상스, 현대에 이르기까지 ‘서구의 눈’은 힘 또는 폭력의 눈이었다. 로마의 시인 바로는 “나는 시각, 즉 힘으로부터 본다. 왜냐하면 시각은 오감 가운데 가장 강한 감각이기 때문이다. 다른 감각은 300m 떨어져 있는 어떤 것도 지각할 수 없지만, 눈의 지각이 뿜어내는 힘은 별들에도 이른다”고 표현했다. 그리스 신화에서는 사냥꾼 악타이온이 그런 눈으로 목욕하는 여신 아르테미스를 ‘범했다’. 이처럼 시각은 경계를 모르고 여러 형태의 폭력을 행사하는 위험한 감각인 것이다. 실제로 ‘시각(visus)’을 의미하는 단어에서 유래된 ‘힘(vis)’이라는 말은 ‘폭력’이나 ‘적대세력’이라는 뜻으로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 결국 ‘이성’을 탄생시킨 근대 계몽주의에 의해 절정에 이른 눈의 문명은 20세기 제국주의와 파시즘의 등장이라는 필연적 결과물을 낳게 된다.
책에 등장하는 수많은 은유와 상징들 가운데서 ‘눈과 성기’(제3장) 부분은 더욱 새롭게 다가온다. 고대국가들에서는 악한 눈에서 오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흔히 부적을 사용했는데, 대부분 성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다. 여기서 눈과 성기의 관계가 자연스럽게 연상된다. 이집트 등 고대국가들에서는 남근 모양의 부적을 사용했고, 거대한 남근을 가진 풍요의 신들을 숭배했다. 또한 여성의 성기를 닮은 편도나 달걀 모양의 물건도 사용했다.
그러나 여기에도 폭력성이 개입됐다. 여성의 성기를 상징하는 ‘지옥의 입’ 또는 ‘이빨을 가진 음부’라는 용어가 그것이다. 이는 남성 자신들의 거세 공포를 그와 같은 상징을 이용해 폄하했기 때문. 물론 러시아 비평가 바흐친이 그의 저서 ‘라블레와 그의 세계’에서 남성 지배문화가 폄하했던 여성 성기를 사랑이라는 ‘신성한 빛’을 지닌 ‘선한 눈’이라고 말하기는 했지만 서구문명의 폭력성은 그 이후로도 집요하게 계속됐다.
자신의 불운한 운명을 예감이라도 하는 듯 어두운 눈의 고흐 초상화나 자신의 눈을 찔러 비로소 참지혜의 눈을 얻은 오이디푸스 이야기, 두 눈을 감음으로써 또 다른 제3의 눈이 열리는 부처, 시각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동양에 비극이 없다는 얘기 등은 눈과 폭력성의 관계를 더욱 풍부하게 제시한다.
그런데 인류는 정말 ‘눈의 폭력성’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일까. 저자는 눈의 또 다른 기능인 ‘눈물’을 희망으로 제시한다. 눈물은 폭력적이고 악한 눈에서 폭력과 악을 씻어낸다. ‘보는 눈’이 있는 한 폭력의 역사, 야만의 역사는 멈출 수 없지만 인간의 어리석음을 위해 눈물 흘린 예수나 마르크스, 또는 그들을 닮으려는 뭇 ‘선한 눈’ ‘윤리적인 눈’들이 파국을 유보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눈’에 관한 한 독보적인 연구서인 이 책은 20년 전 저자의 ‘눈의 미학’이라는 논문에서 출발했다. 그 뒤 우리 사회에 다양한 주제를 포용하는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저자는 눈에 대한 연구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됐다. 긴 세월을 한 주제에 천착했던 탓인지 저자는 서문에서 독자를 불편하게 할 정도의 자신감을 내보이고 있다. 정년퇴임을 앞둔 저자는 그 연유를 이렇게 밝혔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네에는 학자들의 조로(早老)가 일반화되고 당연시되고 있다. 서양의 유수한 학자들은 70대는 물론 80대에도 그들의 노동을 멈추지 않으며 계속해서 역저를 내놓는다. 나는 ‘조로’라는 가당찮은 현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마지막까지 노동하는, 마지막까지 철저하고 싶은 ‘학인’으로서의 고집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
임철규 지음/ 한길사 펴냄/ 440쪽/ 2만2000원














![[영상] 폴로 티 3000원… <br>고물가 시대 생활용품 경매로 싸게](https://dimg.donga.com/a/570/380/95/1/ugc/CDB/WEEKLY/Article/69/ae/a9/14/69aea9141beaa0a0a0a.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