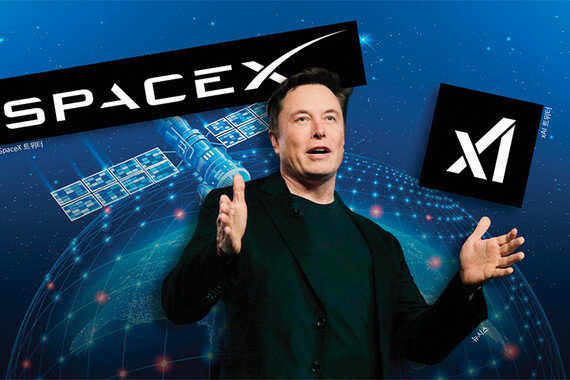① 하랄트 메트제케스 ‘상어’ 1957년 ② 베르너 튑케 ‘1524년의 밤’ 1982년 ③ 볼프강 마테우어 ‘시지프스의 탈출’ 1972년
체제에 도전한 창조적 작품 많아
그러나 이번 전시는 단순히 동독 시대의 미술 수준을 가늠하는 데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다. “관람객들은 동독 사람들이 어떤 생활을 했는지, 또 어떤 고난을 겪었는지에 대해 어떤 역사책에서보다도 더 생생한 증언을 듣게 될 것이다”라고 이번 전시의 기획을 맡은 롤란트 메어츠와 오이겐 블루메는 말한다.
사실 통일 이후의 독일 문화계는 동독 작가들의 미술작품을 다분히 경원시해 왔다. 이 때문에 주최측은 ‘그동안 터부시되어 오던 동독 시대를 종합적으로 다룬 최초의 대규모 미술 전시회’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베를린 도심의 젊은이들. 독일인들은 조금씩 동독 시절에 대한 향수를 느끼고 있다. 베를린국립미술관(아래)이 기획한 대규모 동독 미술 전시도 이 같은 관심을 반영한다.
아닌 게 아니라 올해 초 영화 ‘굿바이, 레닌!’이 큰 사회적 반향을 일으킨 후 독일 내에서는 동독 시절에 대한 관심과 향수가 하나의 신드롬처럼 퍼져나갔고, 이 열기는 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식을 줄 모르고 있다.
전시는 ‘1945년-제로 시점’이라는 제목의 방에서 시작돼 ‘유토피아와 현실-역사의 좌절에 관하여’로 끝을 맺는다. 빌리 지테, 베르너 튑케, 하이치히 같은 체제선전에 앞장선 작가들의 정치색 강한 작품과 게하르트 알텐부르크, 칼 프리드리히 클라우스, 헤르만 글뢰크너 등 독자노선을 걸어온 작가들의 작품이 나란히 벽에 걸려 있다. 객관적으로,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침 없이 그 시대의 미술을 살펴볼 수 있게 한다는 전시회 취지를 반영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이 전시를 통해 더 많은 혜택을 보게 된 쪽은 물론 동독 시절에 관변미술가들에 밀려서 빛을 보지 못했던, 그래서 자기만의 독자적인 길을 모색해야 했던 비주류 작가들이다. 공산정권의 통제와 압력이 거셌던 시대에도 그러한 외적 요인을 멀리하거나, 더 나아가 이에 저항한 작가들이 있었다는 것을 이 전시회는 웅변해주고 있는 것 같다. 작센 지방의 대중예술이나 동베를린의 시각예술, 차가운 구조주의 작품과 젊은 펑크족의 자화상, 심지어 공산당 최고 지도자 발터 울브리히트가 연옥으로 끌려가는 내용을 담은 상징적인 작품까지 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당시 동독 미술이 서구 미술보다 더 도전적이고 개방적이라는 인상을 준다.

④ 우베 파이퍼 게말데 ‘축제의 밤’ 1977년 ⑤ 빌리 지테 ‘노동 중의 휴식’ 1959년 ⑥ 한스 헨드릭 그리믈링 ‘빚’ 1981, 82년 ⑧ 윌리 울프 ‘레닌 탄생 100주년’ 1970년
그러나 이 행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동독 출신의 설치미술 작가 비아 레반도프스키는 전시 기획자들이 작가들을 친정부 예술, 저항 예술, 제3의 예술 등의 카테고리로 나눈 것은 조야한 구분이라고 지적한다. 그 결과 옛 작품을 후대의 관점으로 해석하려는 오류를 낳았다는 것이다. “동독 시절의 미술작품은 하나같이 곰팡내 나는 낡은 것들이다. 조금이라도 전향적으로 보이는 작품은 서구적인 것으로, 따라서 반정부적인 것으로 간주되어 타도의 대상이 되었다. 물론 다소 중립적인 여지도 있었지만, 그것은 매우 작은 부분에 지나지 않았다. 이 부분이 오늘날 부풀려져서 평가되고 있는 것이다.” 레반도프스키의 말이다.
청소년 역사 교육의 장으로 인기
또한 독일의 시사주간지인 ‘슈피겔’은 이번 전시회가 동독 시절 비주류로 취급받던 저항 작가, 독립 작가들을 부각시킨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이 전시회를 통해 관람객들이 동독 미술의 역사를 객관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슈피겔’은 이러한 판단의 근거로 당시 예술을 가장 잘 특징짓는 ‘이데올로기로 채색된, 형식적으로 조야한 대중미술’이 이번 전시에서 배제되었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전시 기획자들은 이번 전시회에 지테, 튑케 등 동독 체제를 옹호하고 찬양한 작가들의 작품들도 다수 포함시켰지만 정작 가장 논란이 되는 작품들, 예컨대 무밭을 가는 여인, 화학공장 노동자에 대한 전설적인 찬가 등은 배제한 것이다.
기획을 맡은 메어츠에 따르면 이번 전시의 의도는 동독 자체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동독 시절의 예술’, 즉 열악한 조건 속에서 창조된 예술작품을 선보이는 것이다. 때문에 수준이 떨어지는 선전용 대중작품들이 포함될 여지는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데올로기적 색채, 노동자에 대한 찬미가야말로 동독 공산주의 시절 미학의 진정한 특징이 아니던가?
작품에 대한 논란과는 별도로 동독 시절이 ‘뜨고 있는’ 시점에 열린 이 전시회는 독일 사회에서 큰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그 시절을 직접 겪어보지 못한 청소년들에게는 좋은 역사 교육의 장이 되고 있다고 한다. 과연 독일 사회는 오랫동안 갈라져 반목하며 키워온 적대감을 이제 버릴 수 있을까. 그리고 지난 반세기의 부끄러운 과거를 자신의 역사로 냉정히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 50년간의 단절로 인해 너무나 이질적으로 변해버린 남한과 북한의 통일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로서도 관심 가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