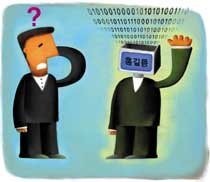
날마다 만나는 친구의 이름도 얼굴도 몰라 만날 때마다 사진을 꺼내 아래에 적힌 이름과 그에 관한 메모를 읽고서야 친군지,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판단한다. 그것도 10분마다. 이러고서도 살아간다는 게 신기할 뿐이었다. 이 영화를 보고 나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라고 해서 별반 다를 게 없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우리 중 주변 사람의 전화번호를 10개 이상 외우고 다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또 어제 명함을 건네 받은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 최근 LA타임스는 현대인의 이러한 현상을 ‘과학기술에 의한 건망증’이라고 정의하면서 휴대폰이나 PDA를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현대인에게는 이미 이같은 일이 일상화한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우린 이미 전화번호를 기억하기 위해 노력한다거나, 기억 못하는 사실에 대해 부끄러워하거나 한탄하지도 않는다. 오히려 전화번호를 많이 외우고 다니는 사람을 향해 왜 그리 쓸데없는 것들을 머릿속에 넣고 다니느냐고 속으로 비아냥거릴 뿐이다. 전화번호야 당연히 휴대폰이나 PDA에서 꺼내보면 되지 왜 머릿속에 넣고 다니느냐는 식이다.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누구나 다 외우고 다닌 것을…. 왜 이렇게 되었을까? 아마도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휴대폰이나 PDA에 저장한 자료를 기억의 일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닐까? 항상 휴대할 수 있는 장치에 저장되어 있고 언제든지 꺼내볼 수 있다는 장점이 마치 머릿속에 저장된 기억들과 외부장치에 저장한 정보들의 차이를 못 느끼는 것은 아닐까? 어쩌면 우리들의 뇌는 이미 복잡하기 이를 데 없는 다량의 정보를 처리하기 위해 휴대폰이나 PDA의 메모리 장치를 외부 확장 기억장치로 인정해 버린 것은 아닐까?
‘과학기술 건망증’ 種의 진화 징후
심리학자 케네스 거겐은 이러한 현상에 대해 “그동안 인간은 기억을, 머릿속에서 전달되는 어떤 것으로 봐왔으나 이제는 외부 장치에 저장한 데이터도 기억의 일부로 봐야 하는 상황이다”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일부 학자들 사이에는 이를 `인간과 기계의 진정한 결합’으로 보려는 시각도 있다. 여기서 떠오르는 단어가 바로 ‘사이보그’다. 이미 오래 전에 인공지능이론의 선구자인 미국의 마빈 민스키 교수는 ‘인류의 후예는 사이보그’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다. 어쩌면 ‘과학기술 건망증’은 인류가 새로운 종(種), 바로 사이보그로의 진화를 시도하는 하나의 징후일지도 모른다. 이것이 지금까지 인류가 진화해 온 방식과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것은 인류가 의도적으로 그것을 시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것이 비록 성공적인 진화가 될지 아니면 하나의 재앙으로 다가올지는 모르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