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도 그런 사람 중 하나다. “아침에는 기사 마감하고, 저녁에는 마운드에 오르고 싶다”는 소원을 동료들에게 털어놓은 적도 있다. 시속 160km의 구질을 자랑하며 순전히 내 스케줄에 맞춰 등판하고, 구단주와 감독의 잔소리에 구애받지 않는 완전한 프리랜서 투수. “시간 있으면 병원에 가 진찰받아 보라”는 농담 섞인 충고를 듣는 걸로 끝나고 말았지만.
그러나 허무맹랑한 꿈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수도 있는 모양이다. 이런 감동적인 실화를 할리우드가 놓칠 리 없다. 지난달 미국에서 일제히 개봉한 ‘루키’(the Rookie)는 바로 그런 꿈을 이룬 실존 인물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다.
99년 여름, ESPN의 야구기자 제이슨 스타크는 트리플A 더럼 불스의 한 투수와 인터뷰를 한다. 투수의 이름은 매트 모리스, 나이는 35세다. 일찌감치 대만이나 일본 프로야구의 용병으로 퇴출됐을 법한 이 노장에게 ESPN은 관심을 기울였다. 그는 불과 석 달 전만 해도 텍사스 앨링턴의 한 고등학교에서 과학을 가르치던 선생님이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가 시속 98마일(158km)의 강속구를 던진다는 사실이다.
ESPN과 CNNSI의 보도 이후 매트 모리스는 하루 100통의 전화를 받는다. 그의 공을 보고 싶다는 스카우트와 에이전트의 요청 때문이었다. 며칠 뒤 모리스는 앨링턴 구장에서 4만여명(!)을 모아놓고 테스트를 가졌다. 텍사스의 톱타자 로이스 클레이튼은 3구 삼진으로 나가떨어졌고 스카우트들은 스피드건에 찍힌 그의 구속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는 우여곡절 끝에 탬파베이 데빌레이스에 입단해 1999, 2000 시즌에 팀의 중간계투로 활약한다.
그는 자신이 세 살 때부터 메이저리거가 되는 꿈을 꾸어왔다고 말한다. 그러나 마이너리그 시절 네 차례의 어깨 수술 끝에 빅리거의 꿈을 접었고 고향에서 평범한 선생님으로 세월을 보냈다. 수술 후 갑작스레 구속이 는 것은 자신도 설명할 수 없는 기적 같은 일이었다.
이 소설 같은 이야기를 전해 듣고 영화화하기로 결정한 것은 배우 데니스 퀘이드였다. 영화에서 퀘이드는 자신이 직접 모리스로 분해 등장한다. 텍사스와 탬파베이가 맞붙은 실제 경기 도중 영화를 촬영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모리스는 메이저리거로 활약하는 동안 그다지 좋은 성적을 남기지는 못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맞은 홈런이나 안타 모두가 자신의 인생에서 결코 잊을 수 없는 순간이었다고 회고한다. 꿈을 포기하지 않은, 그래서 결국 기적을 만들어낸 사내는 그렇게 말할 자격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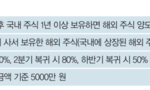












![[영상] 멸종위기 야생 독수리에게 밥을… <br>파주 ‘독수리 식당’](https://dimg.donga.com/a/380/253/95/1/ugc/CDB/WEEKLY/Article/69/5c/75/cc/695c75cc0d36a0a0a0a.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