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치 앨봄 지음/ 이수경 옮김/ 살림 펴냄/ 352쪽/ 1만2000원
2000년의 어느 봄날, 앨봄은 어렸을 때 다녔던 유대교 회당 랍비인 앨버트 루이스(앨봄은 그를 ‘렙’이라고 부른다)에게서 자신의 추도사를 써주겠냐는 요청을 받는다. 평생 누구한테서도 그런 부탁을 받아본 적이 없어 주저하던 그는 결국 렙의 청을 받아들이고, “추도사를 쓰려면 먼저 한 인간으로서의 당신을 알아야 한다”며 만남을 제안한다. 그렇게 시작된 렙과 앨봄의 이야기는 8년 동안 이어진다.
처음에 앨봄은 렙과의 만남을 다소 불편하게 느낀다. 유대교 집안에서 자랐고 렙이 이끄는 회당에 다녔으며 대학시절까지 종교와 멀지 않은 삶을 산 그였지만, 사회인이 된 뒤부터는 그것에 등을 돌린 채 살아왔기 때문이다. 유명 칼럼니스트이자 방송인인 그에게 종교는 필요하지 않았다. 신에게 간절히 요청할 것도 없었고, ‘남에게 피해 주는 삶을 살지 않는 한 신이 내게 요구하는 것도 많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었다. 그러나 렙은 평생 신의 존재를 믿고 신의 가르침을 받드는 성직자의 길을 걸어온 사람이기에, 그와 대화를 나누는 일이 앨봄에게는 부담스럽게 느껴졌던 것이다.
그러나 렙과 신, 믿음, 삶과 인간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그의 생각은 조금씩 바뀐다. 그가 렙에게서 본 것은 위대한 종교인이나 독실한 신앙인이 아닌, ‘가장 아름다운 사람’의 모습이었기 때문이다. 렙은 어려운 이웃이나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따뜻하게 보살폈고, 그들로 하여금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임을 느끼게 해주었으며, 유대교의 시각에서는 적으로 여겨지는 이들도 ‘가족’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 모든 아름다운 모습은 그가 가진 ‘믿음’의 힘이 만들어낸 것이었다.
신의 존재에 대한 회의, 종교적 믿음에 대한 의심, 믿음과 신념을 가진 이들을 향한 냉소적 눈초리….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있던 앨봄은 ‘믿음’이라는 큰 줄기를 바탕으로 아름답고 따뜻한 삶을 살아가는 렙을 곁에서 지켜보며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한다. 그리고 렙의 장례식 날, 그와 함께한 동행의 기억과 더불어 그에게 고마움을 고백하는 추도사를 낭독한다. 8년 전 렙과 했던 약속대로.
렙과의 만남을 이어가던 중에 앨봄은 또 한 명의 인물을 만난다. 디트로이트의 허름한 교회에서 가난한 사람들과 노숙자를 보살피며 그들을 더 나은 삶으로 이끌기 위해 노력하는 흑인 목사 헨리 코빙턴(Henry Covington)이 바로 그 사람이다.
헨리는 마약상이자 그 자신이 마약중독자였다. 마약이 떨어진 어느 날 밤, 그는 알고 지내던 마약상들을 급습해서 마약을 빼앗고 그것에 취해 얼마간의 시간을 보낸다. 그리고 마약에서 깨어났을 때 자신이 바보 같은 짓을 저질렀음을 깨닫는다.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마약상들이 이내 앙갚음하러 들이닥칠 게 뻔했기 때문이다. 총을 손에 든 헨리는 그날 밤 집 밖 쓰레기통 뒤에 숨어서 뜬눈으로 새우며 신을 향해 마음속으로 외쳤다. ‘제 삶을 당신에게 바치겠다고 약속하면, 오늘 밤 저를 살려주시겠어요?’라고. 그날 헨리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리고 그렇게 그의 인생은 다시 시작됐다.
백인과 흑인, 유대교와 기독교, 오래전부터 고결한 성직자의 삶을 살았던 앨버트 루이스와 삶의 막다른 골목에서 성직자의 길로 들어선 헨리 코빙턴. 두 사람은 피부색과 종교, 살아온 이력까지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다. 그러나 둘은 ‘믿음’이라는 불빛에 의지하며 자신의 삶을 살아간다는 점에서, 그리고 그 빛으로 타인의 삶도 비춰주며 이끈다는 점에서 놀라우리만큼 비슷하다.
이 책은 겉으로는 달라 보이는 사람, 세계일지라도 결국은 하나의 큰 덩어리라는 사실과 각박하기 그지없는 현대를 사는 ‘믿음’에 대해 이야기한다. 저자는 “우리는 서로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모두 연결돼 있다. 그것이 타인을 가족처럼 보듬고 사랑해야 하는 이유다.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으니, 삶이란 참으로 위대한 여정 아닌가”라고 말한다. 따뜻한 햇볕이 내리쬐는 봄날, 한번쯤 읽어보면 좋을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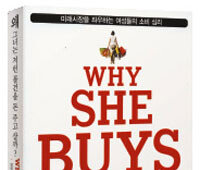















![[영상] 새벽 5시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헬멧 쓴 출근 근로자 8열 종대로 500m](https://dimg.donga.com/a/380/253/95/1/ugc/CDB/WEEKLY/Article/69/b1/2f/08/69b12f0800eaa0a0a0a.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