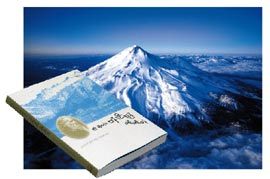
옛사람들은 등산(登山)보다 입산(入山)이란 말을 좋아했다. 산을 정복한다는 표현보다는 자연과 한 몸이 된다는 뜻의 입산이란 표현이 그들 정서에 더 맞았던 것이다. 지금도 산을 정복이 아닌, 심미의 차원에서 다가가는 이들이 적지 않다.
‘설악산 지킴이’로 유명한 환경운동가 박그림씨도 그런 이다. 2년 전 대한산악연맹이 주는 산악환경상을 거부하면서 그는 “연맹이 거액을 들이며 해외원정 등반에 주력하면서, 정작 자연의 경이로움을 느끼고 생태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이끄는 행사는 사라져버린 현실이 안타깝다”고 했다.
100년 전 활동했던 자연주의자 존 뮤어는 “산에 오르는 것은 곧 마음의 본질에 오르는 것”이라고 비유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질 때 단순히 인간 의지의 실험이니 건강을 위한 산행이라는 1차원적 의미에서 벗어나 더 높은 경지에 오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뮤어는 “산에서 보낸 하루는 몇 수레 분량의 책을 읽는 것보다 낫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산과 직접적인 교류를 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산속에 핀 꽃 한 송이에서도 ‘숭고한 신의 반영’을 보며, ‘우주의 비밀’을 향해 이끌려가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미국이 낳은 양심’으로 알려진 존 뮤어는 자연보호단체 ‘시에라 클럽’의 창립자다. 등반가, 환경윤리학자, 산림학자였던 그는 지칠 줄 모르는 호기심과 끈기로 자신이 ‘황야의 대학’이라 불렀던 자연을 연구하는 데 한평생을 바쳤다.
1838년 스코틀랜드에서 태어난 뮤어는 어렸을 때 소로와 에머슨, 오두본 같은 자연주의자들한테서 큰 영향을 받았다. 기계발명가라는 직업인으로 살다 67년 한쪽 눈의 시력을 잃을 뻔한 사고를 겪으면서 그는 오랫동안 동경했던 자연에 파묻혀 살았다. 그의 진정한 자아는 그때부터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네바다 유타 오리건 등지를 여행하며 빙하와 숲을 관찰한 뒤 장관을 이루는 요세미티 계곡이 빙하의 침식작용으로 만들어졌음을 증명했고, 92년 시에라 클럽을 만든 뒤에는 자연보호운동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었다. 1907년 샌프란시스코 시가 물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요세미티 헤츠헤치 계곡에 댐을 건설하려 하자 전국적인 반대 캠페인을 벌여 반향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뮤어에 대한 책은 이미 국내에도 두어 권 소개돼 있다. ‘자연보호의 아버지 존 뮤어’와 ‘존 뮤어 자서전’이 그것. 이번에 나온 ‘존 뮤어의 마운틴 에세이’는 문필가로서 그의 면모를 보여주는 책이다. 뮤어 전문 연구자인 리처드 플렉이 수백 편에 이르는 뮤어 에세이 가운데 11편을 가려 엮었다.
‘온화하고 고요한 인디언 서머(늦가을 화창하고 따뜻한 날이 지속되는 기간).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는 것 말고는 할 일이 없는지 구름 몇 조각이 꼼짝 않고 둥실 떠 있다. 수정 궁전을 짓기에 충분할 만큼 서리가 내렸다. 하룻밤이 지나면 사라질 찬란한 얼음 다이아몬드 들판. 자연은 물질의 입자들을 주물러 끊임없이 새로운 모양을 세웠다 넘어뜨린다.’
뮤어의 대표작 가운데 하나인 ‘시에라에서 보낸 첫 번째 여름’에서 발췌한 이 글은 데이너 산과 캐서드럴 피크 정상에 오르면서 느낀 대자연의 영적인 측면을 감동적인 필치로 묘사하고 있다.
자연에 대한 찬탄만 있는 것은 아니다. 장엄한 자연 풍광을 그림에 담으려던 화가 친구들을 고산지대로 안내한 뒤 혼자 더 높은 산으로 오르다 위기에 처했던 상황을 그린 ‘하이 시에라에서 바라본 근경’은 절대자연 앞에 선 인간의 초라함을 깨닫게 한다.
‘절벽을 반쯤 올라가다가 끔찍하게도 양팔을 쫙 벌리고 암벽 정면에 달라붙은 채 그만 멈춰 서고 말았다. 손발을 아래 위로 움직일 수 없었다…. 가슴이 바싹바싹 타 들어가는 것 같았다. 그러나 잠시 후 불가사의한 선명함이 생명의 불꽃을 다시 일렁이게 했다. 갑자기 내 몸에 새로운 감각이 생긴 것 같았다.’
자연에 묻혀 사는 사람은 어떤 정신세계에서 사는지 알 수 있게 하는 책이다. ‘빵 한 덩어리와 차 한 봉지를 낡은 배낭에 넣고서 울타리를 훌쩍 뛰어넘어’ 산으로 달려가고 싶게 한다.
리처드 플렉 엮음/ 연진희 옮김/ 눌와 펴냄/ 216쪽 / 1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