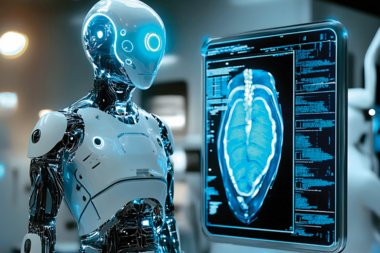간장게장.
한금호 씨는 김포시 통진읍 고정리에서 간장게장 한정식 전문점 ‘한마당’(031-981-8737)을 운영하고 있다. 10년 전 음식점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 하루에 게장 10마리를 준비했는데, 지금은 40마리를 준비한다. 하루 몫을 다 팔고 나면 손님들에게 “게장 떨어졌는데 어쩌죠?”라고 말한다. 지금으로서는 이 수가 맛을 지킬 수 있는 상한선이다. 하루는 조선호텔 조리장이 이 집 게장을 먹어보고 대한민국 최고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고 한다. 비린내가 싫어 게장을 안 먹던 사람도 한씨가 담근 게장을 먹은 뒤로는 게장 마니아가 됐다.
어머니 어깨 너머로 요리 익혀…가야금과 소리 실력도 일품
한씨는 요리학원을 다닌 것도, 어느 음식점 주방에서 수련을 쌓은 것도 아니다. 요리에 취미가 있어 요리방송을 보면서 따라하고, 맛있는 음식점의 음식을 따라 만들어본 것이 전부다. 그에게 요리 스승이 있다면 어머니다. 그런 어머니에게서 한씨는 “너는 겉절이에 누룽지만 끓여 팔아도 먹고살겠다”라는 말을 들었다.
어머니의 간강게장은 한강 하류 김포의 논게를 잡아다 항아리에 넣고 쇠고기를 먹인 뒤 청장(진하지 않은 간장)을 부어 여러 번 달인 것이었다. 그 시절엔 냉장고가 없고, 반찬도 아껴 먹어야 했던 탓에 게장이 짰다. 여러 번 끓이다 보면 게살이 다 녹아 없어질 정도였다. 한씨의 게장은 어머니의 게장에서 많이 진화했다. 먼저 짜지 않다. 숟가락으로 게장국물을 떠서 밥을 비벼 먹으면 그만이다. 게살들은 토실하게 게딱지에 붙어 있다.
한씨는 게장을 담글 때 인삼과 청양고추 따위로 양념한 진간장을 사용한다. 간장에 담은 게를 이틀에 걸쳐 두 번 달인다. 게에서 나오는 거품을 걷어낼 수 있을 정도로 살랑살랑 달인다. 너무 오래, 많이 달이면 게살이 검어지고 맛도 짜진다. 한씨의 게장은 부드럽고 짜지 않으며 비리지 않은 것을 목표로 한다. 게장을 담근 지 나흘째에 게장을 판다. 그때라야 게장 맛이 가장 부드럽다. 만일 하루라도 더 지나면 게장이 짜진다. 그래서 한씨는 종종 손님들에게 “게장 체인점이냐”라는 질문을 받기도 하고, “체인점을 하라”는 말도 듣는다. 맛이 한결같아서다.
한씨는 일주일에 한 번씩 양로원이나 정신병원에서 소리봉사를 한다. 때로는 멀리서 온 손님을 위해 가야금을 타고 소리도 들려주는 여유도 지녔다. 안 보이는 손을 여러 개 가졌나 보다. 텃밭을 가꾸고, 하루에 두 번 장을 보며, 반찬을 손수 만드는 것이 신통할 따름이다. 지극 정성이 아니면 못할 일이다.
요리와 소리가 무엇이 닮았느냐고 묻자 “둘 다 끼가 있어야 잘한다”고 말한다. 창의력과 도전정신을 두고 하는 말이었다. 한씨는 잠자리에 들 때마다 몸이 부서질 정도로 피곤하지만, 그의 등을 늘 떠미는 어머니 말이 있다고 한다. “죽으면 썩을 몸을 왜 그리 애끼냐. 일한 자리는 (빛이) 나도 논 자리는 안 난다.”














![[영상] “달러 수급 불균형 더 심화… <br>대비 안 하면 자신만 손해”](https://dimg.donga.com/a/570/380/95/1/ugc/CDB/WEEKLY/Article/69/52/0d/26/69520d26165ea0a0a0a.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