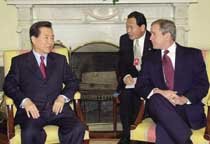
부시 행정부의 안보 팀은 국가미사일 방어(NMD) 구축의 깃발 아래 뭉쳤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자니 탄도요격 미사일(ABM) 협정이 눈엣가시다. 어떻게 해서든 이 ABM 협정을 고치거나 없애야 국가미사일 방어 계획의 명분이 선다. 방미 날짜까지 잡아놓은 김대중 대통령이 그걸 건드렸다. 혼자서도 아니고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과 한 목소리로 미국더러 ABM 협정을 준수하라고 일침을 가한 것이다.
워싱턴이 발끈했다. 한국의 김대중 대통령이 러시아 편에 서서 미국의 국가미사일 방어 계획을 반대하고 나섰다고 미 언론이 싸움을 붙였다. ‘뉴욕 타임스’가 선두에 섰다. 그러나 미 국무부는 짐짓 모르는 체하면서 불편한 심기를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다. 한국 외교통상부가 나서서 해명을 했다. 러시아 편을 들어 NMD에 반대한 것이 아니며, 사실은 러시아가 미국의 NMD에 반대하자고 강력히 요청했으나 한국이 거절했다고 했다. 김대중 대통령도 며칠 뒤 워싱턴에 와서 이와 똑같은 말을 했다.

두번째 파문은 콜린 파월 국무장관의 입에서 나왔다. 부시 행정부 출범 이후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시종 입을 다물고 있던 파월이 느닷없이 “클린턴 행정부가 중단한 지점에서부터 북한과 관계를 맺기 시작할 것”이라고 운을 뗀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의 방미 하루 전이었다. 파월 장관의 말 그대로라면, 백악관을 찾아가는 김대중 대통령의 발길을 한결 가볍게 해줄 만한 것이었다.
더구나 클린턴의 대북 포용정책과 김대통령의 햇볕정책 지지자들은 김대중 대통령의 방미에 맞춰 미 언론을 통해 목청을 높였다. 클린턴 행정부의 대통령 특별보좌관이었던 웬디 셔먼은 3월7일자 ‘뉴욕 타임스’의 기명 기고란에 이렇게 썼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북한 같은 나라의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미국을 방어하겠다고 약속했다. 그의 의도는 국가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런 시스템은 증명되지도 않았을 뿐더러, 달러도 많이 들고 외교 비용도 많이 든다. 미사일 방어 시스템 구축이 논리적인 면이 없지 않지만, 군비 통제 협상처럼 비용이 덜 드는 방법으로 미사일 위협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논리도 성립한다.’
웬디 셔먼의 결론은 ‘부시 대통령은 김정일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다면 북한과 대화를 재개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의 존 월프쉬탈은 같은 날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에 기고한 글에서 ‘북한의 미사일 문제와 한반도의 재래 병력 감축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북미 관계가 개선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3월1일에는 브루킹스 연구소가 조엘 위트, 베이츠 길, 돈 오버도퍼 등의 기자회견을 주관하면서, 부시 행정부에 대북 포용정책 재개를 촉구하고 김대통령의 방미 배경 등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하기도 했다.
이런 대북 포용정책의 목소리와 파월 국무장관의 발언 등 김대중 대통령의 방미 직전 분위기가 어쨌든 김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나쁠 것이 없었다. 김대중-푸틴 공동성명까지 가세하면 부시를 압박하는 형국이나 다름없었다. 게다가 북한도 이미 외교부 성명을 통해 ‘미국이 핵 합의를 조속히 시행해야 하며, 우리도 무한정 기다릴 수만은 없다’면서 미사일 실험 재개 가능성까지 들먹여 가며 부시 행정부에 으름장을 놓은 상황이었다.
그러나 대북 포용을 주장하는 목소리만 잔뜩 들려오는 이때까지도 백악관과 국무부는 여전히 침묵으로 버텼다. 3월7일, 김대중-부시 정상회담이 끝나자마자 백악관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부시, 대북 미사일 회담에 그림자를 던지다 - 투명성 없는 것이 대북 협상의 문제점’ (워싱턴 포스트)
‘부시, 서울에 대북 대화 당장 재개하지 않는다 통보 - 북한 포용의 꿈에 된서리.’(뉴욕 타임스)
이 두 신문은 정상회담 직후 ‘서로 솔직한 견해를 교환했으며, 상호 이해를 증진한 자리였다’고 평한 김대중 대통령의 말을 인용하면서, 똑같이 ‘양측이 합의를 보지 못했을 때 흔히 쓰는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뉴욕 타임스’는 또 7일 밤 두 정상의 만찬 자리에 참석했던 한 인사의 말을 인용, ‘부시는 기본적으로 북한을 아주 의심스러워하고 있다’라면서 부시 행정부 출범과 함께 워싱턴에 새로 부상한 대북 강경파들이 득세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징조는 ‘클린턴 행정부가 중단한 지점에서부터 북한과 관계를 맺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던 파월 국무장관이 한발짝 뒤로 물러선 것’이라고 썼다.
부시 대통령과 파월 국무장관 발언의 차이는, 서로 신호가 어긋나 입을 미처 맞추지 못했거나 협조가 잘 안 된 상태로 비쳤다. 어느 경우이든 명백한 것은 부시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아직 이렇다 할 가닥이 잡히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을 만난 뒤 부시 대통령의 입에서 나온 말들은 평소 공화당이나 미 보수 진영의 단골 메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아직 뚜렷한 대북 정책이 없음을 보여주는 가장 좋은 증거다.
김대중 대통령도 이를 모를 리 없다. 방미 시기가 적절하지 않았지만, 부시 행정부의 대북 정책 결정에 입김을 쏘기 위해서는 놓칠 수 없는 시기이기도 했다. 김대통령은 워싱턴에서 ‘포괄적 상호주의’를 제안했다. 부시 대통령의 ‘투명성 보장’과 ‘북한의 합의안 이행 검증’ 요구에 대한 화답이다. 미국과 한국의 역할 분담, 북미 협상 의제 등을 명쾌하게 제시하긴 했지만 부시 행정부와 북한이 선뜻 자리를 같이할 만한 매력 있는 초대장은 못 된다. 북한이 요구하는 안전 보장과 미국이 요구하는 선 검증 가운데 어느 것이 어떤 방법으로 선행되어야 하는지 그 구체적인 대안이 없으면, 미국도 북한도 수용하기가 쉽지 않다.
부시 행정부는 임기를 2년 남겨놓은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이 한국에서 빛이 바래가는 것으로 보고 있다. 김정일 위원장의 서울 방문 등에서 뚜렷한 성과가 나오지 않고 햇볕정책에 대한 지지도가 예전 같지 않을 경우, 부시 행정부의 대북 정책 실무 팀은 클린턴 행정부의 유산 상자보다는 자신들의 새 보따리를 펼쳐 보이고 싶어할 것이다.













![[영상] “내년 서울 집값 우상향… <br>세금 중과 카드 나와도 하락 없다”](https://dimg.donga.com/a/570/380/95/1/ugc/CDB/WEEKLY/Article/69/48/a8/ac/6948a8ac1ee8a0a0a0a.png)


![[영상] “우리 인구의 20% 차지하는 70년대생, <br>은퇴 준비 발등의 불”](https://dimg.donga.com/a/380/253/95/1/carriage/MAGAZINE/images/weekly_main_top/6949de1604b5d2738e25.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