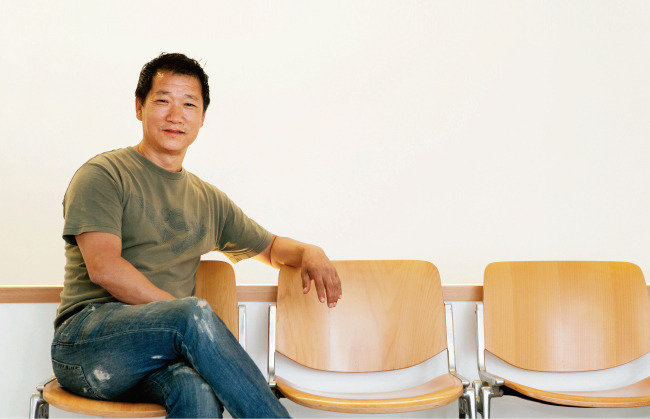
핸즈BTL은 1992년 창립 후 BTL 광고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회사다. 신문, 잡지, 방송 등에 실리는 이른바 ‘Above the Line’(ATL) 광고를 제외한 광고를 맡아 하는 곳. 각종 프로모션과 캠페인 등 소위 ‘Below the Line’(BTL)을 하는 회사라 이름이 핸즈BTL이다.
“나를 키운 건 8할이 필동”
박 대표는 2012년 이곳 필동 거리에 사옥을 지은 뒤부터 차근차근 거리로 진출하기 시작했다고 했다. ‘컨테이너’를 비롯해 동네 골목 곳곳에 누구나 관람할 수 있도록 세운 미술관만 8개다. 게다가 이게 다가 아니다. 핸즈BTL 사옥 바로 앞에는 조선시대 이 지역에 있던 중등교육기관 ‘남학당’의 이름을 딴 문화공간 ‘24번가 서재 남학당’을 세웠고, 바로 그 옆에는 신진예술가를 위한 80석 규모의 인큐베이팅 공연장 ‘코쿤뮤직’을 꾸몄다. 지난 3년여 간 꼬박 이렇게 ‘거리 만들기’에 몰두한 박 대표는 5월 19~21일, 이 거리에서 미술과 문학과 음악과 요리가 어우러진 한바탕 축제까지 열었다. 그와 마주 앉아 따뜻한 차 한 모금을 마시며 물었다. “대체 지금 여기서 뭘 하고 계시는 건가요?”“저도 잘 모르겠어요(웃음). 얼마 전 계산해보니 지난 3년 동안 이 거리에 쓴 돈이 24억 원쯤 되더라고요. 제가 좋아서 한 일이니 공적인 지원 안 받고 사재를 털었거든요. 그동안 취미로 좋은 카메라 같은 걸 수집했는데, 이번에 그것들도 싹 팔았습니다.”
그래도 축제 기간 젊은이들이 삼삼오오 몰려다니며 그림을 보고 음악을 듣는 모습을 보니 들뜨고 행복했다고 한다. 소문을 듣고 찾아온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이 ‘24번가 서재 남학당’ 3층 유리에 ‘儉而不陋 華而不侈’(검이불루 화이불치·검소하지만 누추하지 않고 화려하지만 사치스럽지 않다)라는 글을 써주고 간 것도 신나는 일이었다고 했다. 박 대표는 “어쩌면 중학교만 졸업하고 빈손으로 서울에 올라와 인쇄공, 배달부, 막일꾼 등을 하며 자리 잡는 동안, 내가 줄곧 꿈꿔왔던 게 바로 이런 일인지도 모르겠다”고, 흐뭇한 미소와 함께 이야기했다.
1964년 경남 산청에서 태어난 박 대표는 7세 때 아버지를 여의었다. 어머니가 돈 벌러 서울로 간 뒤 외할머니 손에서 자라다 그 역시 서울에 올라온 게 79년 일이다. 그러나 어머니와 함께하는 삶도 쉽지는 않았다. 호떡행상을 하던 어머니는 방 한 칸도 없는 처지였기 때문이다. 밤이 되면 수레에서 그대로 잠을 청하고, 아침에 일어나 다시 호떡을 굽는 생활이었다. 먹고살자면 그도 일을 해야 했다. 청계천에서 폐지를 주워 팔고, 식당이나 전파사에서 배달 일도 했다. 대보름날이면 도매시장에서 밤과 호두 등을 떼다가 행상을 하고, 입학·졸업 시즌에는 꽃을 팔았다. 몸이 좀 자란 뒤엔 막노동도 했다. 제법 기술이 좋아 땅고르기부터 목수, 미장일까지 건물 한 채 짓는 일을 도맡아 한 적도 있다고 했다.
그렇게 숱한 일을 하는 도중, 필동과 충무로에 걸쳐 있던 인쇄골목과 연이 닿았다. 마침 86 서울아시아경기대회, 88 서울올림픽 등으로 광고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던 시기였다. 처음엔 광고물 붙이는 것처럼 힘쓰는 일을 하다 차츰 홍보 디자인 실무로 영역을 옮겨갔다. 타고난 눈썰미와 손재주가 빛을 발했다. 그가 필동 언저리를 오가며 드나든 여러 인쇄소와 광고회사, 영화사 사무실, 카페 등 거리 곳곳이 박 대표의 학교가 됐다. 그곳에서 만난, 글 쓰고 그림 그리고 아이디어 짜내고 영화를 만드는 모든 사람이 박 대표의 스승이었다. 그렇게 박 대표는 1992년 핸즈BTL 사장이 됐고 20년 만에 사옥을 지을 만큼 돈도 벌었다.
“그러다 어느 날 문득 ‘내가 미대 졸업하고 유학까지 다녀왔다면 돈이 얼마나 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못해도 수억 원은 필요했겠죠. 그렇게 비싼 공부를 저는 이 거리에서 거저 했잖아요. 그렇다면 저도 필동을 위해 뭐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지속가능한 축제

박 대표의 꿈은 앞으로 2년 안에 스트리트 뮤지엄을 24개까지 늘리는 것.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직접 기획과 설계를 해서 미술관 4개를 더 짓고, 나머지 12개는 유명 건축가에게 의뢰해 그들의 이름을 붙인 전시공간으로 꾸밀 계획이라고 한다. 또 ‘24번가 서재 남학당’과 ‘코쿤뮤직’ 등에서도 꾸준히 문화행사를 열고, 1년에 4번씩은 이 모든 문화공간이 어우러지는 축제도 열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렇게 해서 ‘필동’이라는 이름에서 느껴지는 문화와 예술의 향기를 거리 곳곳에 실제로 살아 숨 쉬게 하는 게 박 대표의 목표다.
“스트리트 뮤지엄을 만들면서 공부하다 보니 필동이 조선시대 관립 교육기관(남학당)뿐 아니라 금속활자를 만들던 주자소가 있던 곳이더군요. 근현대에는 우리나라의 영화, 광고, 사진, 인쇄문화가 바로 이곳에서 꽃을 피웠고요. 이러한 역사적 맥락을 오늘을 사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되살리는 일을 하고 싶어요. 저 스스로 신나고 사회적 가치도 있는 일을 앞으로 꾸준히 해나갈 생각입니다.”
박 대표의 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