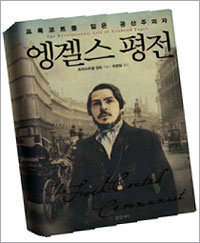
트리스트럼 헌트 지음/ 이광일 옮김/ 글항아리/ 680쪽/ 3만2000원
책은 엥겔스가 콧노래를 부르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평소보다 더없이 환한 표정. 이날 엥겔스는 20년 가까이 일해온 방직공장을 그만두고 오는 길이다. ‘장사꾼’ 생활을 접고 온전히 철학자이자 혁명가의 삶을 살게 된 것. 첫 장면이 말하듯 이 책은 엥겔스 삶의 특징 키워드로 ‘모순’을 내세운다.
엥겔스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부르주아였지만 공산주의에 심취했고, 오랜 기간 가업 격인 면직공장 공장주로 일하면서도 혁명적 운동의 끈을 놓지 않았다. 여우 사냥, 고급 샴페인, 유흥을 즐기는 동시에 자신이 속한 계급 이익을 부정하는 일은 어떻게 가능한 걸까. 엥겔스의 모든 것을 벗기겠다는 기세로 써내려간 책을 읽다 보면, 모순적 삶에 스르륵 마음이 열린다.
유년시절 그는 문학청년이었다. 당대를 휩쓸고 지나간 계몽주의보다 예술적 낭만에 심취해 시와 소설을 가까이했다. 하지만 엥겔스의 아버지는 그런 정서와 거리가 멀었다. ‘문학 나부랭이’를 끼고 사는 아들을 못마땅하게 생각해, 엥겔스를 김나지움에서 자퇴시킨 뒤 자신의 방직공장 경영수업을 받게 했다. 아버지의 압박으로 자본가의 삶을 시작했지만, 엥겔스 마음은 늘 딴 곳을 헤맸다. 스무 살 무렵에는 독학으로 헤겔을 공부하며 청년헤겔파의 면모를 갖췄고, 베를린 대학에서는 19세기의 준재가 모였다는 6호 강의실에서 프리드리히 셸링의 강의를 들었다. 그리고 산업혁명의 상징인 맨체스터 공장에서 일하며 그동안 흡수했던 추상적 지식을 보완했다.
마르크스와는 1844년 여름 파리에서 만났다. 벤저민 프랭클린과 볼테르가 드나들던 술집에서 프로이센 출신의 두 철학도는 열흘을 내리 만나며 누가 먼저랄 것 없이 손을 맞잡았다. 이론적인 모든 부분에서 완벽하게 의견이 일치함을 확인한 엥겔스는 마르크스의 평생 후원자가 되기를 자처했다. 둘의 만남을 서술한 4장에서는 두 사람을 대비한 부분이 특히 재미있다. 엥겔스는 안팎으로 균형 잡힌 사람인 반면, 감정기복이 심하고 잔병을 달고 사는 등 기질이 예민했다. 고집불통에 망상이 심해 별명이 ‘거친 검정 멧돼지’였다.
엥겔스는 공장 수입의 절반을 마르크스와 그의 딸들에게 쏟아부으며 뒷바라지에 공을 들였다. 저자는 이들의 관계를 단순한 후원 관계가 아닌 동지적 관계라고 말한다. 실제 마르크스의 세 딸은 엥겔스를 ‘작은아버지’라 부르며 따랐고, 엥겔스는 마르크스가 가정부와 잠시 눈이 맞아 낳은 아들을 자신의 호적에 올리기도 했다.
저자는 엥겔스의 삶을 모순이 아닌 헌신으로 읽는다. 또 상황에 맞춰 청년헤겔파로, 공산주의자로, 보헤미안으로 옷을 갈아입은 그의 삶이 “놀라울 정도로 현대적”이라고 평가한다. 특히 엥겔스가 공장주로 일하며 체득한 경험은 마르크스가 ‘자본’을 집필하는 데 핵심 자료로 인용됐다.
이 책은 엥겔스의 삶은 물론 그가 살았던 격동의 19세기를 역동적으로 되살려냈다. 어지러운 시대의 한복판에서도 열정과 낭만이 뒤엉킨 베를린 맥줏집. 젊은 철학도들이 밤새 머리를 맞대고 무언가를 도모하는 풍경이 손에 잡힐 듯하다.
자본주의에 매몰돼 그것을 비판의 도마에 올릴 능력을 상실한 오늘날, 엥겔스의 자본주의 비판이 주는 울림도 의미 있다. 한 사람을 통해 그 시대를 탐구하는 재미를 주는 평전의 모범 교과서라 할 만하다.

















![[영상] 새벽 5시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헬멧 쓴 출근 근로자 8열 종대로 500m](https://dimg.donga.com/a/380/253/95/1/ugc/CDB/WEEKLY/Article/69/b1/2f/08/69b12f0800eaa0a0a0a.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