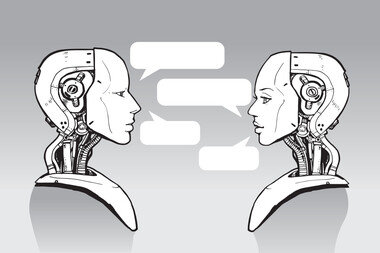11월 6일 1인 밴드 ‘달빛요정역전만루홈런’의 이진원 씨가 뇌출혈로 세상을 떠났다. 잘 알려진 대중가수는 아니었지만 패배자의 정서를 담은 직설적인 가사와 흥겨운 리듬의 곡으로 마니아층 사이에서 꽤 인지도가 있었던 이씨가 그간 생활고를 겪으며 어렵게 음악을 해온 사실이 알려지면서 디지털 음원 수익 분배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2010년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가 발간한 ‘2009 음악산업백서’에 따르면 디지털 음원시장 규모는 2001년 911억 원에서 2008년 5264억 원으로 7년 사이 5~6배 성장했다. 음반시장이 2001년 3733억 원에서 2008년 약 811억 원으로 감소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는 음악시장이 이미 디지털 음원시장 중심으로 개편됐음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하다.
비약적인 성장 불구 허전한 창작자
하지만 디지털 음원시장의 비약적인 성장에도 정작 음악을 만드는 창작자에게 돌아가는 몫은 현저히 적다. 2005년 가수 윤도현은 노래 ‘사랑했나봐’로 최고의 인기를 누리면서 디지털 음원시장에서의 매출액이 약 30억 원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그중 윤도현에게 돌아간 수익은 1200만 원 정도. 전체 수익의 0.4%에 불과하다. 인기 가수의 상황이 이러하니 인디 가수의 상황은 더 열악할 수밖에 없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일까. 먼저 소비자가 지불한 노래 값이 누구에게 어느 정도 비율로 분배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디지털 음원시장은 크게 멜론, 벅스뮤직, 엠넷, 소리바다 같은 온라인 음원 사이트에서 음원을 살 수 있는 유선인터넷 시장과 휴대전화 벨소리와 통화연결음을 제공하는 이동통신사에서 음원을 구입하는 무선인터넷 시장으로 나눌 수 있다. 소비자가 이곳에서 지불한 노래 값이 창작자들에게 전해진다.
노래를 만드는 데 기여한 이는 작사·작곡가, 가수·연주자, 제작자 등 다양하다. 노래 한 곡을 들을 때마다 이들을 일일이 만나 이용료를 지불할 수는 없다. 대신 이들을 대표하는 신탁단체가 이용료를 받아 이들에게 전달한다. 노래와 관련한 신탁단체는 작사·작곡가의 권리를 담당하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 가수·연주자의 권리를 담당하는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이하 음실련), 음원 제작자의 권리를 담당하는 한국음원제작자협회(이하 음제협)가 있다. 이 세 단체는 문화부가 규정한 징수요율을 참고해 음원 서비스 업체로부터 이용료를 배분받는다.
다양한 음원 구입 방식에 따라 요율도 달라진다. 문화부가 정한 징수 규정에 따르면 소비자가 노래 한 곡을 내려받은 경우, 지불 금액의 40%는 음제협, 9%는 음저협, 5%는 음실련이 가져갈 수 있다. 이들 신탁단체는 10~20%의 수수료를 떼고 해당 회원에게 금액을 지불한다.
현재 대부분의 음원 사이트에서 노래 한 곡을 내려받는 비용은 600원. 예를 들어 가수가 연주도 하고 노래도 했다면 600원의 5%인 30원이 가수 몫인데, 여기서 신탁단체 수수료로 10%를 내면 결국 27원 받는다. 만약 연주를 하지 않고 노래만 했다면 다시 절반은 연주자에게 돌아가고 가수의 몫은 13~14원 남는다.
대형 기획사에 소속된 가수는 이런 신탁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기획사는 네오위즈인터넷, 로엔 엔터테인먼트, 엠넷 미디어와 같은 대형 유통사를 통해 노래 값의 일부를 받는다. 이 요율은 사적계약으로 정해지는데, 한 대형 유통사 관계자는 “기획사는 보통 매출의 35~40%를 가져간다”고 귀띔했다. 하지만 대형 유통사와 음원 사이트 업체가 한 회사이거나 계열사 관계인 경우가 많다. 네오위즈인터넷-벅스뮤직, 로엔 엔터테인먼트-멜론, 엠넷미디어-엠넷 등이 그 예다. 음제협 관계자는 “음원 서비스 업체와 대형 유통 업체가 얽혀 있다”며 “노래를 직접 만드는 창작자와 제작자가 시장 구조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벨소리나 통화연결음을 판매하는 이동통신사의 경우 노래를 전곡 쓰지 않고 특정 길이로 잘라 제공하기 때문에 앞서 밝힌 배분 비율과 차이가 있다. 휴대전화 음원 수익은 제작자가 25%, 저작권자가 9%, 실연자가 4.5%를 가져갈 수 있다.
사정이 이러하니 이동통신사, 음원 사이트 등 유통 업체에서 수익을 다 가져간다는 비판이 인다. 이에 SKT 측은 “음원을 편집·가공하는 콘텐츠 제작 업체나 서비스를 운영·전달하는 플랫폼 운영 업체, 결제 서비스 업체 등 수익을 배분해야 할 업체가 다양하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를 다 제하고 나면 이동통신사에 돌아가는 몫은 23% 라는 설명이다. 음원 사이트 업계 관계자들은 최종 몫이 30~40%라고 밝혔다.
애플사가 운영하는 아이튠스의 경우 배분 비율이 3대 7로 아이튠스가 수익의 30%를 갖고 70%를 음원 유통 대행사에 넘긴다. 대중음악평론가 김작가 씨는 “애플사와 비교해 한국 상황이 더 나은 것은 아니지만 비율 자체가 크게 나쁜 것도 아니다. 그보다는 음원 가격이 워낙 낮은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아이튠스에서 노래 한 곡을 사려면 1달러 15센트, 즉 1000원 정도 지불해야 한다.
“첫 단추를 잘못 끼웠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는 디지털 음원시장이 음반시장을 대체할 것이라 예상한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당시 이동통신사는 벨소리 등 음원이 필요하자 제작자들에게 큰 금액을 선금으로 지급하고 요율은 낮게 책정해 계약을 맺었습니다. 초반에 형성된 분배 구조와 인식을 깨기가 쉽지 않습니다.”
곡당 내려받기도 비싸게 느끼는 소비자

월 정액제, 무제한 다운로드 서비스 등 저가의 패키지 상품으로 노래 가격은 더 저렴해진다.
음원료 정산 방식의 투명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많다. 음저협 관계자는 “음원 서비스 업체와 이동통신사는 파워가 너무 큰 집단이고, 음원 서비스 방식이 지나치게 종류가 많고 복잡해서 제대로 확인하기가 어렵다”며 “찜찜해도 주는 대로 받는 게 현실”이라고 한숨을 쉬었다.
이런 상황에서 창작자와 제작자가 뭉쳐 한목소리로 개선을 요구해야 하지만 이마저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신탁단체 3곳에 소속된 창작자가 많지 않아 이들 단체가 사실상 대표성을 잃어버렸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작가 씨는 “협회에 소속된 권리자, 그 밖에 권리자 등도 한목소리를 내지 못한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도 있다”고 주장했다. 복잡하게 얽힌 디지털 음원시장 상황을 명쾌하게 풀 방법은 없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