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나 그것이 불가능한 일만은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 영국 레딩대학 인공두뇌학과 케빈 워릭 교수. 오류투성이인 인간을 정신적 측면에서 ‘업그레이드’시킨 사이보그를 만들기 위해 자신의 열정을 쏟아붓고 있는 이다. 기계와 유기체의 합성어인 사이보그를 현실화하기 위한 그의 노력은 놀라움 그 자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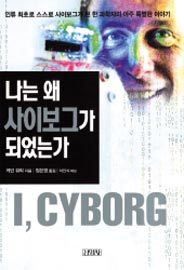
4년 후 그는 또 한 번 비상한 관심을 불러모은 실험을 강행했다. 100개의 실리콘 전극이 달린 작은 판을 왼쪽 팔의 신경에 연결해 손가락을 움직일 때 나오는 전기자극으로 컴퓨터 화면을 조작하는 데 성공했다. 생명체와 기계가 하나의 신경체계 아래 움직이는 사이보그의 개념에 한발 더 다가가는 순간이었다.
이 실험에 아내 이레나가 참여해 열기는 더욱 뜨거워졌다. 팔의 신경에 미세 전극 바늘을 삽입한 이레나도 역시 자신의 감각신호를 컴퓨터에 전송했다. 이것이 성공하자 세계 최초의 사이보그 부부는 신경계 간의 의사소통도 시도했다.
우선 케빈은 이레나의 손짓을 보지 않으려고 안대로 눈을 가렸다. 그리고 자신에게 뭔가가 느껴지기를 기다렸다. 잠시 후 ‘아름답고 달콤하고 아주 짜릿한’ 전류가 느껴졌다. 이레나가 손을 오므렸다 폈다 할 때마다 파동이 전해진 것이다. 이것으로 부부는 서로 껴안지 않고도 상대방의 감정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이것이 좀더 발전하면 서로 말하지 않고도 상대의 감정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보그가 될 수 있다고 한다.

케빈이 미래의 기계 지능이 인간을 뛰어넘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이런 것이다. 기계 지능은 네트워크화하기 쉽고 수백 가지 차원으로 정보를 처리할 수 있지만, 인간은 가까운 곳에서도 메시지를 제대로 전하지 못하는 오류투성이이기 때문이다. 인간이 ‘창조적’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긴 하지만, 스스로 학습하고 생각하며 환경에 적응해가는 능력을 지닌 기계의 등장이 예고되고 있는 지금 그런 특장만으로는 기계를 따라가기 힘들다는 예견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다 사이보그가 돼야 한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현재 인간인 상태에 만족한다면, 지금 그대로 머무르면 된다. 하지만 잊지 말라. 우리 인간이 아주 오래 전 침팬지에서 분리됐던 것처럼 사이보그도 인류에서 분화될 수 있다는 것을. 인간으로 남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류가 될 것이다. 그들은 ‘미래 세상의 침팬지’로 전락할지도 모른다.”
케빈이 이처럼 사이보그에 몰입하게 된 것은 어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1954년 영국 코번트리에서 태어난 그는 엄격한 학교 분위기에 잘 적응하지 못해 겉돌았지만 과학 과목에는 큰 흥미를 느꼈다고 한다. SF소설이나 축구, 지미 헨드릭스의 음악, 오토바이에 열광하며 사춘기를 보내고 대학 대신 직장생활을 택했다. 6년간 전화선 기술자로 일하다 과학에 대한 열정을 더 충족시키기 위해 22살에 대학생활을 시작했다. 늦게 학문을 시작했지만 그만큼 부족함을 메우기 위해 열심히 공부했고, 컴퓨터 제어시스템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물론 케빈이 주장하는 ‘사이보그 세상’은 아직 먼 얘기다. 그리고 어쩌면 이 얘기가 틀릴지도 모른다. 그러나 지금 과학은 그런 시대를 예고하고 있다.
케빈 워릭 지음/ 정은영 옮김/ 김영사 펴냄/ 520쪽/ 1만69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