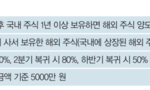도청 여부를 검증하는 기기.
그렇다면 미림팀은 어떻게 도청을 하게 됐을까. 일부 언론에서는 전직 안기부(현 국가정보원) 관계자의 증언을 인용, 서울 시내 고급 호텔 음식점이나 유명 한정식집에 ‘망원(정보 제공 협조자)’를 심어놓고 ‘현장 도청’ 작업을 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런 분석에는 결정적 약점이 있다. 적어도 수백 군데 이상 될 것으로 보이는 고급 호텔 음식점이나 유명 한정식집에 ‘망원’을 심는 작업은 말처럼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전·현직 국정원 관계자들은 “국정원이 평소 사회 지도층 인사에 대해 광범위한 ‘감청’ 작업을 해왔기 때문에 가능한 일 아니겠느냐”고 의혹을 제기한다. 유선전화 ‘불법 감청’을 통해 이들의 식사 약속장소 등을 파악한 뒤 미림팀에 ‘현장 도청’ 작업을 지시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과거 유선전화 감청을 담당했던 부서는 8국이다.
“국정원 감시 감독 더욱 강화돼야”
그렇다면 당연히 떠오르는 의문 하나. 지금 국정원이 이런 작업을 하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김대중 정권에서는 불법 도·감청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물론 노무현 정권 들어서는 적어도 최근까지는 불법 도·감청 논란이 제기된 적이 없다. 그러나 국정원 전·현직 관계자들은 “국정원이라는 조직의 특성상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도·감청을 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과거 안기부가 도청 유혹에 쉽게 빠진 것은 무엇보다 생생한 ‘육성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 대공수사국장을 역임한 한 인사의 증언이다.
“노태우 정권 시절 얘기다. 당시 안기부는 전두환 전 대통령과 김영삼 당시 민주자유당 대표의 동향이 최고 관심사였다. 그런데 대공수사국 쪽에서는 두 사람이 만나는 현장에 출동, 이들의 육성을 도청한 생생한 정보를 이튿날 아침 지휘부 책상 위에 올려놓은 반면, 정작 이런 정보를 수집해야 할 대공정보국 쪽에서는 아무래도 두 사람 측근한테서 얘기를 듣고 정보를 생산하다 보니 정확성에서 떨어졌다. 대공정보국 쪽에 지휘부의 불호령이 떨어졌음은 물론이다.”
물론 현장 도청 작업이 쉬운 것은 아니다. 장소가 결정되면 우선 종업원들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잘못하면 소문이 나고, 사고라도 생기는 날이면 상황은 심각해지기 때문이다. 미림팀에 베테랑 요원들이 배치된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일 것이다. 도청 과정은 더 어렵다는 게 전직 국정원 직원 K 씨의 지적이다.
우선 녹취 대상의 자리 설정에 따라 녹취 내용은 판이하게 달라진다. 잡음이 들리거나 정작 정보가치가 있는 얘기는 대화자들이 목소리를 낮추는 경우가 많다. 단어 하나로 문장을 만드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웬만한 소설가를 능가하는 상상력을 동원해야 한다.
이런 도청 내용은 안기부가 관리해온 ‘존안 파일’에 차곡차곡 쌓이게 된다.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도청된 ‘사적 대화’가 때론 자신의 운명을 가를 수도 있다는 얘기다. 그래서일까. 이종찬 전 국정원장은 취임 후 “안기부가 가지고 있던 자신의 파일을 가장 먼저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