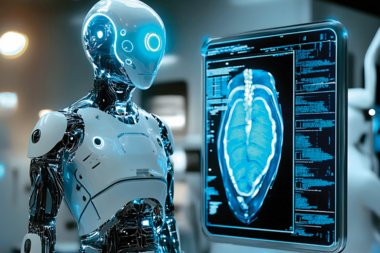쥘 베른의 소설 ‘해저 2만리’에 나오는 잠수함 ‘노틸러스’에 타고 있는 네모 선장.
그는 예언자인가?
‘해저 2만리’에서 쥘 베른은 네모 선장의 입을 통해 전기시대의 도래를 예언한다.
“언젠가 인류는 그 에너지의 역동적 힘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 에너지란 바로 전기다.”
1958년 미국의 핵잠함 노틸러스호는 북극해를 횡단하여 소설을 현실로 만들었다. 최근에는 ‘신비의 섬’에서 그가 소개한 수소 에너지를 개발하는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쥘 베른의 놀라운 예언능력에 대해 즐겨 이야기한다. 그러나 사실을 말하자면, 쥘 베른이 처음으로 예언한 것은 그리 많지 않다. 그의 소설에 나오는 것은 대부분 당시에 이미 발명되어 있었다.
사람들은 그가 처음으로 잠수함을 발상했다고 믿는다. 하지만 최초의 잠수함은 이미 1624년에 만들어졌다. 미국 독립전쟁 중이던 1776년에는 실전에 투입되기도 했다. ‘노틸러스’라는 이름의 잠수함도 1798년에 실존했다. 당시에 없었던 것의 비전 역시 대부분 다른 사람들이 먼저 제시한 것들이다. 예컨대 인간이 달에 산다는 발상은 케플러의 것이고, 달 여행은 애드거 앨런 포의 것이다. 그는 노스트라다무스 같은 초월적 예언자가 아니었다. 그저 당대의 주요한 발견과 발명을 하나의 미래주의적 비전으로 종합했을 뿐이다.
픽션의 리얼리즘
쥘 베른의 소설에는 당대에 알려졌던 첨단 기술과 그에 따르는 기술적 난제가 꼼꼼하게 기록되어 있다. 기구를 어떤 원리로 띄우고 내리는지, 잠수함이 어디서 추진력을 얻는지, 나트륨 전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 기술적 원리를 그는 소설에 분명하게 밝혀놓았다. 그의 비전은 분방한 공상의 산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당장, 혹은 머지 않은 장래에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한 현실적 전망 위에 서 있었다. 그가 자신의 소설을 한갓 ‘픽션’만으로 여기지 않았던 것은 이 때문이다.
이런 류의 과학적 사실주의는 자칫 지루할 수 있다. 그게 지루하게 느껴지지 않는 것은 거기에 ‘미지의 세계로 떠나는 여행’이라는 환상적 모티브가 결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 환상적 모험을 가능한 한 사실적으로 보이게 하려고 그는 다시금 생물학, 지질학, 천문학의 최신 지식을 모두 동원한다. 기지(旣知)와 미지(未知), 사실과 환상의 결합. 이것이 그의 소설의 묘미다. 동화나 만화로만 쥘 베른을 읽은 이들은 그의 소설의 절반을 놓친 것이다. 쥘 베른의 팬터지는 당시 과학기술과의 관계 속에서 읽어야 한다.

쥘 베른의 소설을 각색한 영화 ‘달나라 여행’의 한 장면.
쥘 베른은 자기가 알게 된 새로운 발견, 새로운 발명의 내용을 세세히 기록한 2000개의 노트를 가지고 있었다. 우리가 그의 소설에서 보는 미래주의적 비전은 바로 거기서 나온다. 그렇다면 그의 소설과 당대의 기술을 대응시켜가며 읽는 것도 재미있을 것이다. 깐깐한 사람들은 그가 소설에서 제시한 원리가 기술적으로 타당한지, 그가 소개한 기계나 장치가 실제로 작동하는지, 또 작동한다면 소설에 묘사된 만큼의 성능을 발휘하는지 따져가면서 읽기도 한다.
사실 쥘 베른의 비전에는 허황된 것도 많다. 예를 들어 ‘달나라 여행’(1865)에서 쥘 베른은 거대한 대포로 우주선을 쏘아 올린다. 이는 과학적으로 불가능하다. 대포로는 지구의 중력을 떨치고 대기권을 뚫을 수 없으며, 화약 폭발의 충격으로 캡슐 속 승무원들의 몸이 산산조각 날 테니까. 유럽에 불꽃놀이가 도입된 것이 이미 15세기. 그가 로켓을 생각하지 못한 것은 이상한 일이다. 최초의 로켓은 독일의 폰 브라운에 의해 개발된다. 폰 브라운은 어린 시절 쥘 베른의 책을 읽고 과학자가 되기로 결심했다고 한다.

‘공상과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소설가 쥘 베른.
쥘 베른의 소설은 수없이 번역되고, 수없이 영화화되고, 동화로 만화로 수없이 각색되었다. 그러면서도 정작 문학성을 높이 인정받지는 못했다. 물론 과학과 환상만으로 문학이 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의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문학적으로도 충분히 매력적이다. 특히 세상을 등진 네모 선장은 사이버 팬 클럽까지 갖고 있을 정도다. 인터넷에는 ‘지상의 견딜 수 없는 멍에 지기를 포기한’ 이 사내의 어록이 떠돈다.
“바다는 폭군들의 권력 밖에 있지. 그 표면에서는 아직 그들이 부당한 권리를 주장하고, 서로 전쟁을 하고, 서로 절멸시키며 온갖 끔찍한 일을 저지를 수 있지. 하지만 30피트만 아래로 내려가도 그들의 자의는 종말을 맞고, 그들의 말은 소용이 없고, 그들의 권력은 사라지고 말지. 오직 여기에만 독립이 있어! 여기서는 어떤 지배자도 나를 굴복시키지 못해! 여기서 나는 자유로워!”
애너그램
수수께끼, 애너그램(anagram·단어 철자들의 순서를 바꾸어 원래의 의미와 연관이 있는 다른 단어 또는 어구를 만드는 일)과 같은 말놀이도 소설의 매력을 더해주는 요소다. 그의 소설 ‘달나라 여행’의 주인공 이름은 아르당(Ardan)이다. 이는 친구 나다르(Nadar) 이름의 철자를 바꾸어 만든 애너그램이다. 나다르(1820~1910)는 당대의 유명한 사진사로, 파리 시가의 공중사진을 찍기 위해 열기구에 올랐다가 나중에는 아예 사진을 접고 열기구에 더 심취했다고 한다. 쥘 베른의 데뷔작이 ‘기구를 타고 5주일’(1863)이었다는 것을 생각해보라.
수소 연료를 예언했다고 해서 새로이 주목받은 ‘신비의 섬’. 이 소설에는 매사추세츠주(州) 출신의 기술자 사이러스 스미스라는 인물이 나온다. ‘Cyrus Smith’라는 이름을 자세히 보라. 그 안에는 ‘Christ’라는 이름과 네 개의 철자가 더 들어 있다.
cyrus smith = christ + ymsu
누리꾼(네티즌)들은 종종 ‘즐’이라고 글자를 옆으로 뉘어 ‘kin’이라는 적곤 한다. 이와 비슷하게 남은 네 개의 글자 속의 m을 90。 회전시켜 옆으로 세우면 ymsu는 yesu가 된다. ‘사이러스 스미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애너그램이었던 것이다.

인도 여행을 도와준 코끼리를 다정하게 쓰다듬고 있는 파스파르투.
기술과 예술, 과학과 환상이 결합되는 시기가 있다. 서양에는 그런 시기가 세 번 있었다. 르네상스 말에 등장하여 16세기에 만개하는 마니에리스모 시대. 이때 태동하기 시작한 과학적 사유는 아직 중세와 르네상스의 환상적 사유와 결합되어 있었다. 르네상스 시대에 이미 마니에리스모를 구현했던 레오나르도 다 빈치. 그가 남긴 수고(手稿)는 전차, 낙하산, 비행기 등 온갖 발명품의 디자인으로 가득 차 있다. 물론 이중에 실제로 제작되어 생활에 사용된 것은 거의 없다. 디자인은 그저 기계의 꿈이었을 뿐이다.
17세기는 자연과학의 시대였다. 하지만 그 시기에 과학은 그저 ‘이론’일 뿐이었다. 그게 본격적으로 실용화된 것은 19세기부터.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물건이 그때 발명됐다. 19세기에 세계의 수도는 파리였다. 전 세계에서 개발된 첨단 기술들이 파리에서 열리는 만국박람회로 모여들었다. 오늘날 우리가 ‘모던’이라고 부르는 시대, 파리에 가면 이 미래의 비전을 눈으로 볼 수 있었다. 19세기의 파리에서는 환상이 기술의 힘을 통해 현실로 변하고 있었다. 쥘 베른의 팬터지가 그때 거기서 탄생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첨단 장비가 가득한 ‘노틸러스 호’ 기관실 모습.
최근 팬터지물이 범람하고 있다. ‘해리포터’와 같은 주술적 팬터지, ‘반지의 제왕’ 같은 신화적 팬터지, ‘매트릭스’ 같은 과학적 팬터지. 이 모든 환상들이 컴퓨터 기술의 힘으로 우리 앞에 가시적 영상으로 출현한다. 신문과 잡지에는 사실인지 소설인지 구별할 수 없는 놀라운 기사들이 실린다. 인간의 뇌를 가진 쥐. 쥐의 뇌세포를 이용한 생체 컴퓨터. 19세기에 꿈을 실현한 것은 전기모터나 증기기관의 역학. 지금 우리의 꿈을 현실로 바꿔주는 것은 정보공학과 생명공학이다.
상상과 실재의 융합
내가 다시 쥘 베른을 주목하게 된 것은 올해가 그의 사망 100주년이라는 사실과는 별 관계가 없다. 100주년이 99주년, 101주년보다 더 뜻 깊을 이유가 뭐 있는가? 또 사실을 말하면 어린 시절에 나를 사로잡은 것은 쥘 베른의 상상력이 아니었다. 그 시절에 나는 외려 애드거 앨런 포의 환상과 마크 트웨인의 유머에 더 끌렸다. 내가 새삼 그를 주목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내가 보기에 21세기는 상상력이 곧 생산력이 되는 시대다. 이런 시대에는 아직 없는 것을 꿈꾸는 상상력과 그것을 현실로 전화시키는 기술의 결합, 한마디로 ‘기술적 상상력’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아득한 옛날에 사람들은 상상과 실재의 경계를 자유로이 넘나들었다. 현실에서 이룰 수 없는 소망을 그들은 상상을 통해 실현하려 했다. 그것을 ‘주술’이라 부른다. 하지만 점차 사람들은 주술이 실제로는 아무 효과가 없음을 깨닫게 된다. 이때부터 상상과 실재 사이에 높은 벽이 세워진다. 사람들은 그 둘을 구별하는 이른바 ‘분별력’을 갖게 된다. 상상과 실재를 구별 못하는 것은 유아적 특성일 뿐이다. 쥘 베른의 작품이 졸지에 아동문학이 된 것은 그 때문일 것이다.

‘해저 2만리’의 네모 선장은 인터넷 팬 클럽까지 결성됐을 만큼 매력적인 인물이다.














![[영상] “달러 수급 불균형 더 심화… <br>대비 안 하면 자신만 손해”](https://dimg.donga.com/a/570/380/95/1/ugc/CDB/WEEKLY/Article/69/52/0d/26/69520d26165ea0a0a0a.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