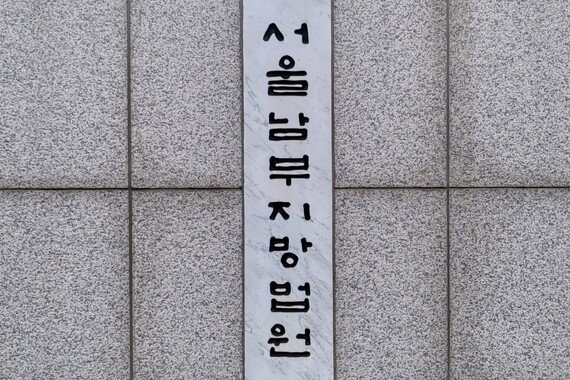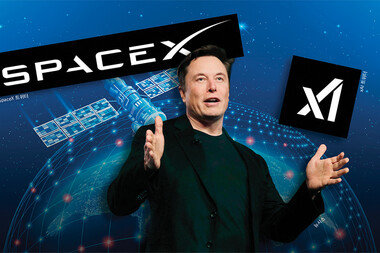월드컵에 앞서 세계 축구의 흐름과 동향을 한눈에 알 수 있는 대륙간컵은 ‘미니월드컵’이라 불린다. 비록 ‘불세출의 스타’ 프랑스의 지네딘 지단과 앙리, 브라질의 호마리우, 호나우두, 히바우두 등이 빠져 대회의 격이 떨어진 감이 없지 않지만 6개 대륙을 대표하는 팀들이 모두 참가, 한국 축구의 현주소를 냉정히 짚어볼 수 있는 국제적 시험무대로 부족함이 없었다.
한국 팀이 다시 한번 절감한 세계 축구의 높은 벽을 큰 틀에서부터 하나하나 짚어보자. 가장 애석한 것은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는 점. 한국이 개막전에서 맞닥뜨린 프랑스는 브라질의 7년 아성을 무너뜨리고 최근 세계랭킹 1위로 올라선 명실상부한 ‘축구의 최고봉’. 그들의 발 끝에서 연출되는 현란한 ‘매직쇼’에 우리 선수들 모두가 넋을 잃었다. 프랑스와의 격차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 해도 치욕적인 5-0 패배는 전술적인 측면에서 짙은 아쉬움이 남는다. v 히딩크 감독은 적극적인 공격보다 수비에 치중하며 순간 역습을 노리는 4-5-1 시스템을 구사했지만 전반에만 세 골을 허용하며 모래성처럼 무너졌다. 약점을 보완하려다 갖고 있는 장점마저 잃어버린 꼴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 프랑스와는 누구나 인정하는 수준 차이가 있는 만큼 파상적인 공격을 펼치는 한국 축구의 독특한 색깔을 자신 있게 선보이지 못한 게 안타깝다. 전 국민이 가슴을 치며 한국의 졸전에 비난의 화살을 날린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이어 벌어진 멕시코와 호주전에선 이미 4강 진출이 물 건너 갔다고 느껴서인지 화끈한 공격축구로 각각 2-1, 1-0 승리를 거둬 그나마 위안을 삼았다. 하지만 홍콩 칼스버그컵 3위(1월), 두바이 4개 국대회 준우승(2월), LG컵 이집트4개국대회 우승(4월)으로 ‘에스컬레이터 성적표’를 거머쥔 히딩크 감독이 가파른 상승세에 긴장의 고삐를 놓친 듯 이번 대회를 너무 안이하게 대처했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을 듯하다.

이번 대회에서 드러난 기술적인 문제도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이다. 현대 축구는 허리진에서 결정된다. 특히 중앙에서 필드를 진두지휘하며 적재적소에 볼을 찔러주는 플레이 메이커의 부재는 한국 축구의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다. 일본이 나카타라는 걸출한 플레이 메이커를 앞세워 세계축구의 중심부로 달려가는 점 역시 비교하여 눈여겨볼 만하다. 한국은 이번 대회에서 플레이 메이커 부재로 단순한 공격 루트에 의존했다. 양날개의 돌파에 이은 센터링, 아직까지 한국 축구가 제자리걸음을 하는 주된 이유다. 날카로운 패스를 통한 공간 침투 없이는 골 적중률을 높일 수 없다. 뛰고 뛰고 또 뛰는 비경제적인 축구로는 세계축구의 흐름을 따라잡을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견해다.
이러한 문제점은 결국 우리 대표팀이 현대축구의 화두라는 공간 개념을 완벽히 소화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에서 기인한다. 정지된 상태에서 볼을 주고받는 것은 축구사(史)에서 ‘화석’이 된 지 오래다. 수비수가 붙어 있는 상태에선 그만큼 돌파하기가 힘든 것이다. 이번 대회에서도 출전 팀 대부분은 공간개념에 뿌리를 둔 화려한 패스로 ‘구석기시대 축구’에 머물고 있는 한국팀의 부러움을 한껏 샀다.
‘새로운 피돌기’가 이뤄지지 않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황선홍 홍명보 등 한국축구의 공수 핵이 아직도 그라운드를 휘젓고 있다. 두 선수가 활약하고 있어 그나마 다행이라는 위안도 좀더 깊이 분석해 보면 그만큼 한국축구의 저변이 얕고 세대교체의 사이클이 더디다는 반증이다. 일본은 이번 대회에서 A매치에 첫 출전한 스즈키라는 새 별이 카메룬전에서 2골을 몰아넣으며 혜성처럼 등장했다. 새로운 스타의 등장과 그에 따른 신선한 충격 없이는 발전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다. 벌써 오래 전부터 지적되어 온 고질적인 문제점이기는 하지만, 한 순간의 달콤함보다 장래를 향한 호흡 긴 승부수를 던지며 과감한 선수선발과 기용을 염두에 두어야 할 시점이다. 힘을 앞세운 유럽축구에 대한 면역력을 키우는 것도 숙제다. 테크니션이 즐비한 남미축구와는 그런 대로 경쟁력이 있지만 유럽축구와 맞붙으면 꼬리를 내리는 한국팀의 고질병은 또다시 되풀이되었다. 1 대 1 몸싸움에서 강한 면모를 보여주고 공수 전환이 빠른 유럽축구의 특징이, 묘하게도 한국 축구가 감추고 싶은 근본적인 약점인 체력 및 체격의 열세를 집요하게 파고들기 때문이다. 돌이켜보면 유럽 축구의 특징과 흐름에 정통한 히딩크를 대표팀 사령탑에 앉힌 것도 바로 그런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히딩크 호’가 출범한 뒤 지금까지 A매치에서 당한 세 차례 패배 모두 유럽국가에 당했다는 사실은 이에 대한 대비책이 아직 미숙하다는 것을 입증해 주고 있다.
한 번의 실패로 좌절할 필요는 없다. 애초 우리가 대륙간컵에 둔 의미 역시 부족한 점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는 시험대로서의 의미가 아니었던가. 결국 대륙간컵은 월드컵이라는 종착역에 앞선 중간 기착지일 따름이라는 것은 감독과 선수들, 팬들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