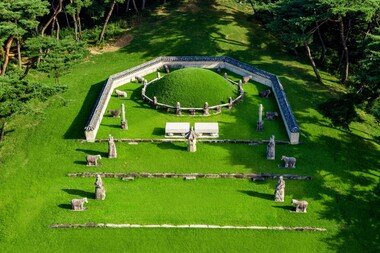이청준(1939~2008) 소설 ‘소문의 벽’(1971)을 읽다 다음과 같은 대목을 만났습니다.
“11시 50분은 넉넉히 되었을 시각이었다. 그날 밤도 나는 여느 때나 마찬가지로 콧구멍까지 잔뜩 술기운을 채워가지고 휘청휘청 하숙집 골목을 더듬어 들어가고 있었다. 나의 직업이라는 것이 늘 그렇게 취해버리지 않고는 견뎌 배길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잡지 일 말이다. 마음먹기에 따라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는 것이 잡지 만드는 일이다. 이 일은 언제나 자기 창의력과 독자에 대한 책임만을 요구한다. 창의력을 포기해버리면 독자에 대한 책임도 면제된다. 자기 창의력이나 독자에 대한 책임을 포기해버린 채 잡지를 만들어 가자면 그것보다 쉬운 일이 없다. 하지만 그것을 포기하지 않으려 하면 또 그것처럼 어려운 일이 없어진다. 잡지에서의 창의력과 책임은 언제까지나 완성되어질 수 없고, 또 결코 완성되어져서는 안 될 성질의 것이기 때문이다.”
10년 넘게 잡지를 만들어왔습니다. 불민한 탓인지 아직도 배운 것보다 익힐 게 많습니다. 창의력, 책임이라는 단어가 무겁습니다. ‘소문의 벽’은 편집자, 소설가는 ‘진술’하는 직업이라고 말합니다. 소설에서 화자 ‘나’는 “진술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전짓불이 더욱 더 두렵고 공포스럽게 쏘아댄다”고 고백합니다. 소설의 또 다른 주인공 ‘박준’은 전짓불 공포를 견디지 못하고 미쳐갑니다. 낯선 이가 까만 밤 전짓불로 박준의 얼굴을 비춥니다. 박준은 전짓불 불빛 탓에 낯선 이 얼굴을 못 봅니다. 전짓불을 든 심문관은 묻습니다. “너는 누구 편이냐.”
기자는 진술하는 사람이면서 진술을 강요하는 사람입니다. 때로는 전짓불을 든 심문관처럼 따져 묻습니다. 누구 편도 아니라고 밝힌 이가 정치권을 뒤흔들었습니다. 정치권에 발을 내딛는 순간 떼로 몰려든 전짓불이 그를 내버려두지 않을 겁니다. 그러곤 물을 겁니다. “너는 누구 편이냐.”
 소설 속 화자 ‘나’는 말합니다. “진술이라는 것을 경험해본 사람들은 비록 자발적이든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든 무의식중에든 조금씩은 그 전짓불빛 비슷한 것을 눈앞에 받아보지 않은 사람이 없을 터. 누구나 자신의 전짓불을 가지고 있게 마련이다.” 그는 진술자로서 창의력과 책임을 완성하고자 하지만 전짓불 탓에 방황합니다.
소설 속 화자 ‘나’는 말합니다. “진술이라는 것을 경험해본 사람들은 비록 자발적이든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든 무의식중에든 조금씩은 그 전짓불빛 비슷한 것을 눈앞에 받아보지 않은 사람이 없을 터. 누구나 자신의 전짓불을 가지고 있게 마련이다.” 그는 진술자로서 창의력과 책임을 완성하고자 하지만 전짓불 탓에 방황합니다.
소설책을 덮으면서 전짓불 없는 사회가 없겠으나 요즘의 편 가르기는 지나치단 단상이 들었습니다.
“11시 50분은 넉넉히 되었을 시각이었다. 그날 밤도 나는 여느 때나 마찬가지로 콧구멍까지 잔뜩 술기운을 채워가지고 휘청휘청 하숙집 골목을 더듬어 들어가고 있었다. 나의 직업이라는 것이 늘 그렇게 취해버리지 않고는 견뎌 배길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잡지 일 말이다. 마음먹기에 따라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는 것이 잡지 만드는 일이다. 이 일은 언제나 자기 창의력과 독자에 대한 책임만을 요구한다. 창의력을 포기해버리면 독자에 대한 책임도 면제된다. 자기 창의력이나 독자에 대한 책임을 포기해버린 채 잡지를 만들어 가자면 그것보다 쉬운 일이 없다. 하지만 그것을 포기하지 않으려 하면 또 그것처럼 어려운 일이 없어진다. 잡지에서의 창의력과 책임은 언제까지나 완성되어질 수 없고, 또 결코 완성되어져서는 안 될 성질의 것이기 때문이다.”
10년 넘게 잡지를 만들어왔습니다. 불민한 탓인지 아직도 배운 것보다 익힐 게 많습니다. 창의력, 책임이라는 단어가 무겁습니다. ‘소문의 벽’은 편집자, 소설가는 ‘진술’하는 직업이라고 말합니다. 소설에서 화자 ‘나’는 “진술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전짓불이 더욱 더 두렵고 공포스럽게 쏘아댄다”고 고백합니다. 소설의 또 다른 주인공 ‘박준’은 전짓불 공포를 견디지 못하고 미쳐갑니다. 낯선 이가 까만 밤 전짓불로 박준의 얼굴을 비춥니다. 박준은 전짓불 불빛 탓에 낯선 이 얼굴을 못 봅니다. 전짓불을 든 심문관은 묻습니다. “너는 누구 편이냐.”
기자는 진술하는 사람이면서 진술을 강요하는 사람입니다. 때로는 전짓불을 든 심문관처럼 따져 묻습니다. 누구 편도 아니라고 밝힌 이가 정치권을 뒤흔들었습니다. 정치권에 발을 내딛는 순간 떼로 몰려든 전짓불이 그를 내버려두지 않을 겁니다. 그러곤 물을 겁니다. “너는 누구 편이냐.”

소설책을 덮으면서 전짓불 없는 사회가 없겠으나 요즘의 편 가르기는 지나치단 단상이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