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숨 막히는 도시생활을 청산하고 시골마을로 떠나는 사람들의 ‘희망가’쯤으로 들리지만, 이는 현재 호주에서 일어나고 있는 ‘도시인의 시골 회귀 현상’을 취재한 호주국영 abc 방송 리포터의 보도 내용 중 일부다. 생존경쟁에서 패배한 낙오자들의 ‘귀거래사(歸去來辭)’로 오해받을 수도 있지만, 사실 그들은 도시에서 남부럽지 않게 성공한 이들이자 시대의 흐름을 꿰뚫어보는 혜안을 지닌 사람들이다.
호주의 시골 이주 붐이 언뜻 한국의 귀농 현상과 오버랩되지만 몇 가지 측면에서 큰 차이점이 있다. 그들 대부분은 시골 출신이 아니며 농업만 고집하지도 않는다. 게다가 첨단과학 분야의 기업과 연구소, 전람회장 등도 시골로 이사 가는 중이기 때문에 한국의 귀농과는 다를 수밖에 없다. 호주의 대표적 경제주간지인 ‘BRW’(사진)는 이런 현상을 취재해 4월 18일자 커버스토리로 다뤘다.
‘부시 붐(bush boom)’이라는 타이틀의 기사는 특히 기업 쪽에 초점을 맞췄다. 지방 부활의 이점을 유효적절하게 활용하는 기업들 사례를 소개하면서, 그들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과감한 결단, 그리고 구성원들이 시골에서 자리 잡아가는 과정을 관찰하고 있는 여타 기업의 중간평가도 곁들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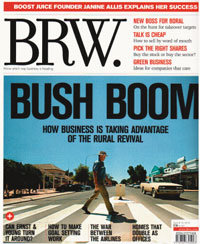
그래서 호주에서는 민요를 ‘부시 발라드(bush ballard)’라 부르고, ‘부시 소설(bush novel)’을 문학사의 중심에 놓는다. 식민지 개척시대에 신문기자였다가 작가로 변신한 마커스 클라크는 죄수들의 참상을 기사로 쓴 다음, 그 내용을 바탕으로 부시 소설을 썼다. 그의 대표작 ‘그의 자연생활(His Natural Life)’도 그런 방식으로 쓴 작품으로 호주 소설문학사의 첫 페이지를 장식한다.
1788년 약 10만 명의 호주 원주민 애버리지니(Aborigine)만이 흩어져 살던 호주 대륙에 백인들이 정착하기 시작했다. 당시 호주는 농경사회였다. 그때 영국에선 세계 최초로 산업혁명이 발생했지만 지구 반대편에 자리한 호주 식민지는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았다. 그러나 목양업이 발달하고 금광개발 붐이 일던 1850년대부터 호주는 빠르게 산업사회로 진입했다. 도시는 도시대로 유럽형 산업혁명이, 농촌은 기계영농을 통한 농업혁명이 진행됐다. 바야흐로 호주 식민지의 번영기가 도래한 것. 그 덕에 호주는 6개 식민지국가에서 하나의 연방국가로 거듭났으며 1901년에는 세계 1, 2위를 다투는 부자 나라로 성장했다.
특히 적은 수의 농민이 거대한 대륙을 목초지로 개간하다 보니 영농기계의 발명과 발달이 수반됐다. 1850년대엔 말 4마리가 이끄는 쇠사슬로 연결된 쌍끌이 쟁기가, 1930년대엔 땅을 파고 고르는 수동식 농기구와 말이나 낙타가 이끄는 궤도마차 등이 발명됐다. 그야말로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였던 셈.
기계 영농에서 첨단 과학 영농으로

호주의 시골마을에서 열린 음악축제.
하지만 거기까지였다. 호주가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 그리고 오늘날의 정보사회로 변하면서 농촌과 시골마을이 서서히 붕괴했다. 금광산업과 더불어 호주의 2대 산업으로 위용을 자랑했던 호주 농업이 1950년대에는 국내총생산(GDP)의 16%를 차지하는 데 그쳤고, 2000년대에는 3%로 쪼그라들었다. 대신 금융, 관광, 교육수출 등 3차 산업이 GDP의 80% 이상을 차지했고 이농현상이 빠르게 진행됐다.
한번 시작되면 무려 10여 년 이어지는 혹독한 가뭄도 문제였다. 특히 1980년대 중반에서 2000년대 초반까지 이어진 호주 역사상 최악의 가뭄은 농민에게 남아 있던 마지막 희망까지 앗아갔다. 급기야 농민 자살률이 도시인 자살률의 몇 배에 이르는 사회문제를 불러왔고, ‘유령마을(ghost town)’도 속출했다. 호주통계청(ABS)의 자료에 따르면, 1969년에 19만6000명이던 농민 수가 2007년에 15만 명으로 줄었다. 반면 같은 기간에 도시 인구는 3배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위기 다음에 기회가 온다고 했던가. 2000년대 중반부터 농촌 살리기 캠페인인 ‘팜 에이드(Farm Aid)’가 호주 전역에서 펼쳐졌고, 연방정부와 금융 당국에서도 적극적인 농촌지원책을 내놓았다. 세금 감면, 융자금 부분적 탕감, 과학 영농을 뒷받침하는 인프라 구축 등의 농촌 살리기 마스터플랜이 추진됐다. 특히 2007년 총선에서 초고속 인터넷망 전국화를 공약으로 내건 노동당의 승리와 가뭄 해소가 달리는 말에 날개를 달아줬다.
그러나 대부분의 영세 농민은 이미 도시로 떠난 뒤였다. 그들이 싼값으로 내놓은 농토는 대부분 기업농으로 흡수됐다. 즉 호주 농업은 대단위 농장 형태로 바뀌었고, 아울러 농촌에 큰 규모의 자본이 유입되면서 수출 중심의 농업이 연착륙했다. 그러다 보니 농업 관련 과학자, 경제학자, 공무원이 농촌으로 이주하기 시작했다.
농민(farmer) 대신 영농 비즈니스맨(agriculture businessman)이라는 직업이 등장한 때도 그즈음이었다. 농업학교를 졸업하고 트랙터를 이용해 농사짓던 사람들이 MBA 과정을 밟고, 영농 컨설턴트를 초청해 세미나를 열기 시작한 것. 고된 농사일을 마친 다음 인터넷으로 세계 경제동향을 꼼꼼히 챙기는 것도 중요한 일과가 됐다.
4월 18일자 ‘BRW’에 소개된 라라 펠(38)도 그런 사람 가운데 한 명이다. 농부의 딸로 태어난 펠은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대학을 졸업하고 도시로 진출해서 자리 잡았다. 그러나 현재 약 2100만 명인 호주의 인구가 2050년에 약 3600만 명으로 증가한다는 뉴스를 듣고는 농촌으로 돌아갔다. 머지않아 호주에서 식량부족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 그는 농업 경제를 더 배우기 위해서 MBA 과정도 이수했다.
육체와 정신 조화 새로운 삶의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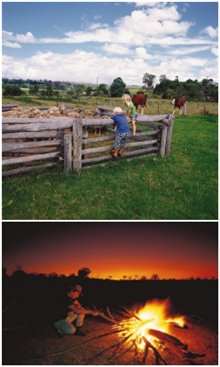
호주의 농장 풍경(위)과 오지여행을 즐기는 사람.
영국 출신인 가드너는 “대부분의 영국인은 호주에서처럼 한가한 농촌에 살고 싶어 한다. 영국에서는 꿈도 꿀 수 없는 장미정원이 딸린 전원주택에 살면서 유기농으로 농사짓고 스트레스 없는 삶을 영위할 수 있기 때문”이라면서 “마침내 나의 오랜 꿈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알고 보면 호주인들도 똑같은 꿈을 꾼다. 호주는 한반도의 35배에 이를 정도로 광대하고 인구도 2100만 명 남짓이어서 세계에서 인구밀도가 가장 낮은 국가지만, 도시의 거주 사정은 영 딴판이다. 시드니 인구가 400만 명이 넘고, 멜버른 인구 또한 400만 명에 육박할 정도로 도시집중 현상이 심하다. 호주 인구의 약 95%가 인구 2만 명 이상의 도시에 사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도심을 조금만 벗어나면 사정은 완전히 달라진다. 광활하게 펼쳐진 대자연 속에 아름답고 한가로운 길이 끊임없이 이어진다. 드넓은 대륙에 100만여 명(호주 인구의 5%에 해당)이 흩어져 살고 있으니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일고 있는 시골 이주 현상은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한편 시골마을이 되살아나는 걸 누구보다 반기는 그룹이 하위직 공무원이다. 채널9의 프로그램 ‘투데이’는 “천정부지로 치솟는 도시의 주거비용과 물가에 시달려온 경찰, 교육 공무원들은 벌써부터 시골마을로 발령 내달라는 신청서를 관계부처에 접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같은 프로그램에 출연한 ‘마크 린든 세대문제 연구소’의 마크 린든 소장은 “산업화, 정보화 사회는 물질적인 풍요를 가져다줬지만, 동시에 정신적 여유와 안정을 앗아갔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웰빙이 등장했다. 육체·정신 건강의 조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농경사회적 상상력으로 만들어낸 삶의 유형이 바로 ‘도시인의 시골 회귀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