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성천을 건너는 자리에 남아 있는 옛 경북선 철교의 흔적(월포리).
예천읍은 경북선 예천역, 또는 예천 버스터미널에서 한천 강물을 따라 동쪽으로 5리가량 떨어진 곳에 있다. 보통 기차역이 생기면, 문경과 점촌의 관계처럼 역 앞으로 번화가가 옮겨지게 마련이다. 그런데 예천은 지형상의 이유 때문인지 번화가는 옛날 읍자리 그대로이고, 역 앞엔 모텔만 하나 있을 뿐 한적하다. 지금의 예천역은 무궁화호가 하루 네 차례 오갈 뿐 교통요지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린 지 오래다.
접대받는 통신사 예천은 필수 코스
예천에서 안동까지는 일제 강점기까지 경북선 기차가 다녔다. 지금도 경북선이 있긴 하지만, 김천에서 상주 점촌 예천을 거쳐 중앙선 영주까지 가는 경부선이 다닌다. 예천-안동 구간은 1944년에 폐지됐다. 철의 수급이 극도로 핍박한 태평양전쟁 말기, 중앙선 개통으로 불요불급한 노선이 된 이 구간은 선로가 뜯겨져 경의선 복선화를 위해 전용된다. 해방 이후에도 이 구간은 부활되지 않고, 오히려 영동지방의 석탄과 시멘트 반출을 위해 영주 쪽으로 선로 방향이 바뀐다.
예천 출신 대구대 이한방 겸임교수는 “지금도 철길의 흔적이 구석구석에 남아 있다”고 했다. 흔적은 당장 나타났다. 한천을 건너 다시 낙동강 지류인 내성천을 건너는 자리인 월포진(일명 우리개) 부근에 철교의 교각이 남아 있었다. 강을 건너면서 기찻길 흔적이 농로로 변해 있었는데 해방 전에 사라진 철길이라 마을 사람들도 기억을 하지 못했다.
또 이 교수는 “예천읍에서 남쪽 한천과 내성천이 합쳐지는 지점에 ‘경진(京津)’이라는 나루터가 있었다. 경진은 ‘서울 나들이’라고도 했는데, 즉 서울로 가는 길목의 나루라는 뜻이다. 안동 쪽에서 서둘러 문경을 거쳐 서울로 가려면 산허리의 예천을 거치지 않고 경진을 거쳐 문경으로 직행했다. 갈 길이 급한 나그네나 소장수들이 그랬을 것이다. 그러나 통신사는 각 고을마다 지대(대접)를 받는 것이 통례이기 때문에 예천을 꼭 찾았고, 경진을 거쳐가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월포진을 건너면 옛 기찻길은 34번 국도와 나란히 간다. 옛길은 이보다 북쪽 ‘백아현’이라는 고개를 넘는다. 이 고장 사람들은 ‘뱃재’라고 한다. 자동차로 넘어갈 수 있지만, 지나가는 차가 거의 없어 한적하다. 새 소리와 바람 소리만 들리는 옛길다운 옛길이다. 문경의 옛길은 모두 관광지화되어 많은 인파가 몰리고 있는 데 비해, 이곳을 옛길로 인식하는 사람들은 토박이 외에는 없을 것이다. 옛길 보전과 관광 마케팅을 주장하고 있는 필자이지만, 솔직히 옛길의 매력이 넘치는 곳은 이런 길이다. 옛길의 맛은 아무도 모른다는 ‘신비감’에 있다. 그러나 아무도 모르고 있으면 마구잡이로 개발되고 훼손되기에 필자는 옛길을 찾아내 기록하고 홍보하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20리가 넘는 ‘아름다운 길’을 만끽하면서 가다 보면 길은 국도와 합쳐지고 마을이 보인다. 풍산읍이다. 풍산은 원래 속현이긴 했지만 하나의 독립된 고을이었다. 그래서 ‘풍산 류씨’라는 양반 성씨가 지금까지 내려오는 것이다. 지금은 안동시 풍산읍이다.
정오에 풍산관에서 쉬는데, 영천군수 김형대가 보러 왔다.
‘풍산관’이란 풍산읍의 객사 이름이다. 현 풍산읍은 ‘안교역’이라는 역촌이기도 했다. 그래서 풍산이 안동에 합병된 뒤인 그 당시엔 풍산관이란 안교역의 역관을 말하는 것이었다. 통신사 행렬에 따라 여기에서 잘 경우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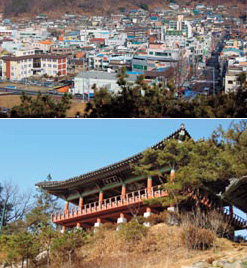
옛 고을의 규모 그대로인 예천 읍내, 낙동강 남안으로 옮겨 지어진 안동 영호루.(위부터)
풍산읍 사무소 근처에는 열차 승강장으로 보이는 구조물이 남아 있다. 주변에 곡식창고가 즐비한 것도 여기가 기차역이었음을 증명해주고 있다. 지금은 승강장 위까지 창고가 새로 건립되고 있다. ‘풍산들’은 말 그대로 풍요로운 곡창지대였다.
풍산을 출발하면 다시 국도와 나란히 가게 된다. ‘두실원’이라는 원터마을을 지나면 풍산땅과 안동땅을 나누는 두솔고개를 넘는다. ‘안기역’이 있었던 안기동을 지나면 안동 시내로 들어간다.
저녁에 안동부에 들어갔다. 전에 세 차례 이곳에 온 일이 있었는데, 물색(경관)이 전과 다름이 없으니 참으로 웅장한 대도호부이다.
안동은 내륙지방에는 드물게 읍성이 있어 충주나 상주와 마찬가지로 여기가 대읍이었음을 증명해준다. 읍성의 크기도 왜구 침입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동해안이나 남해안의 소읍들과 달리 크고 웅장하다. 안동시청 현관에 공민왕이 사액했다는 ‘안동웅부’라는 현판이 걸려 있어 그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다. 통신사 일행이 우회길을 택해 일부러 안동을 들를 만하다.
읍성은 지금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일제 강점기에 크게 훼손되고, 그나마 남은 일부 성벽도 6·25전쟁 후 도시계획에 따른 도로 개설로 모두 없어졌기 때문이다. 안동역 앞에서 조흥은행으로 이어지는 길에 남문이 있었고 안동시청 맞은편 부근에 북문이, 그리고 시영 임시주차장 앞에 동문이 있었다. 안동시가 세운 북문 터 비석은 안타깝게도 원래 위치보다 100m가량 서쪽에 있다. 설치할 자리가 없었던 것인가?
동헌으로 이어지는 내삼문은 지금 복원공사 중이다. 여기는 안동 통합시가 생기기까지 옛 안동시청이 있었던 자리다.
각도를 따라 주수와 같이 망호정에 오르니, 누관이 자못 웅장하였다. 종일토록 이야기하다가 밤이 되어서야 파하였다.
여기서 누각 이름인 망호정의 ‘호(湖)’란 안동읍 앞을 흐르는 낙동강을 말한다. 호수처럼 넓은 강폭으로 도도한 흐름은 지금도 다름이 없다.
이날은 80리를 갔다.

















![[영상] 새벽 5시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헬멧 쓴 출근 근로자 8열 종대로 500m](https://dimg.donga.com/a/380/253/95/1/ugc/CDB/WEEKLY/Article/69/b1/2f/08/69b12f0800eaa0a0a0a.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