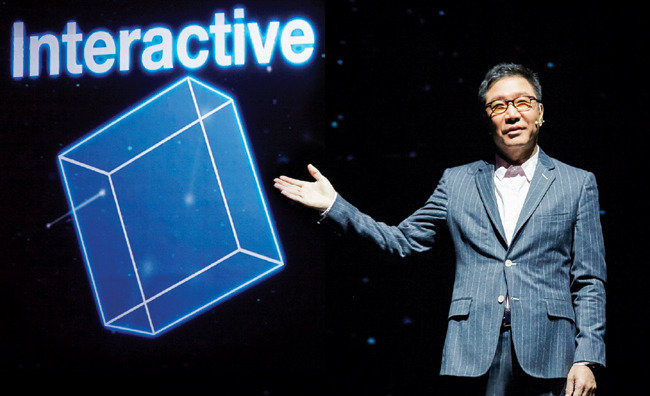
SM엔터테인먼트(SM)는 그런 면에서 한국의 포디스트(Fordist) 기업이다. H.O.T., S.E.S, 신화, 보아, 동방신기, 슈퍼주니어, 샤이니, 에프엑스(f(x)), 소녀시대, EXO, 지금의 레드벨벳까지 SM은 소속 가수 대부분을 성공시켰다. 시스템의 힘이다. 시장의 수요 변화를 예측한다. 이에 맞는 콘셉트를 설정한다. 연습생 오디션과 캐스팅을 거쳐 오랜 트레이닝 후 데뷔시킨다. SM의 새로운 아이돌이 데뷔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연예뉴스 톱에 오른다. 데뷔하는 순간 스타가 된다. 컨베이어벨트가 도입된 후 포드 자동차의 주인공은 숙련된 장인이 아니라 헨리 포드 혹은 포드사라는 시스템이었다. 마찬가지다. SM(혹은 다른 대형 기획사) 소속 아이돌의 주체는 멤버 개개인이 아니다. SM이라는 시스템이다.
이 같은 사업 전략은 예술과 산업이란 대중음악의 두 축 가운데 후자에 강력한 방점을 찍는 행보였다. 보아를 필두로 한국 대중음악을 내수산업에서 수출산업으로 발전시킨 원동력이기도 했다. 보아와 동방신기가 일본에서 성공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케이팝(K-pop) 시장은 없었을 것이라고 봐도 좋다. 현재 SM 시가총액은 9461억 원에 달한다. 업계 2위 YG엔터테인먼트(YG)는 6683억 원이다.
1월 27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SM타운 코엑스아티움. 이수만 대표 프로듀서가 신규 프로젝트 5개를 발표했다(사진). △1년 52주 동안 매주 다양한 형태의 음원을 선보이는 ‘스테이션(STATION)’ △EDM(Electronic Dance Music) 전문 레이블인 ‘스크림(ScreaM) 레코드’와 EDM 페스티벌 론칭
△노래방과 영상제작 공유, 셀러브리티 관심사 기반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기능을 아우르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누구나 신인 프로듀싱에 참여할 수 있는 앱 △스타가 직접 참여하는 라디오, 웹 드라마, 예능 등을 다루는 멀티채널네트워크(MCN)까지다.
이들 다섯 가지 신사업은 두 묶음으로 볼 수 있다. 첫째, 그동안 축적해온 스타 메이킹 시스템 자체를 엔터테인먼트 산업으로 만든다는 것이다. 아이돌 산업의 꽃은 당연히 멤버들이다. 하지만 그 멤버들 뒤엔 수많은 인력이 있다. 매주 음원 한 곡을 발표하며 인력 활용을 극대화한다. EDM 레이블을 설립해 프로듀서 인재풀을 강화한다. 기존 시스템을 일반에게 오픈해 닫힌 생태계를 열린 생태계로 전환한다. 아이돌 그룹을 내세우지 않아도 되는 EDM 페스티벌을 통해 아이돌에 가려진 프로듀서 집단을 또 다른 스타로 만든다. 이런 흐름은 기존 아이돌 시스템에 투입되던 인적 자원을 또 다른 주인공으로 만들 수 있다.
둘째, SM 스스로 플랫폼이 되겠다는 거다. MCN이 단적인 사례다. 젊은 층은 더는 TV 앞에 없다. 모니터 앞에도 없다. 모바일에 맞게 가공된 동영상 앞에 있다. 굳이 방송국에 잘 보일 필요가 없다. 지난해 네이버에서 론칭한 V앱의 성공에서 알 수 있듯, 충성도 높은 팬층을 두텁게 확보한 스타라면 기존 플랫폼에 얽매이지 않아도 된다. 오랜 팬 관리를 통해 쌓아온 노하우는 새 플랫폼을 팬들에게 한층 친화적인 콘텐츠로 채울 수 있다.
YG가 외식업이나 화장품 등 엔터테인먼트와 그다지 상관없는 분야의 신사업에 진출하고 있는 반면, SM은 그동안 쌓아온 시스템과 스타 파워를 통해 외연을 확장하려는 모양새다. YG 주가는 지난해 8월 이후 하향세를 그리고 있다. SM은 등락은 있지만 상향세다.
SM은 1989년 설립됐다. 부침 끝에 1996년 H.O.T.가 성공했다. 올해는 이를 가능케 했던 컨베이어벨트 시스템이 도입된 지 딱 20주년이다. 기존 시스템은 이미 중국을 비롯한 주변 국가에서도 속속 도입하고 있다. SM은 추격당할 것인가, 혁신을 통해 새롭게 도약할 것인가. SM의 신사업은 한 회사뿐 아니라 한류산업의 근미래를 가늠할 수 있는 리트머스시험지가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