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답한 도서관이나 독서실을 떠나 카페에서 공부하는 사람들, 이른바 ‘카공족’이 늘어나는 추세다. 5월 2월 인터넷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대학생 570명을 대상으로 공부하기 좋은 장소를 조사한 결과 ‘카페’라는 응답이 37%로 1위를 차지했다. 스터디카페는 이들을 위한 완벽한 장소다. 도서관처럼 엄숙하지도 않고 카페처럼 소란스럽지도 않은 분위기다. 게다가 간단한 식음료까지 즐길 수 있는 편의성에 이용객들 만족도가 높다.
백색 소음이 집중력 높여
스터디카페는 카공족의 왕국인 서울 강남, 신촌 일대에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2010년부터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우후죽순 생겨난 스터디룸이 회의를 하고 공부도 할 수 있는 세미나룸을 빌려주는 형태였다면, 스터디카페는 독립적 공간 또는 개방형 공간에서 개별적으로 공부하며 식음료를 제공받아 먹을 수 있는 형태다. 쉽게 말해 세미나룸 또는 독서실 같은 학습 장소 기능과 식음료를 먹을 수 있는 카페 기능이 합쳐진 업태다.크게 늘어나는 카공족만큼이나 스터디카페도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1년여 사이에 100개 넘던 강남 일대 스터디룸 가운데 60여 개가 스터디카페로 업종을 전환했을 정도. 이름만 바꾸고 식음료를 제공하면 될 것 같지만 이름과 운영 형태가 바뀌면 영업 관련 규제도 크게 늘어난다.
대학생 김근영(25) 씨는 “카페에서 공부하는 게 더 여유롭게 느껴진다”며 “도서관처럼 답답한 분위기가 아니어서 좋다”고 했다. 취업준비생 이호준(28) 씨는 “학교 도서관에 가면 후배들이 ‘요즘 뭐 하느냐’고 물어서 부담스럽고 구립도서관이나 독서실은 유난히 소리에 예민한 사람이 많아 책장 넘기는 소리조차 눈치가 보인다”며 “그에 비해 스터디카페는 편안한 마음으로 공부하다 올 수 있는 곳”이라고 밝혔다.
카공족이 스터디카페를 찾는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다양한 식음료가 제공되기 때문이다. 대학생 김혜지(23) 씨는 “분위기도 좋지만 음료도 스터디카페를 선택하는 이유”라면서 “공부하기 싫어 집에 가려다가도 커피라도 마시고 가자며 스터디카페에 앉게 된다”고 말했다. 취업준비생 최재현(26) 씨는 “독서실이나 도서관에서 음식을 먹으려면 밖에 나가야 해 불편하고 도서관 매점의 경우 취향에 맞는 식음료가 없는데, 카페는 이런 것을 잘 갖춰놓아 만족스럽다”고 했다.
편리성 외에 공부 능률 측면에서 스터디카페가 우월하다는 주장도 있다. 대학생 허은미(24) 씨는 “책장 넘기는 소리나 마우스 소리 등 생활 소음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데다 작은 소음이 있는 편이 오히려 적막한 도서관에 비해 집중이 더 잘되는 것 같다”고 답했다. 스터디카페 체인을 운영하는 강모(36) 씨는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백색소음이 있는 공간이 오히려 조용한 공간보다 작업 집중력을 높여준다는 연구 결과를 듣고 시장성이 있다고 생각했다”며 “백색소음이란 작게 반복되는 소리들인데 귀에 쉽게 익숙해지는 동시에 거슬리는 주변 소음을 덮어주는 기능을 한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공부 공간으로 급부상하고 있지만 스터디카페를 열고 운영하기 위해선 많은 규제 장벽에 부딪히게 된다. 스터디카페는 일단 ‘공부하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스터디룸처럼 학원으로 취급된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제2조 5항에 따르면 30일 이상 교습, 혹은 공부에 사용되는 시설이라면 독서실로 간주해 학원으로 취급된다. 따라서 스터디카페를 열고 운영하려면 관할 교육청에 신고하고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와 동시에 카페 기능, 즉 식음료 판매에 대한 영업허가를 관할 구청에서 받아야 한다. 제공하는 식음료 종류에 따라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또는 간이휴게시설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 하나의 사업장을 개설하기 위해 두 곳의 행정기관에서 두 개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애매한 법 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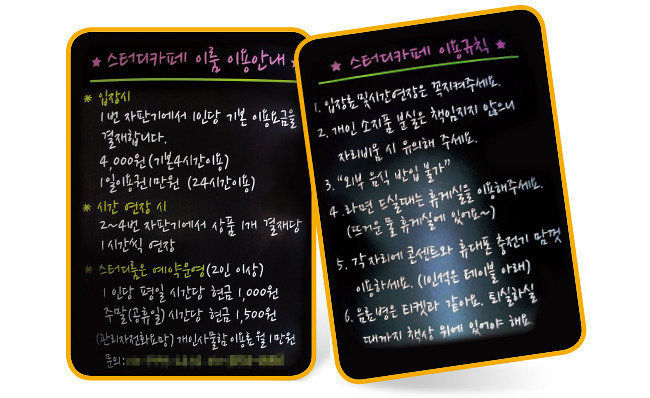
반대로 독서실 허가만 받고 영업하는 경우도 있다. 서울 성동구 왕십리역 인근에 위치한 24시간 무인 Y스터디카페는 간판에는 카페라고 명시돼 있지만 카운터에 사람은 없다. 입구에 설치된 자판기에서 대금을 결제하고 식음료를 빼내야 공부하는 공간으로 넘어갈 수 있는 시스템이다. 무인 스터디카페 관계자는 “독서실과 자판기만 허가받고 운영 중”이라며 “학교 근처에서 영업하는 만큼 월 단위 정액 손님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할 성동구청 관계자는 “독서실에 자판기를 놓는 정도는 식품위생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며 “물론 자판기의 위생 상태는 따로 검수를 받지만 종업원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규제받는 부분이 다른 업종에 비해 적다”고 답했다.
이 밖에 아예 관련법에 대해 모르고 영업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기자가 전화로 혹은 영업점에 직접 찾아가 문의한 결과 강남, 신촌 일대 12개 업체 가운데 5곳의 운영자가 관련법과 내용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답했다. 규제기관도 헷갈리기는 마찬가지다. 교육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관계자는 “(스터디카페는) 신종 업종이어서 관련 제도가 아직 정비되지 않았다. ‘카페에서 불법으로 독서실 영업을 한다’는 신고가 들어와 이런 곳(스터디카페)이 있는 줄 알았다. 전화 신고 내용으로는 학원법에 포함되는 대상인지 알기 어렵고 가서 직접 확인해도 애매한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영상] “내년 서울 집값 우상향… <br>세금 중과 카드 나와도 하락 없다”](https://dimg.donga.com/a/570/380/95/1/ugc/CDB/WEEKLY/Article/69/48/a8/ac/6948a8ac1ee8a0a0a0a.png)


![[영상] “우리 인구의 20% 차지하는 70년대생, <br>은퇴 준비 발등의 불”](https://dimg.donga.com/a/380/253/95/1/carriage/MAGAZINE/images/weekly_main_top/6949de1604b5d2738e25.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