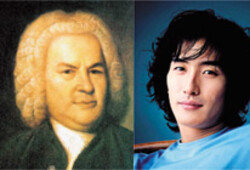우울한 사회 분위기를 경쾌하게 만드는 패션 아이템이다.
학교를 오가는 학생들에게 춥지 않냐고 물으면 한결같이 “아니오. 생각만큼(!) 춥지 않아요”라거나 “예쁘잖아요. 참야야죠”라는 대답이 돌아온다. 여자의 변신은 무죄라더니…. 추운 겨울에 아찔한 충격과 신선함을 준다.
계속되는 경기불황에 울상을 짓던 의상업계는 앞다투어 미니스커트를 내놓고 소비자들의 굳게 닫힌 지갑을 열게 하려 했는데 미니스커트가 백화점 여성 캐주얼 매출 상위를 휩쓸었으니 어느 정도는 적중한 듯싶다.
옷이 한 시대의 생활상을 대표하는 문화·사회적 코드라는 점이 ‘불황기엔 치마 길이가 짧아진다’는 논쟁을 불러오는 게 아닌가 싶다.
원래 미니스커트는 1950년대 후반 영국 디자이너 ‘메리 퀸트’에 의해 창시되었고(당시까지만 해도 무릎 아래 길이였다), 60년대 프랑스의 디자이너 ‘앙드레 꾸레주’에 의해 파격적으로 짧아진 라인이 출시되면서 어린 소녀 같은 이미지로 유명한 말라깽이 ‘혼혈아’ 모델에 입혀져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퍼져나갔다. 여학생처럼 짧은 미니스커트와 플랫한 구두를 신는 것은 매우 젊어 보이는 스타일로서 당시 여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우리나라에서는 67년 가수 윤복희가 입고 김포공항에 들어서면서 유행의 급물살을 탔는데 70년대 유신정권 시절 ‘장발’과 함께 경범죄 처벌 대상이 되면서 ‘그 시절 그 모습’에서 빠지지 않는 스타일이 되어버렸다.

패션쇼와 거리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미니스커트.
불경기 땐 위축된 소비심리를 자극하기 위해 긴 치마가 유행하고, 경기 상승기엔 사람들의 관심사가 성적인 매력을 표출하고자 하므로 치마 길이가 짧아진다는 것이다.
학설이나 속설이 어떻든 올 겨울엔 미니스커트가 유행이니 소심한 사람들도 한번쯤은 용기 내서 입어보는 게 좋겠다. 어그 부츠나 종아리까지 오는 까만 판탈롱 스타킹이 올해의 미니스커트를 더욱 돋보이게 하는 아이템이라는 점도 잊지 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