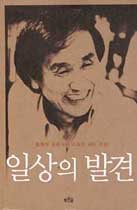
김용석씨(영산대 교수·철학)와 전여옥씨(인류사회 대표)도 말 잘하고 글 잘 쓰는 것으로 둘째가라면 서러울 사람들이다. 어쩌면 저리도 아는 게 많을까, 어쩌면 저렇게 말도 잘할까 감탄을 연발하지만 비결은 있다. 이들의 공통점은 일상의 사소한 것들을 놓치지 않는 관찰력이다. 그러니까 말로 꺼내기 전에 누구보다 세상을 열심히 본다.
‘철학자 김용석의 유쾌한 세상 관찰’이라는 부제가 붙은 ‘일상의 발견’(푸른숲 펴냄)은 우리가 아무런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사회적 통념을 깨기 위해 그가 얼마나 섬세하게 우리의 일상을 관찰했는지 보여준다. 김용석씨는 개념과 관찰의 관계를 이렇게 말했다. “개념의 성실한 전개는 관찰의 시각에 초점을 제공해 주고, 일상에 대한 현미경적 관찰은 개념체계를 사실적 근거들로 채워주기 때문이다.”
그는 또 관찰 이전에 관심이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즉 ‘마음을 열어두고 있어야 성실하게 살펴보게 된다’는 설명이다. 늘 세상을 진지하게 바라보니 서부의 건맨과 도시의 폰맨(휴대전화를 든 사람)의 공통점이 보이고, 아줌마 이데올로기의 폭력성을 발견할 수 있다. 하루에도 수십번씩 밀고 당기는 문이 단순히 문이 아님을 ‘회전문의 기만’ ‘여닫이문의 배반’ ‘미닫이문의 복귀’라는 글에서 명료하게 설명한다.

‘일상의 발견’이 당장 논리적 사고를 키워야 할 고3 수험생들에게 유용한 책이라면, ‘대한민국은 있다’는 알맹이 없이 ‘뽀대’만 찾는 우리 사회의 상류층 환자들에게 선물하고 싶은 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