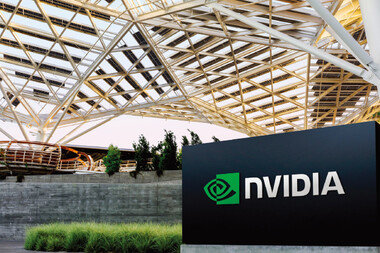서울 장충동 족발거리(위)와 족발.
평남할머니집은 만화 ‘식객’에 등장하면서 더 유명해졌다. 식당 입구에서는 여전히 현역인 김 할머니가 카운터를 지킨다. 카운터 건너편의 커다란 통에 족발이 수북이 쌓여 있다. 주문과 동시에 아주머니 2~3명이 족발을 썰어 낸다. 테이블마다 방금 썬 족발이 가득하다. 족발을 시키면 반찬과 함께 이 집의 인기 음식인 살얼음이 떠다니는 건건한 동치미가 나온다. 기름진 족발 맛을 다스리는 데 제격이다. 두툼하게 썬 졸깃한 껍질과 향긋한 살코기를 동시에 푸짐하게 맛볼 수 있는 이 집 족발을 먹다 보면 사람들이 왜 족발을 좋아하는지 알 수 있다.
장충동 족발의 성공 이유로 1960~70년대 구름 관중을 불러 모은 장충체육관 신화를 많이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이북 5도청도 잠시 있었던 장충동 일대는 실향민이 많이 정착한 곳이다. 평남할머니집과 뚱뚱이 할머니집도 처음에는 이북사람을 대상으로 장사를 시작했다고 한다. 평안도는 일제강점기에 고기 문화가 성행한 곳이었다.
중국과 가까운 평안도나 함경도를 제외하면 돼지고기는 한민족에게 그다지 환영받지 못했다. 그 이유는 돼지가 농경에 잘 어울리지 않는 가축이기 때문이다. 돼지는 소처럼 일할 수도 없고, 닭처럼 사람을 깨우지도 못하며, 말처럼 달리지도 못하고, 오직 먹고 살을 찌우기만 하는 가축이다. 그렇다고 돼지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었다. 돼지고기는 제사상에 빠질 수 없는 음식이자 중국 사신들에게 꼭 필요한 고기였기 때문이다.
1960년대 말부터 일본 육고기 문화가 본격적으로 성장하자 돼지고기 살코기 수출이 시작된다. 도축장이 있던 서울 마장동 주변에는 수출하고 남은 내장과 다리, 머리 같은 돼지 부산물이 넘쳐났다. 서울로 몰려든 가난한 노동자들에게 돼지 부산물로 만든 순대나 족발은 최고의 단백질 공급원이었다. 저녁이면 마장동과 가까운 청계천, 동대문에서 장충동으로 이어지는 주변에 노동자와 서민들이 모여 저렴하고 맛있는 족발과 순대를 먹었다.
1970년대부터 대중 외식의 한 축을 담당한 장충동 족발은 어느 음식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받았을까. 먼저 오향장육 기원설이 가장 많이 거론된다. 그러나 오향장육과 족발은 그다지 닮지 않았다. 중국 요리책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오향장육을 돼지발로 만들었다는 레시피는 없다.
오향장육보다는 산둥성 명물 족발인 홍샤오주티(紅燒猪蹄)가 우리나라 족발과 유사성이 더 많다. 홍샤오는 산둥성 루차이(魯菜) 요리법의 하나이다. ‘고기나 생선 등을 기름과 설탕을 넣어 볶은 후 간장을 넣어 색을 입히고 다시 조미료를 가미해 졸이거나 뚜껑을 닫고 익히는 조리법’으로 3시간 정도 약한 불에 끓이면 족발이 완성된다. 홍샤오법을 사용한 홍샤오주티는 색과 고기 상태가 우리 족발과 가장 많이 닮았다. 가장 큰 차이는 중간에 돼지발을 토막 낸 후 끓인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