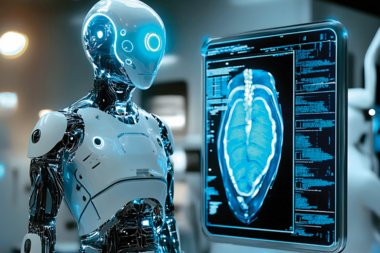빠른 속도로 여행하면 그만큼 놓치는 것 많아
걷기는 인류 최초의 여행 방법이다. 이후 여행은 말이나 소, 낙타, 당나귀 등을 이용하는 것으로 진화했고 이제는 자동차가 주요 여행 수단이 됐다. 물론 자동차는 매우 유용한 도구다. 빠른 속도 덕분에 짧은 시간에 멀리 갈 수 있으며 체력의 한계도 초월할 수 있다.
하지만 빠른 속도는 그만큼 많은 것을 놓치게 한다. 그것을 깨달은 사람이 늘면서 서서히 느린 여행에 눈을 뜨기 시작했다. 여전히 자가용을 이용한 여행이 주를 이루지만 느린 여행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결국 인류 최초의 여행 방법이던 걷기로 회귀하는 것이다.
걸을 수 있는 길은 수없이 많다. 집을 나서는 순간부터 세상 모든 곳이 길인 덕분이다. 그러나 오래도록 자신의 두 발로 걷는 느린 여행에 목말랐던 사람이라면 ‘슬로시티’로 떠나보는 것이 어떨까. 우리는 그곳에서 자유와 안위는 물론, 삶의 위로까지 얻을 수 있다.
슬로시티는 1999년 10월 이탈리아에서 시작한 운동이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자연 생태를 보호하고 전통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고취해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다. 국제슬로시티연맹은 전남 신안군 증도, 전남 완도군 청산도, 전남 담양, 경남 하동, 전북 전주한옥마을을 비롯한 10개 장소를 우리나라의 슬로시티로 지정했다.
증도는 우리나라 최대 갯벌염전이 있는 곳이다. 끝없이 펼쳐진 바둑판 모양의 염전은 아름답기도 하거니와 신이 내린 축복의 땅이라는 칭송까지 들을 만하다.
슬로시티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청산도는 섬 전체가 느림의 미학을 보여주는 곳이다. 밭과 밭 사이, 밭과 집 사이에 쌓은 낮은 돌담은 정겹고 인간적이다. 어촌마을에서 볼 수 있던 장례 풍속인 풍장이 아직도 남았고,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주민의 모습은 평화롭기 그지없다. 아름다운 풍경 덕분에 ‘서편제’를 비롯해 여러 편의 영화와 드라마를 청산도에서 촬영했다.
대나무의 고장 담양은 현대와 전통이 공존하는 곳이다. 삼지천 마을의 고택과 슬로푸드라고 할 수 있는 창평국밥, 국수, 떡갈비, 한과 덕분에 슬로시티의 요건을 두루 갖춘 것으로 평가받는다.
하동은 차재배지로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슬로시티로 지정됐다. 산기슭에 퍼진 하동의 야생차밭은 1300년이 넘는 뿌리를 갖는다. 그뿐만 아니라 대하소설 ‘토지’의 배경으로 문학의 향기까지 머금은 곳이다.
전주한옥마을은 우리나라의 대표적 전통도시인 전주에 있는데 이곳은 견훤이 세운 후백제의 수도이자 조선 왕가의 발상지다. 또한 전통문화인 한지와 판소리는 물론, 고유 먹을거리인 전주비빔밥도 유명하다.

슬로시티 증도에 가면 길 끝에서 하얗게 부서지는 바다의 포말을 만날 수 있다.
어쩌면 우리는 많이 지쳤는지도 모른다. 일에 지치고, 술에 지치고, 사랑에 지치고, 외로움에 지친 사람들. 내일을 살아야 하는 지친 가슴 모두에는 이제 두 발로 걷는 느린 여행이 필요하다.
우리는 너무 빠른 세상에서 산다. 사회는 속도가 승자의 조건이라고 가르친다. 그러는 사이 느림의 가치를 잊었고 사람들의 가슴은 병들기 시작했다. 그 병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두 발로 관조하며 걷는 느린 여행이며 그러한 철학을 담은 도시가 바로 슬로시티다.
그곳에 가면 구불구불 휘어진 길 끝에서 들꽃이 우리를 반기고, 하늘을 반으로 가르는 수평선과 하얗게 부서지는 포말이 우리를 포옹할 것이다. 시작도 알 수 없는 곳에서 불어온 바람이 우리 가슴을 어루만지고, 찬란한 몇 줌의 햇살이 우리 어깨 언저리에 손을 올릴 것이다. 보석보다 아름다운 초록과 수정보다 투명한 빛깔. 계절은 겨울로 치닫지만 그곳은 언제나 포근한 봄이다.
바람과 햇살과 풀과 새소리 하나하나에 귀를 기울이고 오래도록 낡았던 더듬이를 닦아내는 것이 두 발로 걷는 느린 여행의 묘미다. 앞서갔던 사람이 차곡차곡 다져놓은 깨달음의 여정을 조용히 되새김하며 걷는 동안, 우리는 어딘가 모르게 쫓기며 살았던 자신의 삶을 발견한다. 부둥켜안으려 애썼던 많은 것이 부질없다는 사실도 깨닫는다. 따라서 그렇게 바빴음에도 왜 손에 남는 것이라고는 흔적 없이 빠져나간 모래알처럼 껄끄러운 감촉뿐이었는지를 이해한다면 돌아와서 맞이하는 우리의 삶은 더욱 웅숭깊어질 것이다.
바쁘다는 핑계는 가장 낡은 변명이다. 그 변명에 속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만약 그것이 진실한 이유라면 두 발로 걷는 느린 여행이야말로 가장 필요한 경험이다. 서류뭉치와 컴퓨터와 통장 잔고보다 더 우선시해야 할 것이 바로 길이다. 길의 주인은 자동차가 아닌 사람이다. 바쁜 세상이 결코 가르쳐주지 않는 진실이 우리가 나서는 길에 차곡차곡 펼쳐져 있다.













![[영상] “달러 수급 불균형 더 심화… <br>대비 안 하면 자신만 손해”](https://dimg.donga.com/a/570/380/95/1/ugc/CDB/WEEKLY/Article/69/52/0d/26/69520d26165ea0a0a0a.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