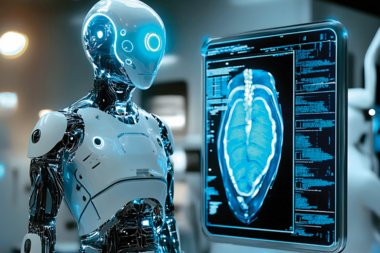대만이 일본 지배에서 해방돼 국민당 군이 진주한 지 2년 뒤인 1947년 2월. 타이베이 시내에서 밀수 담배를 팔던 대만 여인이 본토 출신 단속원한테서 구타당하는 일이 일어난다. 대개의 폭동이나 혁명이 그렇듯 이 사소한 충돌은 곧 대규모 사태로 확대된다. 흥분한 수천명의 대만인들이 타이베이 시내 전매청으로 쳐들어갔고, 이를 막던 경찰이 발포를 하면서 사태는 유혈사태로 번졌다. 도화선은 강압적 단속 과정에서 빚어진 폭력 행위였지만 이 작은 불씨를 폭발하게 한 것은 점령군처럼 행세하는 데다 부패한 국민당 정권에 대한 대만인들의 누적된 불만이었다.
결국 국민당 정부는 본토에서 국공 내전을 벌이던 군 일부를 급히 빼내 대만에 투입하고서야 겨우 진압에 성공한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수만명으로까지 추정되는 대만인들이 목숨을 잃었다.
이것이 한국의 5·18민주화운동(1980), 혹은 제주도4·3사건(1948)에 흔히 비견되는 대만의 ‘2·28’사건이다. 본토인과 대만인 사이에 지울 수 없는 마음의 휴전선을 깊게 새겨놓은 사건이다.
그러나 이후 이 사태는 역사의 침묵 속에 묻혀버렸다. 국민당 정부의 철권통치 지배 아래서 이 사건은 금단의 성역으로 묶여 있었고, 사건의 진실이 햇빛 속으로 나오기까지는 40년이 지나야 했다. 49년 공산당에 패해 대만으로 쫓겨오면서 내려졌던 계엄령이 38년 만에 해제된 87년 이후에나 2·28사건에 대해 얘기하는 게 가능해졌다.
그리고 2·28사건을 소재로 한 허우샤오셴(候孝賢) 감독의 영화 ‘비정성시(非情城市·사진)’가 나온 것은 바로 그 2년 뒤인 1989년이었다. 이 영화는 그해 베니스영화제에서 그랑프리를 수상하면서 더욱 주목을 받았고, 그와 함께 대만 근·현대사의 슬픈 상처도 국제적 조명을 받았다.
영화는 2·28사건을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는다. 다만 한 가족의 이야기를 그릴 뿐이다. 그러나 영어로는 ‘A City of Sadness’로 번역되는 이 영화의 제목처럼 영화 전편에 흐르는 비감한 정조를 자아내는 것, 슬픈 가족사를 낳는 것은 다름 아닌 대만의 ‘슬픈’ 근·현대사다. 주인공인 임씨 일가의 네 형제 중 막내아들이 2·28사건에 연루돼 투옥되는데 그가 청각장애인이며 사진사라는 것은 매우 상징적이다. 들을 수 없으므로 침묵 속에서 상처를 묵묵히 견뎌내지만 또한 그 역사를 사진에 담는 기록자의 구실을 하는 것이다. 감독은 그를 통해 역사의 질곡에 짓눌리면서도 응시하는 대만 민중의 초상을 겹쳐놓은 듯하다.
감독인 허우샤오셴은 대만 영화의 뉴웨이브를 대표하는 인물이다. 대만의 뉴웨이브는 80년대 초, 대만이 정치·경제적으로 안정되면서 대만인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인하고자 하는 영화의 ‘독립선언’과도 같았다. 그 독립선언의 영화적 다짐이 이를테면 ‘비정성시’인 셈이다.
이번 선거 결과는 그러나 독립 열정이 현실론 앞에서 주춤거리는 모습을 보여줬다.
“나는 대만의 정식 국명인 중화민국의 총통이고 중화민국이라는 국가의 영토 범위는 대만”이라며 독립 감정을 자극하는 천 총통의 구호는 대만인들 사이에서 적잖은 지지도 받았지만 거꾸로 ‘역풍’도 초래했다. 특히 중산층들에겐 독립에 대한 바람과 함께 중국이라는 강국의 ‘우산’ 속에 들어가려 하는 이중적인 감정이 공존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아테네올림픽 때 대만인들은 두 번 울었다. 올림픽에서 사상 처음으로 금메달을 딴 것에 감격해 한 번 울었다면, 곧이어 자기 나라 국기도 없이 국가도 연주하지 못하는 비감한 처지에서 또 한 번 울음을 삼켜야 했다. 금메달을 두 개 딴 태권도 경기장에서는 대만 국기인 ‘청천백일만지홍(靑天白日滿地紅)’기 대신 올림픽위원회 깃발이 올라갔고, 국가를 대신해서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국기가’가 연주됐다. 그 시상대에 어떤 깃발이 내걸릴 때 대만인들의 눈물이 마를까.














![[영상] “달러 수급 불균형 더 심화… <br>대비 안 하면 자신만 손해”](https://dimg.donga.com/a/570/380/95/1/ugc/CDB/WEEKLY/Article/69/52/0d/26/69520d26165ea0a0a0a.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