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월 비슷한 시기 국내 어느 공연장. 오후 7시30분으로 예정된 연주 시작 시간이 5분을 지났건만 뒤늦게 입장하는 청중으로 객석은 어수선했다. 드디어 첫 곡이 시작됐다. 옆자리의 어느 부인은, 만 7세가 안 돼 보이는 어린 딸이 칭얼대며 좌석 위에 드러눕는데도 제지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첫 곡이 끝났을 때 필자의 판단으로는 도저히 박수를 보낼 만한 연주가 아니었음에도 객석 어디선가 벌써부터 ‘브라보’가 터져나왔다. 연주자의 제자나 친구 ‘소행’이 분명했다. 오히려 연주자가 머쓱해했다. 그리고 늦게 온 청중이 다시 입장하느라 소란스러워졌다.
연주회가 끝나고 로비에서는 리셉션이 열렸다. 공짜표로 공연을 본 사람들은 때늦은 저녁까지 대접받고 있었다. 이때 공연장을 채운 청중의 면면을 유심히 살펴볼 수 있었다. 같은 악기를 하는 동료 음악인, 친구, 제자, 고등학교와 대학동창, 그리고 친인척이 대부분이었다. 모두 다 연주자에게 개인적으로 인사를 하고 눈도장을 찍었다. 마치 결혼식 품앗이 같아서 이렇게 받고 나면 다른 동료 음악인이 연주회를 할 때 만사 제쳐놓고 찾아가야 한다. 공연을 대행한 기획사측에 티켓이 얼마나 팔렸는지 물어보았다. “거의 초대권이죠. 누가 자기 돈 내고 연주회에 오겠어요?” 오히려 이상한 질문을 한다는 듯 쳐다보았다.
연주자와 청중의 진지한 예술적 교감으로서의 연주회가 아니라, 초대권을 뿌리며 아는 사람들에게 연주를 들어달라고 구걸하는 우리 공연문화의 한 장면이다. 연주자가 이날 공연에 들인 돈은 비싼 대관료를 포함해서 대략 700만원 선. 이른바 공연 보여주고 돈 내는 ‘자선음악회’가 매일같이 반복되고 있다.
사실 클래식 공연계의 위기감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이다. 빈과 상트 페테르부르크 같은 특별한 도시를 제외하고는 청중 감소와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그러나 음악 선진국들은 앞서 빈과 뉴욕의 예에서 보듯이 ‘기획공연’으로 위기를 헤쳐가고 있다.
그런데 경영난에 허덕이는 우리 공연기획사들은 여전히 ‘기획’이 아닌 ‘대행’에만 매달린다. 또 음악인들은 청중의 취향에 아랑곳없이 자신이 좋아하는 작품을 아무런 컨셉트(concept)도 없이 나열해 놓고 일방적인 ‘들려주기식’ 연주회를 행하니 청중 입장에서는 돈 내고 연주회에 가고 싶지 않을 수밖에 없다.
물론 모든 공연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 드물기는 하지만 우리 공연계에서도 참신한 기획으로 청중을 끌어들이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월17일 피아니스트 엠마누엘 액스를 필두로 시작된 ‘4人4色, 그 독특한 피아니즘으로의 초대’ 시리즈는 2월22일 장-이브 티보데, 3월17일 피터 야블론스키까지 3회 연주회 동안 빈자리를 찾을 수 없을 만큼 반응이 좋았다. LG아트센터가 공연기획사 크레디아와 공동으로 기획한 이 시리즈 음악회는 이미 2년 전부터 섭외에 들어가는 철저한 준비 과정을 거쳤다. 기획, 홍보, 마케팅의 3박자가 조화를 이룬 셈이다.
“30%씩 할인한 4회 공연 일괄 티켓 100매는 일찌감치 매진됐어요. 3회 공연까지 1100석 가운데 평균 900석 이상이 유료 청중으로 채워졌지요.”(LG아트센터 기획실 장인호)
지난 2월17일 첫 연주회를 가진 피아니스트 엠마누엘 액스는 캐주얼한 연주복에 나비넥타이를 맨 천진난만한 소년 같은 인상으로 슈베르트의 마지막 소나타 D.960을 연주할 때 가장 빛났다. 1악장 코다의 재현되는 주제 부분에서 끝내 눈물을 훔치는 옆자리의 어느 여성 관객은 연주자가 누구인지는 몰라도 슈베르트의 이 소나타를 들으러 왔다고 전했다. 레퍼토리 선정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워주었다. 2월22일 장-이브 티보데는 드뷔시, 라벨, 메시앙 등 프랑스 작곡가의 레퍼토리로 자신의 장기를 최대한 발휘했다. 3월17일 내한한 피터 야블론스키는 젊음이 넘치는 자신의 영역을 최대한 드러낼 수 있는 기교적인 면을 과시했다. 무려 1시간이 넘게 이어진 팬 사인회만 보더라도 이 스웨덴 청년의 인기를 짐작할 수 있었다. 클래식 연주자도 얼마든지 스타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인 셈이다.
청중이 외국의 유명 연주자에게만 몰린다고 불평할 일도 아니다. 3월18일 오후 3시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린 ‘피아니스트 김대진 콜렉션-명곡의 순례’ 독주회. 김대진씨(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는 우리 귀에 익숙한 소품들로 프로그램을 마련해 청중을 감동으로 이끌었다. 소품은 청중에게는 쉽고 연주자에게는 어려운 것이다. 하지만 김대진씨는 앙코르까지 무려 21곡의 소품에 그만의 높은 음악성을 부여해서 예술적인 감흥을 불러일으켰다. 결코 천박하지 않은 차분한 박수가 오래도록 이어지고 연주자는 내내 겸손해했다. 김대진씨는 이날 연주 후 로비에서 2시간 넘게 팬들의 사인 공세에 시달려야 했다.
공연기획사인 미추홀에 의하면 이날 객석을 점유한 1400명 대부분이 유료 청중이었다고 한다. 김대진 피아노 독주회는 훌륭한 연주자와 빈틈 없는 기획이 조화를 이룰 때, 우리 공연장도 제자리를 찾을 수 있음을 확인케 한 자리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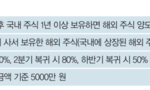











![[영상] 멸종위기 야생 독수리에게 밥을… <br>파주 ‘독수리 식당’](https://dimg.donga.com/a/380/253/95/1/ugc/CDB/WEEKLY/Article/69/5c/75/cc/695c75cc0d36a0a0a0a.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