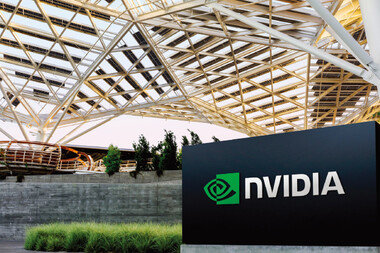개발자들의 최대 커뮤니티라는 ‘데브피아’의 게시판도 거의 매일 IT 종사자들의 근로 조건에 대한 불만들이 토로되고 있다. 그러나 이것 또한 이미 수년째 반복되고 있는 지겨운 주제 중 하나일 뿐이다. IT 개발자들은 ‘이 짓을 계속 해야 하나, 아니면 공무원을 해야 하나’ 하고 절망하고, 실제로 열에 아홉은 공무원 시험을 추천한다. 대체 어느 정도이기에 이런 말들이 오가는 것일까.
지난해 10월 한국정보통신산업노동조합(이하 IT노조, http://it.nodong.net)이 조사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조사 대상인 1081명의 IT산업 노동자 중 43.4%가 주당 60시간 이상을 근무하고 7.8%는 80시간 이상을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57.8시간). 연·월차를 사용하는 노동자의 비율은 2~30%이고, 시간외근무수당을 받는 노동자는 8%에 그쳤다. 그렇다면 연봉은 어느 정도일까? 3년 7개월 정도 경력인 경우 평균 2200만원 수준이고, 대기업 근무자는 2800만원 정도가 주류를 이뤘다. 그렇다면 전망은 어떨까. 응답자의 45%가 고용불안을 느끼고 있고, 79%가 향후 전망이 불투명하다고 했다. 한마디로 실망스러운 근무 조건인 셈이다.
수년째 불만 목소리 쏟아져
상황이 이렇다면 당사자인 IT 종사자들은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가장 먼저 해외진출이란 꿈을 품는다. 한국에서는 마흔 살 넘어서 연구나 개발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외국에 가면 좀더 낫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2002년 영국 노동연금국(DWP) 조사 결과 전체 노동자 중 35세 이하 노동자의 비중은 38% 수준인 반면, IT 업계에서는 이 비중이 56%에 이르렀다. 지난달 IBM은 스웨덴에서 500명의 일자리를 없앴고, 그 전년도에도 400명을 해고했는데 대부분 소프트웨어 분야였다.
때로는 전산을 전공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두 부류로 나누어 열악해진 환경을 비전공자에게 돌리기도 한다. 마치 실업률 증가의 원인이 이주노동자에게 있다고 하는 선진국 노동자들처럼 말이다. 이따금 라그나로크 개발자 김학규 씨, NC소프트의 김택진 씨, 안철수연구소의 안철수 씨 등 몇몇 ‘전설적인’ 엔지니어 출신들의 성공을 보면서 미래를 설계하기도 한다. 하지만 자신의 주변에서 그런 사람을 찾아보기란 힘들다.
한때 IT 업계 종사자들은 자신들이 일반적인 노동자와 다르다고 생각했다. 자신들을 ‘노동의 종말’을 앞당기는 창조적이고 전문적인 지식 엘리트로 상정한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흘러갔다. CTI(Computer-Telephony Integration·컴퓨터 전화 통합) 솔루션은 전화교환원의 업무를 대신했고, BPM(Business Process Management·작업 경과 관리) 등의 솔루션은 일선 은행원의 업무를 단순화했다. 소프트웨어 개발 역시 개발툴들은 점점 더 편리해졌고 표준은 꾸준히 확립돼갔으며, 이제는 ‘조립’이라 말할 수 있는 단계가 됐다. OOP(Object Oriented Programming·객체 지향 개발), CBD(Component Based Development·컴퍼넌트 기반 개발), COM(Component Object Model·컴퍼넌트 객체 모델) 등 관련 개념들 모두 그 추세를 가속화했다. 이제 IT 개발자의 업무도 계약직 은행원이나 콜센터 직원의 그것과 다를 바 없어지게 된 것이다.

IT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개선은 꼭 필요한 시대적 과제가 됐다. 2004년 10월, IT 노동자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IT 산업노조 관계자들.
2004년 1월28일, 설립자가 프리랜서라는 이유로 설립이 반려되는 우여곡절 끝에 생겨난 한국정보통신산업노동조합이 그것이다. IT노조는 조합원 9명에 온라인 회원 1000명으로 시작했고, 현재는 조합원 50여명에 회원 2000여명 규모가 되었으며 진주에 지부를 두고 있다. 벤처 붐 시절부터 지속돼온 열악한 노동 조건들을 감안하면 오히려 때늦은 감이 있긴 하지만, IT 업계의 노조 결성 노력이 사실 처음은 아니다.
2000년 멀티데이터시스템즈는 벤처 업계 최초로 노조를 결성했고, 이를 통해 현대판 노비제도로 활용되는 병역특례제도가 고발되기도 했다. 또 나모의 우리사주조합과 한컴의 노조는 경영권 분쟁의 중심에서 캐스팅보트 구실을 했다. 하지만 실태조사에서 드러난 것처럼 달라진 것은 거의 없다. 사업장 노조로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IT노조는 여기에서 출발하는 셈이다.
소프트웨어 고질적 하도급 구조
“사업장을 바탕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산업 전체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문제의 원인이 소프트웨어 산업의 고질적인 하도급 구조에 있는 만큼 이의 해결이 전제되어야 IT 업계의 노동 조건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IT노조 총회 준비위원장 김동우)
그래서 현재 지난해의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하여 하도급 문제를 전면에 내세워 구체적인 사례 조사와 대응, 노동법 교육 등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사업장을 기반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교섭력에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중소 기업가들과 일정하게 목표를 공유할 수밖에 없다는 비판도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하고 왜 현장에서 노조를 결성하지 않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김동우 위원장은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업계 특성상 파견 업무가 많고, 또 소규모 사업장들이 많아서 조직이 힘들다”고 답한다. 결국 가장 기본적인 조건들조차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 IT 산업 노조의 방향이 현실적이라는 얘기다.
정부 여당은 현재 파견 근로의 전면 확대를 목적으로 입법 추진 중이다. ‘파견법’ 제정 당시부터 적용 대상이었던 IT 업계 노동자들은 기본적인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조직조차 꾀하기 힘들게 된 상태다. 힘든 시기, 설립 당시 동호회 성격의 온라인 노조가 아니냐는 비아냥거림을 뒤로하고 꾸준히 노력하고 있는 IT노조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를 희망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