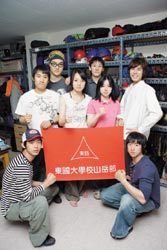
박영석을 낳은 ‘동국산악부’의 젊은 회원들. 세계의 고봉을 누빈 장비들이 가득하다.
“수업 있어도 가겠습니다!”
5월4일 저녁 7시 서울 동국대 학생회관 지하 1층, 세계 최초의 산악 그랜드슬램 정복자 박영석 대장을 낳은 ‘동국산악부’ 사무실에서 6회 정기 ‘집회’가 열렸다. ‘동굴탐사대’ ‘수중탐사대’ 등 지하 1층의 ‘흉악한’ 동아리들을 다 지나쳐 맨 끝방에 자리한 심상치 않은 폼새가 ‘동국산악부’의 역사와 자긍심을 보여주는 듯하다.
01학번 안호찬 대장이 박영석 선배의 쾌거를 알리자, 05학번 김송이 씨가 “인터넷에 축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제가 후배인 것이 자랑스럽습니다!”고 말했다.
집회 시작 전에 모두 다 일어서 힘차게 ‘부가’를 제창하고, 선배 ‘대장’의 사소한 말 한마디까지 받아 적으며 “형이 신입생일 땐 이렇게 방이 너저분하면 집회 안 하고 청소했다”는 4학년 선배의 꾸지람에 모두 벌떡 일어나 달려드는 것도 역시 ‘군기 세다’는 동국산악부답다. 부실은 사실 흠잡기 어려울 만큼 깨끗했다.
1962년 박철암이 중심이 된 경희대 산악회가 최초로 히말라야의 ‘무명봉’에 오르고, 80년 동국산악부가 대학 산악부로는 최초로 8000m 이상 인 마나슬루(8163m)를 정복하면서 대학 산악부는 우리나라 알피니즘의 꽃을 피웠다. 70년대에 활발했던 중동, 양정, 용산, 광운공고 등 고교 산악부의 활약이 대학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지금 대학 산악부는 명맥을 잇기도 쉽지 않다. 낭만적인 이름과는 달리, ‘3D동아리’임을 알 만한 사람은 다 알기 때문이다. 이런 현실은 ‘명문’ 동국산악부도 마찬가지다. 58년 25명이 창립해 한때는 40명 넘게 신입생 입회를 받기도 했지만 지금 재학 중인 동국산악부 회원은 00학번 1명, 03학번 1명, 05학번이 5명이고 휴학생을 합쳐도 10명 정도다. 올해 5명이 들어온 것은 ‘이변’이라고 한다.
“박영석 선배의 스타성도 영향을 미친 것 같고, 다시 산악 등반에 관심이 생긴 듯도 하고요. 신입생 들어오고 세 번 등반을 다녀왔어요. 절반쯤 나갈 때(?)가 됐는데, 아직 남아 있네요.”
역사와 자긍심 … 이젠 ‘3D동아리’ 올 5명 가입 ‘이변’

동국산악부의 역사가 담긴 사진들. 86년 에베레스트 동계 원정, 63학번 대선배인 이인정 현 대한산악연맹 회장.(왼쪽부터)
동국산악부는 창립하자마자 설악산 천불동을 겨울철에 ‘초등’(1959)했고, 우리나라에선 최초로 일본 원정에 나서 북알프스를 정복(1964)했다. 71년엔 동계 지리산 등정에 나서 세석과 불일폭포에 ‘동악능선’을 명명하기도 했다.
77년 고상돈이 세계에서 여덟 번째로 에베레스트에 오를 때 훈련대장을 맡은 사람이 동국산악부 지도교수였던 고 김장호 시인으로, 그가 발대식에서 낭독한 출정가가 바로 고상돈 대원이 에베레스트 정상에서 무선교신한 ‘세계의 지붕끝’이었다.
‘여기는 정상/ 더 오를 곳이 없다/ 모두가 발 아래 있다!’
80년 동국산악부는 다시 한번 한국 등정사의 쾌거를 이뤄낸다. 현 대한산악연맹 이인정 회장을 대장으로 하여 히말라야 마나슬루에 오른 것이다. 마나슬루는 70년대 초 전설의 산악인 김정섭 씨의 두 아우를 차례로 앗아간-사상자 13명-비극의 봉. ‘한의 산’이란 이름이 붙여진 봉우리였다. 한을 푼 동국산악부는 귀국 환영 카퍼레이드를 벌였는데, 박영석 씨가 이를 보고 동국대 입학을 결심했다는 얘기가 산악인들 사이에선 유명하다.
93년 박 씨가 히말라야 14고봉 중 첫 번째로 정복한 에베레스트(8848m) 원정도 동국대가 대학 단일팀으로 세계 최고봉을 등정한 것이다. 당시 함께 등정한 후배 김태곤 씨는 ‘후배들이 산소를 마시면서도 매우 느릿느릿 걷는데, 영석이 형이 무산소로 오르는 모습은 가히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 형 가까이 가면 형의 숨소리는 100m를 뛴 사람처럼 거세게 들려왔다’고 한다. 박 씨는 최고봉 무산소 등정이란 기록을 얻었지만, 안타깝게도 두 명의 대원이 추락사하고 만다.
“다른 동아리보다 빡센 분위기, 그게 묘미”
이 등정 이후 동국산악부 부원들은 박영석의 8000m 14좌 등정을 함께 운행했고, 그랜드슬램 달성을 간접적으로 지원했다. 이처럼 동국산악부가 세계 최초 고봉 등정과 신루트 개척 등에서 눈부신 기록을 세울 수 있었던 것에 대해 동국산악 부원들은 한결같이 ‘군기가 세기 때문’ 혹은 ‘빠따를 많이 맞아서’라는 분석(?)을 내놓는다.

58년 도봉산 등반 장면과 59년 동계 설악산 등반.(왼쪽부터)
“죽도록 맞아가며 훈련했기 때문이죠. 늘 죽음을 앞에 두고 있으니, 대장의 판단에 따라 일사분란하게 위기를 넘겨야 합니다. 또 이인정, 박영석 같은 특출한 선배들이 동국산악부를 키웠어요. 학생들은 돈이 없으니까 등정 계획서를 들고 선배들을 찾아다니면 밥도 사주고 비용도 마련해주죠. 그런 단체생활이 잘 맞고 즐거웠어요.”
76학번 동국산악부 부원으로 박영석 씨와 함께 ㈜골드윈코리아의 산악지원팀에 근무하는 김형우 씨의 말이다. 그 역시 히말라야에만 30여 차례 오른 동국산악부의 ‘악우(岳友)’다. 그는 “더 이상 스파르타식의 산악부 훈련은 맞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어린 후배 산악부원들의 마음도 OB들의 그것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았다.
4월 말 산행에서 팔뚝에 호떡만한 크기의 멍 자국을 얻은 05학번 사회과학부 박소영 씨는 “다른 동아리보다 빡센 건 사실인데, 그 힘든 와중에서 서로 공유하는 게 있다. 그게 산악부의 묘미”라고 말한다. 05학번 문예창작과 이농욱 씨는 “다른 모임들도 신뢰가 있겠지만 산악부는 특히 자일로 맺어지는 신뢰가 있다”고 했다.
동국대 산악부 외에 외국어대, 고려대, 연세대 등의 산악부 출신 산악인들의 활동도 두드러진다. 외국어대 출신 산악인으로 대한산악연맹 김병준 전무와 ‘아이거 북벽’의 저자 정광식 씨 등이 많이 알려져 있고, 연세대 산악부원들은 월간 ‘산’지 편집장인 김승진 씨와 차장 안중국 씨를 비롯해 산악 저널리즘에서 뚜렷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사람과 산’의 발행인이었던 박인식 씨는 MBC 드라마 ‘산’의 작가이기도 하다. 산악부는 아니지만 ‘마운틴 오딧세이’ 등 산악 문학에 기여한 심산 씨도 연세대 출신이다.
그러나 다른 사회 분야와 달리 산악인, 혹은 스스로 ‘산쟁이’라 부르는 이들은 학연·지연 등의 연줄보다 자신의 내면을 향하는 개인적 성향 때문에 산악인으로서 운명을 선택하게 된다고 말한다. ‘아이거 북벽’의 저자로 서울 무교동에서 등산용품점 ‘시에라’를 운영하는 정광식 씨는 이렇게 말했다.
“산에 오르는 사람을 보면 3대 독자, 4대 독자가 많고, 외아들은 흔해요. 늘 혼자인 사람, 내향적인 사람들이 산에 오르죠. 70~80년대 다른 대학생들이 데모할 때 우리는 배낭 메고 산에 올랐고, 그래서 친구들에게서 돌을 맞기도 했어요. 우리에겐 산이 전부니까요. 옆에서 친구, 동료가 죽는 걸 보고 그걸 또 평생 가슴에 묻고 혼자 살아요.”
그들의 가슴속에 들어 있는 건 산,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자일로 서로 연결한 대원들뿐이다. 그들은 ‘의지와 애정’이라는 유일한 무기로 ‘하나의 다른 세계’, 즉 산에 들어서도록 허락받는다.
동국대 산악부가 집회 마지막에 부르는 회가는 이렇게 끝난다.
‘폭풍우 눈보라는 피켈로 찍고/ 빙벽의 거친 호흡 귀를 기울여/ 정상의 붉은 태양 가슴에 안은/ 의지의 사나이 동악을 끈다/ (중략) 하늘을 향한 마음 구름을 뚫고/ 빙벽에 매어달린 자일의 믿음/ 내일의 약속에 오늘을 잊은/ 우리는 한 핏줄 동악의 가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