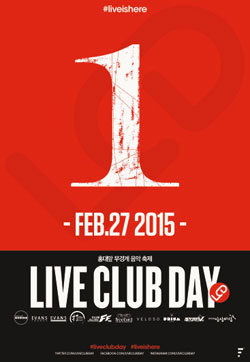
2월 27일 열리는 ‘라이브클럽데이’ 포스터.
일렉트로닉 음악과 댄스를 좋아하던 사람들의 이벤트였던 클럽데이는 2001년 시작됐다. 댄스클럽 10여 개가 연합해 한 달에 한 번 티켓 한 장으로 모든 클럽을 들어갈 수 있는 이벤트였다. 이 클럽이나 저 클럽이나 마찬가지 아니냐고? 그렇지 않다. 모든 음악이 그렇듯, 일렉트로닉 역시 각기 다른 하위 장르가 있다. 홍대 앞 댄스클럽들은 각 공간마다 색깔 있는 장르를 틀어주는 곳이었다. 여기서 놀다가 저기서 놀려면 따로따로 입장료를 내야 했던 댄스 애호가에게 클럽데이는 축제였다.
그러나 댄스클럽의 고유한 색깔은 월드컵 이후 순식간에 사라졌다. 록카페나 나이트클럽 등 기존 유흥문화에 익숙한 이들이 넘쳐나면서 이른바 ‘부비부비’ 문화가 주류가 됐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했지만 라이브클럽과 공존했던 댄스클럽은 그렇게 홍대 앞의 헤게모니를 장악했다. 독립문화 산실이라 불리던 홍대 앞은 어느덧 퇴폐문화의 온상이 돼 언론 지면을 장식했다.
라이브클럽들이 손을 놓고 있었던 건 물론 아니다. 라이브클럽들은 ‘사운드데이’라는 날을 만들어 자생을 모색했다. 역시 한 달에 한 번, 한 장의 티켓으로 10여 개 라이브클럽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열리는 공연들을 볼 수 있었다. 사우스 바이 사우스 웨스트(SXSW), 페트 델 라 뮤지크 같은 도심형 페스티벌이 아직 국내에 소개되지 않았던 시기에 사운드데이는 자체적인 모델을 제시한 것이다.
이런 시도는 긍정적인 결과를 낳았다. 인디신의 역사를 시작했던 1세대 밴드를 뛰어넘는 2세대 스타가 등장하지 않은 상황에서, 베일에 가려 있던 많은 밴드가 더 많은 이에게 노출되는 효과가 있었다. 이런 팀들이 조금씩 입소문을 타면서 자신이 좋아하는 팀만 보러 다니는 관객을 끌어모으기도 했다. 하지만 2011년 클럽데이도, 사운드데이도 중단됐다. 주최 측의 내부 사정과 일부 클럽 사이 갈등이 누적된 결과였다.
2월 27일 홍대 앞 라이브클럽들이 다시 뭉친다. ‘라이브클럽데이’라는 이름으로. 역시 한 달에 한 번,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에 열린다. 고고스2, 레진코믹스V홀(옛 V-Hall), 벨로주, 에반스, 에반스라운지, 타, 프리버드, 프리즘홀, FF, KT·G 상상마당 등 10개 클럽이 참여한다. 2만 원짜리 티켓 하나를 사면 이들 클럽을 모두 드나들며 공연을 즐길 수 있다.
4년 사이 없어진 클럽이 있고, 새로 생겨난 클럽도 있다. 4년이란 시간이 주는 공백을 느끼게 한다. 지금 홍대 앞은 분명히 위기다. 서울 최대 상권이 됐건만 문화는 사막에 고인 빗물처럼 말라간다. 대학로와 신촌이 겪은 문화 사막화를 코앞에 두고 있다. 그렇다고 다른 대체 지역에서 새로운 음악문화가 발현하는 것도 아니다. 대안문화의 최후 보루라는 자리를 확보한 채 고사하고 있는 셈이다.
라이브클럽데이는 이 상황에 새로운 돌파구를 확보할 수 있을까. 다시 한 번 음악팬을 결집시키는 ‘불금’의 홍대 앞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래서 제2 장기하와 얼굴들, 갤럭시 익스프레스, 국카스텐을 탄생시킬 수 있을까. 응원의 마음을 담아 라이브클럽데이 부활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이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