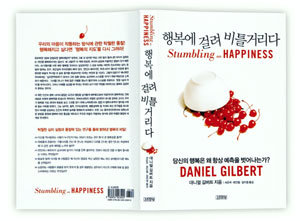
이때 ‘요청’이라는 개념은 ‘원초성’을 해결하는 데 만능의 해결사다. 다윈의 진화론이 박테리아에서 인간의 자리까지를 설명할 수 있더라도 ‘태초의 생명’ 혹은 ‘생명의 발원’까지 설명할 수는 없다. 결국 ‘다위니즘’에서 ‘생명의 발원’은 그 사실이 있었음을 전제하는 ‘요청’이 필요한 것이다.
우주의 질서에 대한 이해도 마찬가지다. 우주에 대한 자각이 코페르니쿠스에 의해 전환되고, 질서와 역학을 유클리드 기하학의 범주에서 이해한 것은 대단한 혁명이었지만, 그 혁명 역시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의 원리’로 인해 전복되고 만다. 여기서도 결국 ‘상대성 원리’가 ‘요청’되어야 하는 셈이다.
같은 맥락에서 ‘행복’이란 무엇일까. 행복의 정의는 무엇이며, 본질은 어떤 것일까. 모든 걸 갖춘 것을 행복이라 한다면,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한 남자는 왜 모두 행복하지 않을까. 한강변에 50층짜리 아파트를 사기 위해 일생을 분투한 사람의 행복은 왜 입주 후 환경호르몬의 영향이 채 가시기도 전에 사라지는 것일까. 우리가 행복이라 부르는 모든 것은 왜 영속적이지 않고, 마치 한여름 밤의 꿈처럼 소멸해버리는 것일까. 행복이라는 한 단어에만 해도 이런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된다.
이 부분을 두고 선지식(善知識)은 주장자를 내리치며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이라’ 호령하고, 장주(莊周)는 ‘호접몽’을 앞세워 ‘부질없음’을 설파했다. 하지만 도에 미치지 못한(不及) 우리네 범인들은 늘 삶이 ‘불행하다’고 여긴다. 그것이 단지 수양이 부족하거나 행복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기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인류 역사에서 수많은 선각자가 ‘행복’의 본질을 설(說)하고 방법을 강(講)해왔지만,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 결정적인 고리 하나가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 빠진 고리란 바로 ‘행복’하고자 하는 목표, 즉 우리가 가상한 행복의 세계가 ‘피안(彼岸)’처럼 손에 잡히지 않는 미래형이라는 사실을 잊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지금 당신이 건강을 잃어가며 치열하게 분투하는 오늘은 분명히 무엇인가 목표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막상 그 목표를 이뤘을 때 당신은 과거의 당신이 세운 목표를 오늘 손에 쥐고 있을 뿐, 오늘의 당신이 미래에 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만큼 인간의 이성이 원하는 행복의 개념 역시 단지 ‘요청’되는 무엇일 뿐이다.
그렇다면 감각의 세계는 어떨까. 당신은 왜 끊어질 듯 흔들리는 구름다리를 지나 맞닥뜨린 이성보다 구름다리 위에서 만난 이성에게 더 호감을 느끼고, 나를 짝사랑하는 이가 누군지를 아는 것보다 모르는 상태에서 더 큰 행복감을 느끼는 것일까. 또 연인이나 배우자가 싱크대에 설거지거리를 쌓아두는 것보다 외도한 사실을 더 빨리 용서하게 되는 까닭은 무엇일까. 감각의 세계는 이성의 세계보다 더욱 기묘한 알레고리를 구축하지만 우리는 이를 그야말로 감각적으로 해석해버린다.

<b>박경철</b> 의사
덧붙여 한 가지 더. 이 책은 알 수 없는 이유로 어느 날 갑자기 전격 폐지된 KBS 의 ‘TV 책을 말하다’에서 ‘올해의 도서’를 선정할 때, 심사위원 만장일치로 추천받았던 책이기도 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