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라카미 하루키 지음/ 임홍빈 옮김/ 문학사상 펴냄/ 277쪽/ 1만2000원
이 책은 제목에서 말한 대로 하루키라는 사람이 달리기를 말할 때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적었다. ‘달린다는 간단한 행위에 대해 말할 것이 얼마나 있을까’ 하고 의아해할 수도 있지만 작가의 달리기에 대한 애정은 남다르다. 언뜻 취미를 향한 애정이 담긴 담론일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읽은 뒤에 드는 생각은 아마 다를 것이다.
따라서 이 책은 무라카미 하루키가 어떤 뉘앙스를 가진 작가인지에 대한 사전 이해가 없거나, (물론 그런 경우는 드물겠지만) 그의 책 중 처음으로 접하는 것이 이 에세이라면 ‘뭐 이런 시시껄렁한 이야기를 늘어놓는 거야’라고 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우리가 좋아하는 예술가들에게 감명을 주었던 여행지를 순례해보는 것처럼, 그가 달리기를 통해 말하고 싶어하는 인간 하루키를 알아가는 재미도 쏠쏠하다.
“서머싯 몸은 ‘어떤 면도의 방법에도 철학이 있다’라고 했다. 아무리 하찮은 일이라도 매일매일 계속하고 있으면 거기에 관조와 같은 것이 우러난다는 말이라고 생각된다.”
서문의 말처럼 우리는 때로 작은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에서 오는 소소한 기쁨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사실 하루키 열풍은 우리나라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 오스틴 핏 매거진은 이 에세이를 “읽고 싶은 마음과 달리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는 책”이라 했고, 타임아웃 뉴욕에서는 “달리기를 통해 들려주는 확실한 건강증진과 성공비결”이라 평하기도 했다.
작가는 우리가 살면서 기대는 것이 사람이나 어떤 형상을 가진 것일 경우도 많지만, 자신이 하고 있는 어떤 행위가 될 수도 있다고 피력한다. 그리고 외아들로 자란 자신이 가질 수 있는 단점들을 여러 차례 고백하며, 그래서인지 혼자서 하는 달리기가 잘 맞는다고 했다. 사회는 가끔 내가 이런 사람임에도 상대에게 그것을 말해서는 안 되는 경험을 제공하는데, 이 책을 읽는 동안에는 자유롭게 자신의 이면을 말하는 하루키가 내심 부러워지기도 할 것이다.
이번 에세이집은 달린다는 행위를 축으로 한 작가의 회고록에 가깝다. 그리고 그 속에서 소설가 하루키는 달리는 자, 러너의 삶을 정말이지 부러울 만큼 자신의 삶에 잘 버무려가고 있었다.
“나는 그렇게 해서 달리기 시작했다. 그때 나는 인생의 한 분기점 같은 서른세 살.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떠난 나이다. 그런 나이에 나는 장거리 러너로서의 생활을 시작해, 늦깎이이긴 하지만 소설가로서의 본격적인 출발점에 섰던 것이다.”

하지만 이 중후하게 잘 늙은 작가는 소설가로서의 삶과 자신으로 살아가는 삶의 균형을 달리기로 잡고 있는 듯 보인다.
“나는 소설 쓰기의 많은 것을 매일 아침 길 위를 달리면서 배워왔다. 어느 날 갑자기 나는 내가 좋아서 소설을 쓰기 시작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좋아서 거리를 달리기 시작했다. 주위의 어떤 것으로부터도 영향 받지 않고 그저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아왔다.”
물론 위의 마지막 문장을 액면 그대로 해석하는 것은 바보 같은 행동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소설가로서, 인간으로서 살면서 자유로워지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고 자신에게 충실했기 때문에 많은 독자들에게 공감을 주지 않았을까.
이렇게 우리가 사랑하는 작가 하루키의 달리기에 대해 다 읽고 그가 달렸던 길, 그 길 위에서 들었던 음악과 생각을 따라가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폐활량이 늘어난 것 같은 기분을 느낄 수 있으리라 믿는다.
그리고 하루키가 농담처럼 마지막에 한 말에 기분 좋은 공감도 할 수 있을 것이다. 하루키는 만약 자신에게도 묘비명 같은 것이 있다면, 그 문구를 자신이 선택할 수 있다면 이렇게 써넣고 싶다고 한다.
“무라카미 하루키, 작가 (그리고 러너) 1949~20** 적어도 끝까지 걷지는 않았다”라고. 자, 이 어렵고 고단한 때 당신은 묘비명에 무엇을 새겨 넣고 싶은가. 새봄과 함께 잔잔히 고민해볼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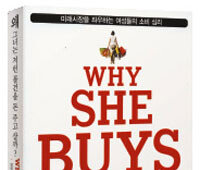












![[영상] 폴로 티 3000원… <br>고물가 시대 생활용품 경매로 싸게](https://dimg.donga.com/a/570/380/95/1/ugc/CDB/WEEKLY/Article/69/ae/a9/14/69aea9141beaa0a0a0a.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