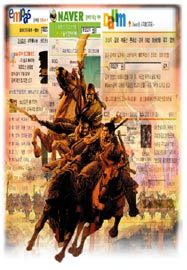
1996년 세워진 지식발전소는 검색엔진 포털 부문에서 2000∼2003년 4년 연속 고객만족도 1위를 차지한 ‘엠파스’가 주요 수익원인 회사로, NHN, 다음에 이어 야후와 함께 3~4위권으로 평가받고 있다. 지식발전소는 이번 주식공모를 통해 확보한 자금을 NHN, 다음에 비해 다소 뒤떨어져 있는 엔터테인먼트 분야와 커뮤니티 서비스 확대에 투자할 계획이다.
엠파스는 장외시장에서도 ‘스타주’였다. 장외시장에서 4만원(액면가 500원 기준, 5000원 기준으로는 40만원)까지 치솟기도 했던 지식발전소의 주가는 10월31일 현재 3만2000원. 같은 액면가 500원인 동종업체 NHN과 다음이 코스닥시장에서 각각 15만1500원, 5만5300원을 기록하고 있어 지식발전소도 경영 성과에 따라 추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지식발전소 박석봉 대표는 “게임과 블로그, 메신저, 쇼핑 서비스 등으로 사업영역을 넓혀갈 계획”이라며 “코스닥 입성을 계기로 NHN, 다음과 더불어 인터넷업체 3강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렇다면 지식발전소가 인터넷 대장주 다툼을 벌였던 NHN, 다음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코스닥시장 대형주 출현에 ‘술렁’
지식발전소와 NHN, 다음이 건곤일척의 승부를 벌일 ‘인터넷 삼국지’는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흥미로운 일이다. 현재로서는 지식발전소가 크게 역부족인 것처럼 보이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NHN이 훨씬 앞서가던 다음을 따라잡은 선례가 있기 때문이다. 투자자의 시선도 지식발전소가 제2의 NHN, 다음이 될 것인지, 아니면 한참 뒤떨어진 3위권 업체로 남아 있을 것인지에 쏠리고 있다.
업계에는 지식발전소와 야후가 벌였던 ‘광고 대전’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다. 광고 대전은 엠파스를 통해 자연어 검색을 최초로 들고 나온 지식발전소가 광고를 통해 야후와 정면승부를 벌인 것을 이르는 말. ‘야후엔 없다’는 지식발전소의 비교광고는 네티즌들에게 크게 어필했고, 엠파스는 이를 계기로 단숨에 인지도를 높였다. KT의 ‘한미르’가 기존 업체들의 벽을 뚫지 못하고 지리멸렬한 것과 크게 대비되는 대목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야후와 ‘맞장 떴을’ 때의 기개라면 NHN과 다음도 충분히 위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넷이 한국에 상륙한 후 가장 먼저 ‘뜬’ 한국 포털업체는 ‘다음’이다. 이재웅 대표가 1995 세운 다음도 초기엔 이만저만 고생한 게 아니었다. 그룹웨어 인터넷솔루션 등 뛰어든 사업마다 기술력은 인정받았지만 수익성은 당최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던 것. 노심초사하던 이사장을 인터넷 업계의 기린아로 만들어준 것은 ‘한메일’이었다. 무료 이메일의 성공 여부가 미국에서조차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띄운 승부수가 홈런을 친 것. 이후 다음은 한메일을 기반으로 별 어려움 없이 승승장구해왔다. 이사장에게 ‘인터넷시대가 만든 행운아’라는 평가가 뒤따르는 것은 이 때문이다. NHN은 다음이 이렇다 할 경쟁자 없이 독주하고 있을 때 태어났다. 하지만 NHN이 다음을 따라잡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NHN의 두 축인 네이버와 한게임은 원래 서로 다른 회사. 네이버는 삼성SDS의 사내벤처 1호로 출발해 99년 6월 분사하면서 만들어진 회사이고 한게임은 98년 11월 게임포털로 설립된 업체로 두 회사는 2000년 7월 합병했다. 네이버와 한게임의 고속성장은 두 회사의 합병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지도 모른다.
합병 초기 NHN을 먹여살린 건 한게임이었다. 마우스를 클릭하는 것만으로 누구나 손쉽게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된 한게임의 인기는 대단했다. 중년의 ‘아줌마’ ‘아저씨’들은 한게임의 ‘고스톱 게임’을 즐기며 인터넷을 배웠다. 인터넷포털과 게임포털이 공존하는 닷컴 비즈니스모델은 현재 포털업계의 레퍼런스로 여겨진다.
그렇다면 지식발전소, NHN, 다음의 삼국지는 어떻게 전개될까. 세 업체는 점령한 고지를 지키고 상대방의 요새를 빼앗기 위해 ‘첨단무기’를 장착하기 시작했다. 도처에서 국지전이 일어나고 있어 어떤 업체가 ‘최후의 승자’가 될지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각 업체 기자들 스카우트, 본격 채비
우선 NHN의 아성인 게임시장에 다음과 지식발전소가 도전장을 내밀었다. 회원 수 1700만명을 확보한 한게임의 성공을 ‘강 건너 불구경’할 수는 없는 노릇. 사내벤처를 설립한 다음은 ‘다음 게임’을 통해 독자적인 게임을 선보였으며, 지식발전소도 100억원을 투입해 다음과 협공에 나설 태세다.
다음의 철옹성인 커뮤니티서비스(다음카페)도 전장으로 변하고 있다. NHN은 3명의 팀장급 커뮤니티 전문가를 스카우트해 커뮤니티팀을 꾸렸다. 싸이월드의 커뮤니티 기획자를 영입하면서는 억대에 가까운 연봉을 제시했다고 한다. 포털업계에선 아직까지 억대 연봉자는 그리 흔치 않다.
지식발전소 역시 커뮤니티 시장을 포기할 수는 없는 노릇. 자연어 검색으로 검색시장에 회오리를 몰고 왔던 지식발전소가 어떤 신무기를 들고 나올지 주목된다. NHN의 야심작인 ‘지식in’을 ‘지식거래소’로 맹추격하고 있는 것에서 미뤄볼 수 있듯 지식발전소의 ‘물타기’ ‘따라잡기’가 매섭기 때문이다.
아직 어느 업체도 선점하지 못한 모바일게임 시장과 뉴스서비스 시장은 앞으로 최대 격전지가 될 듯하다. 특히 ‘뉴스’는 인터넷포털의 성격 자체를 바꿀 수 있는 폭발력 있는 아이템이다. 단순히 신문 형식을 옮기는 게 좋을지 1인 미디어로 각광받는 블로그 형태가 좋을지조차 가늠하기 어려운 뉴스 시장은 아직 안개 속이다.
다만 방송과 통신이 융합한, 아직은 어떤 형태일지 예측할 수 없는 새로운 미디어를 가장 먼저 띄우는 곳이 승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올 뿐이다. 각 업체들은 중앙언론사 기자들을 스카우트하며 뉴스 시장의 공략지점을 정하고 전략을 짜느라 분주한 모습이다.
‘인터넷 삼국지’의 최후 승자는 누가 될까. NHN? 다음? 지식발전소? 승자는 현재로선 구체화하기 어려운 전혀 다른 형태의 인터넷미디어 시대를 가장 먼저 준비한 쪽이 될 것이다. ‘삼국지’의 세 영웅, 유비 조조 손권은 통일중국의 황제에 오르기 위해 피 튀기는 전쟁을 벌였지만 그 누구도 최후의 승자가 되지 못했다. 그렇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