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대 조남현 교수(국문학)는 ‘문학위기, 그 현상론과 초극론’(21세기 문학 2000년 봄호)이라는 글에서 문학 독자가 격감하고 문학서 전체 판매액이 줄어들고, 좋은 작품이 잘 안 나오고, 국문학과의 위세가 점점 약해지며, 베스트셀러 규모가 작아진 점 등으로 보아 위기는 위기라고 했다. 반면 문인 지망생 숫자가 줄지 않고, 오히려 문예지가 늘고 있으며, 문예창작과 신설이 경쟁 양상을 띠고 있는 점, 문학상도 점점 늘어나는 것으로 보아 그리 비관할 일도 아니라고 했다.
출판계 일각에서는 문학무용론, 문학소멸론까지 나오는 마당에 최근 들어 거꾸로 문예지 창간이 줄을 잇는 것은 아이러니한 일이다. 가장 먼저 열림원(대표 정중모)이 9개월의 창간 준비 끝에 ‘문학·판’을 선보였다. 종합출판그룹을 꿈꾸는 시공사(대표 전재국)는 지난 10월 전 ‘상상’ 편집장 김완준씨를 영입해 문예지 창간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해리 포터’ 시리즈로 대박을 터뜨린 출판사 문학수첩은 김종철 주간 중심으로 내년 ‘문학수첩’ 창간을 위해 편집위원 모시기에 나섰다. 시공사와 문학수첩 모두 내년 여름호 창간이 목표다.
김종철 주간은 “아직 계간지를 내겠다는 뜻만 있지 구체화된 것은 하나도 없다”고 했다. 그러나 이미 편집위원 후보자들과 접촉에 들어갔고 올해 안에 인선을 마치면 내년부터 본격 제작에 들어간다. 계간지 여름호가 5월 초 발간되는 것을 감안하면 남은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
그 밖에 대중소설 논쟁과 함께 베스트셀러가 된 ‘국화꽃 향기’ ‘열 번째 사과나무’를 펴낸 생각의 나무(대표 박광성)측도 “언젠가는…”이라는 말을 전제로 문예지 창간 의사를 밝혔다. 생각의 나무 김환기 기획부장은 “출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문예지를 꿈꾼다. 그러나 계간지 ‘비평’을 내는 데도 한 호마다 2500만~3000만원의 예산이 든다. 출판사로서는 적지 않은 부담이어서 ‘비평’이 좀더 자리잡은 다음 새 잡지 창간을 고려하겠다”고 했다.
팬터지 소설로 출판계에서 급성장한 자음과모음의 강병철 사장은 문학 단행본을 내는 자회사 ‘이룸’을 통해 문예지 창간을 타진중이다. 이룸은 공격적인 광고 마케팅으로 젊은 작가들을 끌어들이는 데 성공해 문예지 쪽으로 눈을 돌렸다. 현재 한국문학 파트를 맡고 있는 최낙영 부장이 준비 작업을 맡고 있다.
이처럼 출판시장이 불황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출판사들이 문예지 창간에 몸달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평론가 장석주씨는 “문학의 활황 시대가 가고 불황의 시대, 불모의 시대에 접어들자 젊은 출판인들이 개척정신으로 돌아가 처음부터 다시 문학을 시작해 보겠다는 의지의 표현 아니겠느냐”고 설명한다.
“창작과비평이나 문학과사회, 세계의문학과 같은 기존 잡지들은 너무 노쇠해 자기 갱신의 시기를 놓쳤다. 그 뒤를 이은 작가세계, 실천문학, 문학동네는 입지가 너무 좁아 제 구실을 다 하지 못했다. 지금 문예지 창간을 선언한 곳이 모두 신흥 출판사들인 점에 주목하라. 이들은 지금까지 문학을 움직여온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 스스로 문예지를 창간하려는 것이다. 물론 잡지의 성격을 규정할 편집위원들이 얼마나 새로운 인물로 채워지느냐가 관건이다.”
장씨의 지적대로 문예지 창간 의욕을 보이는 출판사들은 한결같이 젊다. 또 그들은 전통을 강조하는 기존 문예지들의 운영 방식에 반기를 든다. 문학수첩의 김종철 주간은 자사 출판물의 홍보를 위해 문예지를 이용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른 출판사들이 편집위원 인선도 끝내지 못하고 암중모색을 거듭하는 사이 제일 먼저 창간호를 낸 ‘문학·판’은 이후 문예지들의 방향을 가늠해 볼 잣대이다. 빨간 바탕에 흰색의 큼직한 제호, 그리고 창간 특집 ‘엽기적 상상력’이 제공하는 이미지는 도발적이다. 그러나 단순히 서점 진열대 위에서 튀어보이기 위한 도발은 아니다. 편집위원으로 참가한 박철화씨(평론가)는 창간호 권두비평 ‘열린 문학의 시대’에서 실명을 거론하며 기존 문예지의 한계를 이렇게 지적했다.
“뿌리를 거두어 존재 이전해버린 ‘세계의문학’은 차치하고, ‘창·비’는 변화가 없었고, ‘문·지’는 ‘문·사’로 바뀌었으나 그들이 새로운 언어가 꽃필 토양을 제공하는 데 후했다고는 볼 수 없다. 과연 그들 세대(4·19세대) 가운데 누가 다음 세대 시인·작가들 사이에 관계망을 엮어 강건한 언어의 다발을 만드는 일에 선뜻 나섰는가?…”
박씨는 90년대 이후 생산적 대화를 이끌어내지 못한 기성세대의 문학적 패권주의가 문학의 침체를 가져왔다고 말한다. 그러나 새로운 문학담론을 담아낼 구심점을 마련하지 못하고 흩어져버린 젊은 세대 문학인들에게도 분명 책임은 있다.

‘문학·판’의 출발점은 이인성 교수(연세대 불문학·소설 ‘낯선 시간 속으로’, 산문집 ‘식물성의 저항’ 등)다. 이교수는 1980년 ‘문학과지성’을 통해 등단했고 정과리 교수(연세대 국문학) 등과 함께 ‘문학과사회’(70년대 창간한 문지가 재창간한 것) 편집동인으로 활동해 왔기 때문에, 이번 외도는 뜻밖이다. 이교수는 이런 주위의 시선을 의식한 듯 “기존 잡지와 보족(補足)적 관계로 보아달라”고 주문했다. “전통 있는 잡지들은 하고 싶은 일과 해야 하는 일의 의무감 사이에서 갈등한다. 그들은 문학이 우리 사회의 유일한 말의 통로였던 시절에 만들어졌고 지금도 그 역할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 그런 부담으로부터 자유로운 잡지를 만들고 싶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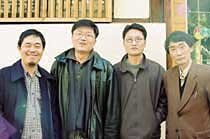
90년대 중반 한국 문학계의 상황은 지금과 꼭 같았다. 93년 가을 도서출판 살림이 신세대 문예지 ‘상상’을 창간하면서 소위 60년대 초반생 문화비평가들이 대거 계간지 편집위원으로 참여했다. 94년에는 윤대녕, 신경숙 등 90년대 대표작가들을 거느린 문학동네가 같은 이름의 계간지를 내면서 기존 문예지의 아성에 도전했다. 비슷한 시기 대중문화비평지 ‘리뷰’가 창간되었고 이후 ‘이다’ ‘오늘예감’ ‘이매진’ ‘문화과학’ 등이 잇따라 등장하면서 한때 종합문화잡지가 순수문예지를 압도하는 시대가 오는 듯했다. 그러나 잔인한 IMF 체제를 거치면서 이 잡지들은 한꺼번에 문닫고 ‘문학동네’와 ‘문화과학’만 살아남았다. 4·19세대 잡지로 비판받는 ‘창작과비평’이나 ‘문학과사회’가 지금도 건재한 것과 뚜렷이 비교된다.
일단 출판계와 작가들은 새로운 문예지들의 등장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이미 포화 상태인 문학판에서 이들이 어떤 차별성으로 승부할지 자못 궁금하다. 실험정신만 돋보였지 자생력 없는 잡지들이 얼마든지 있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