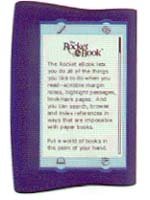
클린턴 미 대통령과 백악관 인턴사원 모니카 르윈스키간의 섹스 스캔들을 담은 ‘모니카 이야기’는 그 내용에 대한 호기심 때문에 출간 즉시 베스트셀러 목록에 올랐다. 세계적인 서점망인 반스앤노블은 같은 이름의 인터넷 서점(www.bn.com)을 통해 ‘모니카 이야기’ 하드커버와 함께 전자책인 ‘로켓판’ (Rocket Edition)을 선보였다. 값은 종이책보다 10달러쯤 더 싼 14달러 97센트로 책정됐다.
화면으로 유명 소설이나 평론을 읽게 해주는 전자책 시장이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다. 로켓이(e)북을 비롯해 소프트북, 에브리북 등이 그 시장을 앞서 이끌고 있다. 하지만 이들 전자책의 값은 아직 몇백 달러를 줘야 할 만큼 부담스러운 수준이다. 게다가 PC에 별도로 부가 장치를 해야 한다.
물론 특정한 하드웨어 없이도 전자책을 읽을 수 있는 방법은 있다. 글래스북의 소프트웨어 ‘글래스북 리더’가 대표적인 사례다. 이 제품은 윈도 운영체제에서 작동될 뿐 아니라 어도비의 PDF 형식을 지원하기 때문에 책의 출판 및 편집 작업에도 활용할 수 있다. 현재 시험판을 공개중인 글래스북 리더는 3월부터 사전 및 텍스트 검색 기능이 포함된 완성판(글래스북 플러스 리더)을 39달러 정도에 팔 계획이다(지금은 이 버전도 공짜로 내려받을 수 있다).
글래스북 리더를 이용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먼저 대략 7MB 분량의 글래스북 리더나 22.2MB 분량의 플러스 리더를 내려받아 설치한 뒤, ‘서점’(Bookstore) 사이트를 방문, 읽고 싶은 책을 신용카드로 구입한다. 물론 종이책이 아니라 그 내용이 그대로 담긴 파일을 내려받는 것이다. 그러면 독서 준비는 끝. 버튼을 눌러 읽기만 하면 된다. 실제 책을 보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이용자 취향에 맞게 글자 크기를 늘리거나 줄일 수도 있다. 읽고 싶은 책은 글래스북의 홈페이지나 반스앤노블(www.bn.com)에서 구입할 수 있다.
물론 몇 가지 전자책 모델이 선을 보였다고 해서 곧장 종이책의 시대가 끝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성급하다. 종이책과는 견줄 수도 없는 흐릿한 화면 해상도, 휴대 및 조작의 불편함 따위는 어찌 보면 지엽적인 문제인지도 모른다. 종이책만이 가진 독특한 감촉, 냄새, 분위기, 충만감 등을 전자책이 어떻게 재현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나 전자책에도 유리한 국면은 있다. 무엇보다 네트워크 환경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 비단 광케이블, DSL, 케이블네트워크 등 유선(有線)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휴대용 전화, 위성통신 등 무선 통신 환경도 하루가 다르게 나아지고 있다. 언제 어디서든, 데이터를 송수신할 수 있는 단말기(노트북이든 PCS든, 또는 손바닥PC든)만 있으면 세계 어느 곳에서나 자유롭게 교신할 수 있다.
둘째, 화면 선명도가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장문의 기사나 논문이 인터넷에 있을 때 이를 모니터 화면으로 읽는 사람은 거의 없고 프린트해서 본다. 왜 그런가. 불편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화면 속의 글자가 종이 위에 인쇄된 글자만큼 선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실 최근 선보인 전자책들은 아직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대학노트보다 조금 더 작은 크기여서 휴대성은 좋지만 화면의 해상도는 아직 종이에 견줄 바가 못된다. 올 여름 나올 에브리북의 ‘데디케이티드 리더’(EBDR)는 소프트북(105dpi)이나 로켓 이북(72dpi)과 달리 24비트 1600만 컬러인 데다 450dpi여서 크게 나아지긴 하겠지만 여전히 종이보다는 못하다.
그러나 그것도 1, 2년 안에 해결될 것이다. 마이크로소프트가 현재 개발중인 ‘클리어타입’ (Cleartype) 기술은 현재의 모니터 화면에서 보는 글씨의 밝기보다 3배 이상 더 선명한 화면을 소프트웨어적으로 구현할 전망이며, 올해 안에 선보일 IBM의 ‘뢴트겐(X-선) 디스플레이’는 실제 종이 위에 인쇄된 글자를 보는 것처럼 선명한 화면을 제공할 것이기 때문이다. ‘뢴트겐 디스플레이’는 13.3인치 크기의 노트북이 제공하는 일반화면(해상도 1024×768, 약 78만 픽셀, 1인치당 픽셀수 약 96개)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선명한 화면(해상도 2560×2048, 약 524만 픽셀, 1인치당 픽셀수 약 200개)을 약속한다. 픽셀(Pixel·화소(畵素))이 많을수록 더 선명한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휴대와 보관의 간편성도 전자책이 지닌 미덕 중 하나다. 예컨대 일주일 정도 예정으로 휴가나 출장을 떠난다고 가정하자. 적어도 책 서너 권을 들고 가게 될 것이다. 그보다 더 많이 들고 갈지도 모른다. 가져가서 다 읽으면 다행인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고스란히 짐일 뿐이다. 반대로 더 이상 읽을 책이 없어서 난감할 수도 있다. 그러면 근처 서점에서 책을 또 살 것이고, 결국 이것도 돌아오는 길에는 짐이다. 책 7, 8권을 계속 들고 다닌다고 상상해 보라.
전자책은 이 모든 문제를 간단히 해결한다. 적어도 책 7, 8권 이상을 전자책 한 권에 담아둘 수 있다. 그 7, 8권의 목록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출장지(또는 휴가지)에서 인터넷에 접속해 다른 책으로 바꿀 수도 있다.
날로 심각해지는 환경 파괴 문제도 전자책 시대를 유도하는 원인이다. 종이책 중에는 길이 ‘인류의 유산’이 될 양서도 있지만 실상은 그보다 못한 경우가 훨씬 더 많다. 어느 쪽이든 엄청난 규모의 남벌(濫伐)을 요구한다는 점에서는 다르지 않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자책은 여전히 ‘전자’ 책일 뿐이다. 종이책이 주는 그 독특한 매력(종이와 잉크 냄새, 마음대로 구부렸다 폈다 할 수 있고, 때로 집어던질 수도 있는 유연성(!) 등)은 결코, 또는 매우 오랫동안 전자책이 모방할 수 없는 미덕이다. 따라서 전자책이 크게 대중화한다고 해도 종이책과는 상호 보완 관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














![[영상] 코스피 5000 예견한 김성효 교수 <br>“D램 가격 꺾이지 않는 이상 코스피 우상향”](https://dimg.donga.com/a/380/253/95/1/ugc/CDB/WEEKLY/Article/69/85/44/6f/6985446f21f9a0a0a0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