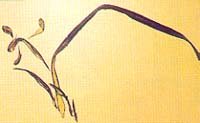
‘부작란’은 김학량과 배준성이라는, 각각 동양화와 서양화를 전공한 작가가 ‘난’이라는 소재로 만난 2인전이다. 전시장에 들어서면 제법 동양화 같은 ‘폼’으로 관객을 맞는 작품들이 눈에 들어온다.
그러나 사대부의 선비가 척척 친 듯한 난의 잎과 줄기를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노라면 그것은 사과껍질의 말라비틀어진 형상임을 알게 된다. 배준성은 최근 2, 3년간 18세기의 난 치는 ‘화법’ 대로 과일의 껍질을 그리는 작업을 해왔다. 그래서 그것은 난이기도 하고 사과껍질이기도 하다.
동양화를 보는 감상자의 시각적 관습이 과일 껍질을 난으로 해석하게 한 것이다. 난에서 사과 껍질로 넘어가는 인식의 전환은 색다른 즐거움을 제공한다.
즉 배준성의 작업은 △실제의 대상 △작가가 그려놓은 이미지 △감상자가 해석한 이미지 사이의 차이에 대한 이야기다. 세 가지 사이에는 어떤 필연성도 존재하지 않는다. 사실 어떤 이가 그림을 보고 느끼는 바는 작가의 뜻과 캔버스 자체를 해석하는 것이라기보다 본인의 입장에 의해 정해진다고 볼 수 있다. 동시에 이런 과정을 통해 감상자는 작가의 위치에 서게 되는 것이다.
김학량의 작업은 ‘우아한’(우아하다고 말하는) 품새에 성질도 까탈스런 난초에 대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고정 관념을 뒤집는 것이다.
작가는 잡초들, 혹은 공사장 철근을 난초 ‘자세’로 촬영한 사진 위에 유성펜으로 시를 써넣고 창호지로 족자를 붙여 전시장에 걸었다. 비단 족자와 비교되는 그 빈약한 족자가 매우 유머러스하다. 그는 “외유내강한 선비를 상징하는 식물로 이미 장구한 세월을 아름다운 수사에 둘러싸여온 난을 풀의 자리로 데려다 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생각해보면 난이 어디 간장종지만한 화분에서 그렇게 살고 싶었겠는가.
또한 그의 말에 따르면 “공사장에 흉물처럼 방치된 철근줄기에서도 허허로운 목숨붙이들의 숭엄한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난’이라는 이미지에서 출발한 두 사람은 난이라는 ‘공인된 이미지’와 ‘공인된 이름’을 비틀어보고 싶었던 것이다. 그럼으로써 이름과 관념에 의해 훼손됐던 사물들은 ‘자유’를 되찾게 된다. 사물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방법은 사물을 똑같이 그리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일체의 언어적-정치적-사회적 관념에서 풀어주는데 있는지도 모른다.
덧붙이자면 김학량은 동아갤러리가 모기업의 부도로 문을 닫을 때까지 전시기획자로 일했었다. 그는 이제 작가로 돌아가 전시장에 있다. 비평가든 작가든 이론과 실제의 작업은 다른 경우가 많고 이를 탓하기도 어렵다. 김학량의 경우, 그가 만든 ‘부작란’들은 동아갤러리가 그동안 미술계에서 했던 역할을 떠오르게 한다. 그래서 동아갤러리의 빈자리가 다시 아쉽게 느껴지는 전시이기도 하다.













![[영상] 폴로 티 3000원… <br>고물가 시대 생활용품 경매로 싸게](https://dimg.donga.com/a/570/380/95/1/ugc/CDB/WEEKLY/Article/69/ae/a9/14/69aea9141beaa0a0a0a.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