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정래 지음/ 문학의문학 펴냄/ 440쪽/ 1만2000원
남 회장의 두터운 신임을 받는 ‘특급 충견’ 윤성훈은 강기준에게 강기준의 대학 선배인 박재우를 스카우트하라고 지시한다. 경제학 박사인 박재우는 업계 1위인 태봉그룹의 막강한 정보조직체를 만들어낸 기둥이자 1급 첩보원이다. 그는 처음엔 영입 제안을 일거에 거절하지만 마음을 바꾸고 이적 대가로 100억 원의 보너스와 스톡옵션을 요구한다. 하지만 일광그룹의 공작으로 태광에서 쫓겨날 처지가 돼 굴욕적으로 일광에 영입된다.
일광의 ‘국정원’이나 다름없는 새 조직의 이름은 ‘문화개척센터’다. 윤성훈 총본부장, 박재우 기획총장, 강기준 실행총무가 이 조직의 핵심 3인방이다. 이들의 첫 임무는 정·재·관계와 언론계에 일광그룹에 우호적인 2000여 명의 인맥조직을 만드는 것이다. 이 일을 위해 수사기관 국장인 김동석, 검사 신태하, 서기관 정민용 등을 1차로 영입하고, 2차로 각 분야 조직 확대를 꾀한다. 그 조직은 상투적이고 사무적인 로비가 아니라 인간적인 감동을 주는 ‘무한감동’ 로비를 하기 시작한다. 세무공무원 문 주사에게 1000만 원의 이사비용을 지원하고, 한 차관 부인의 생일 선물로 3000만 원짜리 최고급 와니백을 제공한다.
이 조직을 움직이기 위해 ‘백두산’만큼의 비자금을 조성한다. 곰 가죽은 억대, 범 가죽은 10억 대, 지리산은 100억 대, 한라산은 1000억 대, 백두산은 조대를 지칭하는 은어다. 돈은 귀신도 부리는데 하물며 사람이야! 이들에게 돈은 살아 움직이는 생물이고, 무엇이든 굴복시키는 괴력을 발휘하는 괴물이다.
그렇게 꾸려진 문화개척센터의 어마어마한 비밀금고에서 치러지는 ‘한가위맞이’ 떡값 봉투 작업은 진풍경이다. 센터가 발족되고 나서 여름휴가에 이어 두 번째 하는 작업이다. 선물이 아니고 현찰이어야 하는 이유는 현찰이 가장 효과가 좋고, 선물을 마련하기 어려울 정도로 액수가 크며, 증거인멸이 쉽기 때문이다. 남 회장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단어가 ‘기업의 사회 환원’ ‘노조’지만, 대학을 주무르려고 30억 원씩 기부해 문화관을 지어주는 공작도 수행한다.
이들의 또 다른 일은 비자금 은닉을 위해 직원들 이름으로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다. 고위 임원부터 차명계좌를 만들어나갔는데, 정작 본인들은 이 사실을 모른다. 일광이 분양하는 주상복합아파트는 완전 분양에 이어 억대의 프리미엄이 붙는 대성공을 거둔다. 지면기사가 게재되는 것을 보고 전면광고를 더 돌리겠다는 말에 언론들이 자발적으로 기사를 써준 덕분이다.
폭탄주가 공식인 회식자리에서 부장검사의 ‘암묵적 지시’에 동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주도로 좌천됐던 전인욱 검사는 인권변호사로 변신한다. 그리고 일광 비리를 고발한 경제민주화실천연대라는 시민단체의 공동대표가 된다. 그는 한 신문에 일광그룹의 비리를 고발하는 칼럼을 썼다가 대학에서 쫓겨난 허민 교수와 유대를 강화하며 경제권력과 유착된 부패를 용인하는 사회 메커니즘에 대항해 시민적 싸움을 벌여나간다.
소설의 마지막에서 윤성훈은 박재우와 강기준에게 전인욱의 도덕성에 위해를 가하는 또 다른 음모를 벌일 계획을 내비친다. 그러나 강기준은 자신을 더 비싸게 받아들인 거상그룹으로 자리를 옮기고, 거상그룹의 주소가 선명하게 박힌 봉투로 윤성훈에게 사표를 우송한다.
조정래는 ‘허수아비춤’에서 이 땅에서 40년 동안 변하지 않고 진행되는 대기업 비리와 천민자본주의를 신랄하게 파헤친다. 독야청청 건재할 수밖에 없는 자본주의의 빛과 그늘, 재벌권력에 ‘자발적 복종’만 일삼는 사회구조, 특히 가진 자들의 파렴치한 행태를 정면으로 다루고 있다.
소설 속의 칼럼에서 허민 교수는 “국민은 나라의 주인인가. 아니다. 노예다. 국가권력의 노예고, 재벌들의 노예다. 당신들은 이중의 노예다. 그런데 정작 당신들은 그 사실을 모른다. 그것이 당신들의 비극이고 절망이다”라고 말한다. 이것이야말로 작가가 소설을 통해 말하고자 한 주제라 할 수 있다.
그럼 노예 신분을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실마리를 전인욱과 허민의 결합에서 찾아낼 수 있다. 물론 그들의 앞날은 험난하다. 하지만 그 길이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는 말을 하기 위해 작가는 재벌권력의 비리를 풍자한 이 소설을 쓴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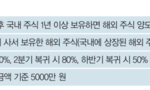












![[영상] 멸종위기 야생 독수리에게 밥을… <br>파주 ‘독수리 식당’](https://dimg.donga.com/a/380/253/95/1/ugc/CDB/WEEKLY/Article/69/5c/75/cc/695c75cc0d36a0a0a0a.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