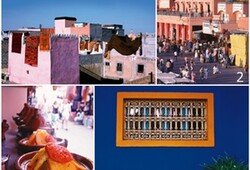사랑하는 이에게, 고마운 친구에게, 신세만 지던 선배에게 엽서를 보내는 것은 ‘말 한마디로 천 냥 빚 갚는다’는 속담처럼 마음 빚을 갚을 수 있는 기회라고나 할까. 먼 타지에서 내가 생각나서 엽서를 보냈다는데, 마음이 녹지 않을 이 누가 있으랴.
“네, 있어요. 엽서를 써요.”
여행할 때 누구나 엽서를 쓴다. 그러나 ‘꼭’ 쓰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단순해 보이지만 여행할 때 엽서를 쓰는 것은 꽤나 신경이 쓰이는 일이기 때문이다. 우표를 사는 것도, 우체통을 찾는 것도 만만한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꼭 엽서를 쓰는 이유는, 엽서를 보내는 것보다 좋은 기념품이나 선물은 없기 때문이다. 내용이 거창할 필요도 없다. 안부면 족하다. ‘잘 지내는지, 나는 타지에서 이렇게 너를 생각하고 있단다. 네가 그리워’ 정도만 써도 10점 만점에 8점은 먹고 들어간다. 그렇다면 여행하면서 엽서를 띄우기만 하느냐. 아니다. 모으기도 한다. 엽서만큼 간단하면서 좋은 기념품도 드물다. 보통 친구들에게 보내는 엽서는 사진이 그다지 훌륭하지 않더라도 당시 내가 본 광경과 가장 비슷한 느낌을 주는 것으로 고른다. 거기에 내 마음과 길에서의 현장감을 담아야 하기 때문이다.
여행지 풍광 담은 훌륭한 사진 교본
그러나 모으는 엽서는 다르다. 당시의 느낌을 담은 풍경보다는 내가 볼 수 없는, 내가 사진으로 담지 못한 것들을 고르는 것을 나름 원칙으로 삼고 있다. 15년간 모아온 엽서만 해도 수백 장. 엽서를 만드는 수준만 보아도 그 나라의 관광산업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그들의 인쇄나 사진 기술력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있다.
엽서를 모으는 첫 번째 이유는 훌륭한 사진 교본이기 때문이다. 그 여행지에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멋진 풍광을 담고 있는 것이 엽서다. 물론 사진작가들은 엽서나 달력 사진 같은 사진은 찍지 말라고 충고한다. 자신의 눈으로 본 자신만의 사진을 찍으라는 것. 백번 맞는 말씀이다. 그러나 초심자에게는 다른 이들이 찍은 사진을 관찰하는 것만큼 훌륭한 수업도 없다. 그런 면에서 엽서는 수업료가 저렴하면서도 효과적인, 아주 매력적인 사진 선생님이다.
엽서를 모으는 두 번째 이유는 내가 갖지 못하는 시간과 공간의 차이를 채워주기 때문이다. 최근에 다녀온 일본 홋카이도의 비에이에서도 그랬다. 이 지역은 7월이 되면 라벤더를 비롯한 수많은 꽃이 피어서 세계 어느 곳과 비교해도 빠지지 않을 정도로 아름다운 풍광을 만들어낸다. 그러나 지금은 한겨울. 겨울에 가니 꽃은커녕 영화 ‘나니아 연대기’를 찍었을 법한 눈의 나라가 되어 있었다. 내가 여행하면서 만난 풍경은 눈이 내리는 비에이에 머물렀지만, 화려하기 그지없는 엽서를 보면서 얼마든지 그 계절의 모습들을 상상할 수 있었다.
비슷한 이유지만 아프리카 동물사진을 담은 엽서들도 그렇다. 적어도 600mm 망원렌즈는 사용해야 찍을 수 있을 듯한 동물사진이라든지, 밀림에서 사자들과 호형호제하는 사이라야 찍을 수 있을 것 같은 자연스러운 사진이 담긴 엽서들은 엽서를 구입하는 것으로 대리만족을 느끼게 해준다.
또 엽서는 시간을 과거로 돌려주기도 한다. 옛날 사진이나 그림은 그 시대를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이다. 터키에서 파는 엽서들은 콘스탄티노플의 화려했던 모습을 담고 있다. 현재의 활기찬 술탄 아흐메드나 블루 모스크를 그린 엽서들도 나쁘지 않지만, 기왕이면 더 멋스러워 보이는 옛날 사진을 선호한다.
쿠바의 엽서는 또 어떤가. 쿠바 엽서의 상당 부분은 여전히 체 게바라가 차지하고 있다. 체 게바라를 사랑하는 쿠바 사람들의 정서를 보여주듯이 말이다. 엽서 속에서 활짝 웃고 있는 체 게바라. 엽서를 쳐다보고 있노라면 금방이라도 시가를 문 그가 나타날 것만 같다.
각 나라 정서와 다양한 이야기 담겨
그림이나 포스터를 가지고 만든 엽서도 많다. 특히 스페인이나 이탈리아에 가면 사고 싶은 엽서가 그림으로 그려진 엽서다. 이탈리아는 로마를 비롯해 피렌체, 베네치아 등을 배경으로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많아서 그런지 사진보다는 아련한 아름다움을 주는 그림엽서가 더 인기가 많다. 스페인에서는 빈티지한 느낌을 주는 포스터 엽서들이 인기가 많다. 특히 플라멩코나 투우 포스터 엽서는 고풍스러운 멋과 원색의 아름다움이 적절하게 혼합되어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분위기를 풍긴다.
이번에는 그리스 아테네로 가볼까. 그리스의 엽서들은 3차원 엽서가 많다. 고대 문화유산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와 현재의 모습을 각도에 따라 다르게 보여주는 엽서들이다. 기념품으로도 좋지만 청소년 교육용으로 더할 나위 없이 효과적인 자료가 아닐까 싶다.
간단해 보였던 엽서 안에도 이처럼 다양한 이야기가 담겨 있다. 크기도 그렇다. 가장 일반적인 직사각형 스타일이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정사각형, 파노라마 크기 등 다양하다. 아르헨티나 지역의 엽서들은 특히 파노라마 크기가 훌륭하다. 그런가 하면 아프리카의 동물 엽서는 동물 모양대로 그려진 엽서가 많다. 직사각형 엽서의 획일성을 깨뜨리는 훌륭한 시도이기는 하나, 우체국 직원들은 그다지 반가워하지 않을 것 같다.
엽서 컬렉션 북에 있는 99.9%의 엽서가 여행을 하면서 직접 입양해온 것들이지만, 가끔은 길에서 만난 친구들과 기념으로 주고받은 엽서들도 있다. 몇 년 전 터키를 여행할 때 만났던 폴란드 친구가 준 엽서는 애장 엽서 순위에 들어가 있을 정도다. 바로 평양의 모습을 담은 엽서. 그 친구는 북한을 여행했다며 북한 엽서를 신기하게 바라보는 내게 약간의 북한 돈과 함께 엽서를 선물했다.
워낙 엽서를 좋아하다 보니 여행을 떠나기 전에 우리나라 엽서도 꼭 챙긴다. 여행하면서 만난 친구들과 이별할 때 메시지를 전하기 좋기 때문이다. 이렇게 어떤 엽서는 사진 선생님이 되고, 어떤 엽서는 추억이 되고, 어떤 엽서는 사랑으로 모아진다. 수많은 이유 때문에 나는 이번 여행에서도 결국 엽서를 한 다발 안고 올 수밖에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