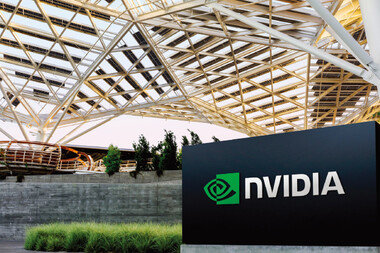“선생님들은 ‘공고·상고 출신들이 사회발전에 밑거름이 되었다’며 자긍심을 가지라지만, 우리가 뭐 바본가요. TV에도 실업고 애들은 안 나오잖아요. 죽어라 공부하는 인문계 애들만 불쌍하다고 그러지.” 그렇다고 별다른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 “후회하는 건 아니예요. 잘 놀았거든요. 어떻게든 되겠죠, 뭐.”
20대 초반의 젊은 산업인력을 현장에 배출해야 할 실업고가 흔들리고 있다. 생산직 근로자로서의 삶에 흥미를 잃은 상당수의 학생들이 다른 길을 찾아 헤매는 동안, 공장과 생산라인에는 ‘젊은 피’ 수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 피를 공급해야 할 동맥이 경화현상에 걸려 있는데 피가 돌지 않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2000년 현재 전국의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은 모두 75만여 명. 이 중 지난해 졸업한 29만 명 가운데 51%만 취업했으며 42%는 전문대 등 상급학교 진학을 선택했다. 이미 많은 학생들은 실업고를 대학으로 가는 징검다리 정도로만 인식할 따름이다. 이렇듯 실업고 출신들이 생산 현장을 외면하는 동안 근로 현장에는 이들의 삼촌뻘 되는 고령 근로자만 남은 것이다.
전남 J정보고등학교 디자인과 3학년 S양(18)도 고민이 많다. 이제 1년도 남지 않은 졸업 이후에 무엇을 해야 좋을지 선뜻 결정을 내리지 못하였기 때문. “중3 때는 졸업해서 바로 취업하겠다는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고민이 많아요. 제가 선택한 게 잘한 일이었는지도 모르겠고요.” S양이 다니는 학교는 평판이 좋아 취업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형편이다. 그렇지만 S양은 곧바로 사회에 나가는 게 달갑지 않다. 문제는 역시 대학이다. “‘고등학교 나와서는 대우 못 받는다’고 말하는 언니들을 보면 어떻게 해야 좋을지 망설여져요.” 인문계에 진학한 중학교 때 친구들이나 1학년 때부터 대학 진학을 염두에 두고 내신을 관리해 온 동기들이 새삼 부러울 뿐이다.

경기도 일산의 주엽공고 엄철회 교사는 “한 반에 80% 이상이 대학 진학을 희망한다”고 전한다. 실력이 안 되서 대학에 못 가는 것일 뿐 고등학교를 끝으로 20대의 나이에 바로 현장에 뛰어들려고 하는 아이들을 찾아보기란 쉽지 않다는 것. ‘산업인력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익힌다’는 실업교육의 취지와는 무관하게, 수능 성적을 올릴 수 있는 과목에만 학생들이 집중하는 현상도 발생한다. 서울 경기여상의 오윤선 교감은 “제7차 교육과정 개편 이후 학생들의 수업 선택권을 강화하면서 실업계 고유과목은 더욱 설 자리가 줄어들었다”고 말한다.
이러한 실업고 학생들의 고민은 전체 5%에 달하는 4만 명 내외의 학생들이 해마다 자퇴하였다는 사실에서도 나타난다. 게다가 해마다 입학연령 인구가 수만 명씩 줄어들면서 일부 실업고는 미달 사태까지 벌어졌다.
실업계 고등학교 출신 취업자 수도 갈수록 줄어든다. 지난 92년 22만 명 수준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실업고 출신 취업자는 해마다 감소해 지난해에는 15만 명으로 줄어들었다(26쪽 그래프 참조). 배출인력 감소로 빚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실업고를 특성화 학교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경기도 하남의 한국애니메이션고, 시흥의 성택조리과학고, 부산의 자동차고 등이 일찍부터 특성화를 시도해 인기를 누리는 학교들이다. 그러나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신익현 박사는 이러한 추세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특성화 분야라는 게 인기를 탄다. ‘유행’업종일 수는 있지만 ‘유망’업종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다. 종국에는 정작 필요한 분야의 숙련공 대신 불필요한 부분의 잉여인력만 남을 수도 있다.” 실업고의 목적은 노동시장이 원하는 인력을 공급하는 것인데, 특성화 추세에 따른 인력 배출은 시장 수요와 무관하다는 지적이다. 우선 학생 유치에는 성공할 수 있겠지만 산업구조적인 측면에서 본질적인 처방은 아니라는 것이다.
7월4~11일까지 서울시내 4개 학교에서 36회 전국기능경기대회가 열렸다. 내년에 참가하기 위해 사전답사차 왔다는 김승화군(전남 여수공고 2년)의 이야기는 취재과정에서 만난 다른 학생들과 사뭇 다르다. 김군에게 “대학 진학은 생각해 보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글쎄요, 제가 좋아하는 선반기계 일을 더 잘하려면 대학보다는 취업이 나을 것 같은데요.” 그러나 김군처럼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실업고 학생은 그리 많지 않다. 비록 쓸모없는 학과를 가더라도 대학은 나와야 한다는 인식이 실업고 학생들에게 만연해 있고 실업고 출신과 대졸 출신과의 차별이 있는 한 생산현장의 고령화는 미해결의 과제로 남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