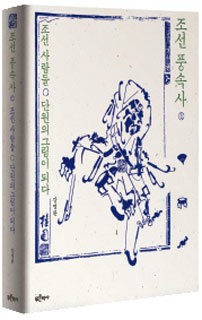
강명관 지음/ 푸른역사/ 1~3권/ 모두 5만8000원
이 책들은 모두 엄정함이란 잣대에 매몰되기 쉬운 역사학자가 아닌, 인간의 상상력에 방점을 두는 문학 전공자가 쓴 책이다. 임팩트가 강한 한 장의 그림, 한 권의 책, 한 사람의 일기 등과 같은 팩트(사람·사물·사건)에서 시작한 이 책들의 자유로운 상상력은 디지털 시대에 아날로그 책이 보여준 새로운 가능성으로 추앙받기도 했다.
강명관이 이번에 ‘조선 풍속사’ 시리즈로 ‘조선 사람들, 단원의 그림이 되다’ ‘조선 사람들, 풍속으로 남다’ ‘조선 사람들, 혜원의 그림 밖으로 걸어나오다’ 세 권을 한꺼번에 내놓았다. 혜원의 그림을 다룬 책은 2001년의 책을 개정한 것이지만 세 권으로 완성해놓으니 한 학자의 열정이 한눈에 느껴졌다.
저자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아무리 정밀한 언어적 묘사도 한 장의 그림만 못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실제 그는 그림으로 조선의 풍속을 세밀하게 풀어낸다. 1권 ‘조선 사람들, 단원의 그림이 되다’는 ‘단원풍속도첩’에 실린 시리즈 그림 즉 쌍겨리(논갈이), 들밥(새참), 타작, 나무하기와 윷놀이, 어살, 대장간, 우물가, 빨래터, 길쌈, 씨름, 무동, 서당, 활쏘기, 행상, 주막, 신행길 등을 소재로 한 25장의 그림을 화두로 고전 문헌에 대한 방대한 지적 편력을 동원해 조선 풍속사 전체의 복원을 시도한다.
쌍겨리는 쌍멍에에 소 두 마리를 지우는 것을 말한다. 단원 김홍도의 ‘쌍겨리’에는 한 사내가 소 두 마리로 쟁기질을 하고 있다. 소 엉덩이에 똥이 묻은 것까지 묘사한 사실감이 높은 그림이다. 농우는 농사를 짓는 데 필수였다. 하지만 동리 100집에 농사를 맡길 소는 몇 마리에 불과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도둑떼까지 소를 잡아먹어 하는 수 없이 사람이 쟁기를 끌었다. 소 한 마리를 사람 아홉이 당하지 못하는데 말이다.
조선시대에는 전염병도 자주 돌았지만 워낙 쇠고기 먹기를 좋아해 소가 부족했다. 그래서 소 도살을 엄격히 막는 ‘우금(牛禁)’ 정책이 시행됐지만, 정책을 수립하는 지배층이 쇠고기 소비 욕망을 멈출 수 없었기에 성공할 수 없었다. 오히려 세금을 내지 못한 농가에 아전들이 들이닥쳐 소를 끌고 가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니 소는 백성 수탈의 대명사나 다름없었다. 저자는 평생 일하느라 힘이 빠진 소의 고기까지 먹는 모습을 그린 홍신유의 시 ‘우거행(牛車行)’을 인용하며 영화 ‘워낭소리’를 떠올리고는 “과연 인간이 이토록 짐승의 살을 탐닉해야 할 것인가” 하고 탄식한다.
2권 ‘조선 사람들, 풍속으로 남다’는 단원과 혜원의 풍속화 이외의 풍속화로, 3권은 혜원 김홍도의 그림으로 이야기를 풀었다. 이 시리즈의 책은 어느 부분부터 읽어도 한순간에 빠져들 수밖에 없을 만큼 구수한 입담을 비롯해 문학의 역사, 풍속사, 사회사, 음악사, 미술사 등 방대한 지식에 대한 저자의 해박함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이번에 1050쪽에 이르는 세 권을 읽으면서 무엇보다 저자의 고난받는 민중에 대한 깊은 애정을 확인할 수 있어서 좋았다. 수확의 기쁨과 수탈의 슬픔을 함께 담은 단원의 ‘타작’에는 한 사내가 자리 위에 비스듬히 누워 있다. 지주이거나 지주를 대신한 마름일 것이다. 저자는 “땅은 원래 경작하는 것이고, 경작하는 사람만이 땅의 주인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양반은, 마름은 경작하지 않고 땅을 차지하고 있으니 정말 해괴한 일이 아닌가. 소를 부리며 땅을 갈고, 가족이 날라오는 새참을 먹고, 가을에 도리깨질을 하는 소농이야말로 인류를 이제까지 살려온 사람이 아닌가. 그런데 지금 한국사회의 농민과 농촌은 어떻게 되었는가” 하고 되묻는다. 우리 시대 노동자의 삶을 다룬 책들에도 이런 모습이 똑같이 재현되고 있다. ‘역사는 어찌 이리 지루하게 반복되는가’라고 나는 탄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