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누드에 가까운 요즘의 시스루 패션

17세기 중반 장 오노레 프라고나르가 그린 ‘그네’는 당시의 노출 미학을 엿볼 수 있다.
미술사학자 K. 클라크는 옷을 입지 않은 몸을 나체와 누드로 명확히 구분했다. 글자 그대로 옷을 벗은 몸은 나체이고, 예술가의 모델처럼 아름답게 보이기 위한 특별한 포즈 등을 통해 몸에 어떤 문화적인 의미가 부여되면 누드라는 것이다. 거기에 더해 우리는 옷이라는 한층 더 정교하고 세련된 문화적 산물로 감춰진 인간의 몸을 생각해볼 수 있다.
최초의 남녀가 무화과 잎사귀로 몸을 가린 이후 ‘감춤’과 ‘드러냄’은, 어느 한쪽이 우세해지는 듯하면 어느새 다른 한쪽이 교묘하게 그 틈을 파고들면서 자신의 세력을 구축하는 과정을 반복해왔다. 다 보여주는 것보다는 보일 듯 말 듯한 쪽에, 그리고 자신이 직접 최후에 열어보고 들춰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편에 더욱 끌리는 것이 사람 마음 아니겠는가.
여성의 다리는 항상 가려야 하고 심지어 피아노 다리도 외설적이라 하여 헝겊으로 감쌌던 영국 빅토리아 시대에는 은폐의 상징이라 할 만한 여성 의상이 실은 정숙성을 가장한 유혹의 수단이었다. 당시 유행하던 엄청나게 넓은 크리놀린 스커트는 걸을 때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 또는 춤을 출 때 겹겹이 쌓인 치맛단을 반드시 걷어올리지 않으면 안 됐기 때문에 가장 비밀스런 부위인 다리가 노출될 수밖에 없었고, 결국 늘 드러나 있던 깊이 파인 가슴보다 감춰진 부위가 더욱 매력적으로 다가와 뭇 남성의 가슴을 설레게 했다.
“패션의 기능은 끊임없이 여성 신체의 한 부분에서 다른 부분으로 강조점을 옮겨 성적 매력을 증대하는 데 있다”고 한 레이버(Laver)의 ‘성적 매력점 이동(Shfting Erozenous Zone)’ 이론은 반론의 여지가 있지만, 현대의 사회학자와 의류학자들의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다.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킨 배꼽티는 이제 연예인뿐 아니라 거리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는 패션이다.
보일 듯 말 듯한 아름다운 몸! 배꼽티 패션 열풍 덕분에 길거리에서 여름내 크고 작은 고리와 심지어 다이아몬드로 장식된 별의별 모양의 배꼽을 실컷 감상 비교할 수 있었지만, 감춤과 드러냄의 절묘한 변증법이 주는 매력은 역시 거역하기 어려운 것이 아닐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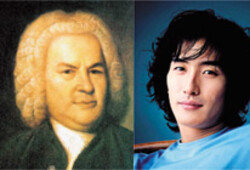













![[영상] 코스피 5000 예견한 김성효 교수 <br>“D램 가격 꺾이지 않는 이상 코스피 우상향”](https://dimg.donga.com/a/380/253/95/1/ugc/CDB/WEEKLY/Article/69/85/44/6f/6985446f21f9a0a0a0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