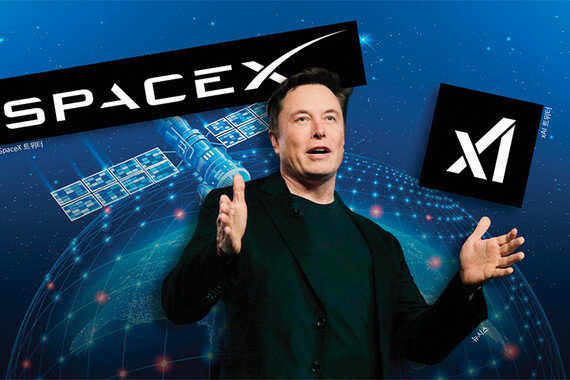대전시향을 지휘하는함신익.그는 2001년 대전시향 음악감독으로 부임했다.
24일 대전 엑스포아트홀에서 만난 함신익은 몹시 바빠 보였다. 오전과 오후 연습 사이에 있는 점심시간에도 그는 호른 단원들을 붙잡고 파트 연습을 시키고 있었다. 호인형 얼굴에 매서운 눈매가 인상적인 그는 도시락으로 대충 점심을 때우면서 대전시향의 변화된 모습과 미래, 그리고 문제점들에 대해 폭포수처럼 열변을 쏟아냈다. 2001년 대전시향에 부임한 이래 함신익은 이 같은 의지와 열정으로 시청 공무원들과 무수히 싸우면서, 또 그들을 설득해가면서 오케스트라를 이끌어왔다. 그는 대전에서는 공익광고 CF에 출연할 정도로 유명인사다.
“인생이 다 모험이죠. 서울에 가서 연주하는 것, 2001년 미국에서 한국으로 활동 근거지를 옮기면서 서울이 아닌 대전 오케스트라를 선택한 것이 다 모험이었어요. 하지만 그런 도전 없는 인생은 재미없지 않나요?”
미국 이스트만 음대를 졸업한 함신익은 예일대 부교수로 재직하면서 예일 심포니 오케스트라를 지휘했었다. 지금도 이 단체의 음악감독을 맡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대전의 신도시 둔산에 사는 ‘대전사람’이기도 하다.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지방’이라는 말이에요. 그 말 속에는 2류, 서울에서 밀려 나간 사람들 뭐 이런 의미가 들어 있으니까요. 대전도 음악 활동하기에 그리 좋은 환경은 아니에요. 수준급 음악학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단원들이 좋은 대우를 받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대전에는 서울보다 훨씬 뛰어난 청중이 있어요.”
“세계적 연주자와 협연 실력 검증”
그가 오기 전까지 대전의 청중들은 서울로 가 음악을 들었다. 전국에서 가장 박사가 많은 도시인 대전의 청중들은 그만큼 음악에 목말라 있었다. 그러나 1984년 창단된 대전시향의 음악 수준은 그들을 만족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전국에서 꼴찌 아니면 끝에서 두 번째 오케스트라’라고 단원들 스스로가 자조할 정도였다. 새 단원을 선발하려 해도 대전까지 오려 하는 연주자가 없었다. 함신익이 올 당시 바이올린 파트 단원은 20명 정원에 14명뿐이었다.
“첫 1년간 가장 힘들었던 문제 중 하나가 좋은 단원들이 들어오려 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어요. 한 2년쯤 열심히 하니, 수준급 단원들이 오디션에 응시하기 시작하더군요. 정 좋은 단원이 없으면 아예 미국이나 우크라이나 등 외국에서 단원을 데려왔습니다.” 이제는 평단원을 선발할 때도 해외 유학파들이 오디션에 응시한다. 단원들이 그만큼 대전시향의 미래를 신뢰한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그동안 대전시향은 지휘자와 단원들이 축구 유니폼을 입고 연주하는 ‘오케스트라 게임’ 등 이벤트성 연주회도 자주 열었다. 서울 무대에서도 이런 연주회를 간간이 선보여 화제를 모았다. 그러나 함신익은 이제 이벤트성 연주보다는 ‘정공법’에 주력하겠다고 말한다. “베토벤, 차이코프스키, 물론 좋지요. 하지만 허구한 날 똑같은 레퍼토리만 반복해서는 오케스트라가 발전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곡을 많이 연주해야 오케스트라의 실력이 늘어요. 그 때문에 대전시향이 말러, 브리튼, 드뷔시,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등 다양한 작곡가들의 곡을 계속 연주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연주 횟수도 월 5, 6회 이상으로 늘릴 거예요. 이제 대전시향의 실력은 전국 오케스트라 중 세 손가락 안에 든다고 봅니다.”
지휘자의 넘치는 의욕을 단원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한 단원은 “새로운 지휘자가 오시면서 연주와 연습시간이 많아져 고달퍼진 것은 사실이지만 단원들의 결속력은 확실히 높아졌다. 이제는 서울에 가서 연주한다고 해도 두렵지 않다”고 말했다.
더구나 대전시향은 올 10월 문을 여는 대전 예술의전당 상주 오케스트라가 된다. 그동안 음향 좋은 홀이 없어 골치를 썩었던 문제가 해결되는 셈이다. “올해 하반기에 백건우 김영욱 김대진 등의 연주자가 우리와 협연해요. 내년에는 사라 장이나 요요마 정도 수준의 세계적인 연주자들을 대전에 데려올 겁니다. 우리 오케스트라는 그만한 연주자들과 협연할 만한 실력이 되거든요.”
‘대전시향을 통해 한국 오케스트라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겠다’는 지휘자와 ‘오케스트라에서 비전을 보았다’는 단원들. 젊은 오케스트라 대전시향의 변화는 이제 시작인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