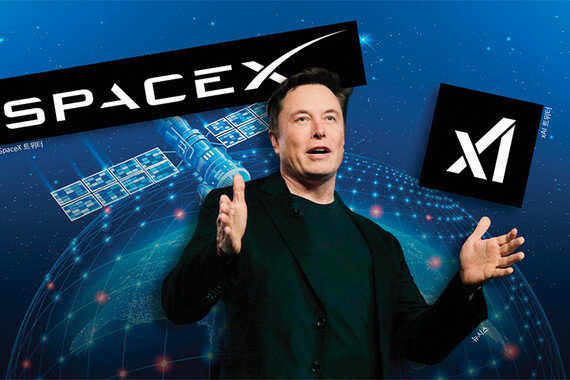정책 결정 과정에서 여론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워싱턴에서 대(對)언론 관계는, 정책의 채택 여부는 물론 정책 입안자들의 정치생명의 사활을 가르는 절대적 요소다. 언론 활용법이야말로 정책에 숨을 불어넣느냐, 정책을 무덤으로 가져가느냐 하는 양자택일의 전제조건인 것이다. 미국의 외교정책, 특히 대북정책 역시 이러한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지난해 10월부터 불붙기 시작한 워싱턴과 평양의 밀고 당기는 신경전에서 미 언론의 역할은 결정적이다. 정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언론을 활용한다는 소극적 차원이 아니라 언론을 전략 수행의 한 요소로 포함시켜 최대한 활용한다는 것이 부시 행정부 정책 입안자들이 마련한 전략이기 때문이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북한이 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을 보유했다는 기사다. 북한이 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을 가동중이라는 소식은 당시 대북 특사로 평양을 다녀온 제임스 켈리 국무부 부차관보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이 소식은 ‘유에스 뉴스 앤 월드 리포트’의 국무부 담당 기자 바브라 슬래빈의 기사를 통해 처음 전해졌다. 처음 보도되던 날 퇴근시간 이후에 백악관측이 서둘러 발표하는 형식을 취했지만, 현재 북핵 위기의 시발점이 된 북한의 농축 우라늄 프로그램 보유 사실은 이렇게 언론을 통해 처음 공개된 것이다.
‘北 정권교체’ 용어도 언론이 소개
슬래빈 기자는 지금도 행정부 내 취재원의 이름을 밝히지 않는다. 그러나 강경파로 알려진 국무부의 한 고위 관리가 슬래빈 기자에게 이 정보를 의도적으로 흘려주었다는 사실이 국무부 출입기자들의 입을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다.
당시는 고이즈미 일본 총리가 평양을 방문하고 있었고, 러시아와 중국이 북한과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강화하고 있었으며, 남북간 교류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였다. 그러나 북한이 우라늄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미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한순간에 북미 관계가 얼어붙었고, 이후 9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상황은 호전되지 않고 있다.
부시 행정부가 처음부터 ‘정권교체’를 입에 올렸던 것은 아니다. 정권교체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한 것 또한 언론을 통해서였다. 물론 미국 언론이 기사에서 북한의 정권교체를 처음 거론한 때인 지난해 11월부터 이미 펜타곤(미 국방부) 관리들은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부시 대통령의 관심은 김정일 정권의 붕괴”라는 말을 당연하다는 듯이 입 밖에 내고 다녔다.
그로부터 8개월이 지난 올 7월 말 현재, 북한의 정권교체라는 말은 어느새 낯설지 않아졌다. 부시 행정부 내 강경파들이 그만큼 시간을 투자한 결과고 언론, 논객, 싱크탱크 등을 총동원해 집요하게 대북 강경여론을 형성해놓은 결과다. 강경파들의 성공작인 셈이다.
정권교체론에 이르는 동안 워싱턴의 여론은 2~3개월 간격을 두고 단계별 흐름을 탔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는 용납할 수 없다”(비핵화론)쭻“협상은 하지만 북한을 믿을 수는 없다”(협상 무용론)쭻“북한은 끝까지 핵을 포기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핵 야망 불포기론)쭻“남은 방법은 정권교체뿐이다”(정권교체 불가피론).
북한 비핵화론은 두 갈래다. 도널드 럼스펠드 국방장관은 북한이 핵을 보유했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한 지 오래다. 펜타곤 정례 기자회견 때 나온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다’는 럼스펠드의 발언에 한국 언론은 눈을 동그랗게 떴다. 그러나 미국 언론은 그리 놀라는 기색이 아니었다. 그때 이미 ‘뉴욕 타임스’는 럼스펠드 발언의 진의를 이렇게 해석했다. 부시 행정부가 진짜 우려하는 것은 북한이 핵을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핵을 수출하는 것이며, 이것이 북한을 ‘테러와의 전쟁’ 대상국에 포함시키는 논리고, 북한의 정권교체를 목표로 하는 논리적 근거라는 것이다.
미 행정부 내 강경파들은 이러한 논리를 결코 우격다짐으로 유포하지 않았다. 그건 아마추어들이나 하는 짓이다. 부시 행정부 내 매파들은 프로다. 중견 관리 시절이던 레이건 행정부 때부터 갈고 닦은 실력을 갖추었고, 부시 행정부에서 그 실력을 본격적으로 발휘하고 있다.
행정부 내 매파와 비둘기파 간의 갈등이 있는 듯 보이고, 그런 것이 사실이기도 하지만, 미국의 국익이라는 깃발을 치켜들 때마다 이런 구분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곤 했다. 여기에 언론이 동참했다. 서둘지도 않는다. 이미 오래 전에 마련한 시간표대로 갈 뿐이다.
정책 결정자들의 역할도 각기 다르다. 백악관의 국가안보회의가 주도하고 국무부가 뒤처리를 하는 사안이 있고, 국무부가 앞장서고 국방부가 거드는 사안이 있다. 지난해 10월 불거진 북한의 우라늄 프로그램 보유건은 국가안보회의 내 강경파의 작품이다. 겉으로는 주체가 전혀 드러나지 않았지만, 지금까지도 북핵 현안에 관한 한 주역은 바뀌지 않았다. 펜타곤은 이 현안에서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조연 역할을 잘 해내고 있다.
행정부 관리들 TV 통해 정책 선전
최근의 대북 불가침 서면 보장설 역시 국무부가 ‘워싱턴 포스트’를 통해 의견을 밝혔을 뿐이다. 이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참모들과의 사전 토의를 거쳤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다. 국무부의 말에 힘이 실리지 않았던 것이다. 결국 불가침 서면 보장설은 하루 만에 백악관이 직접 나서 설거지를 했다. 보도 이튿날 저녁에 나온 백악관 성명에서는 어느 구석에서도 대북정책에 변화가 있다는 냄새를 맡을 수 없다.
국가안보회의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대북정책과 관련해 설정해놓은 단기 목표가 무엇이며, 다음 단계에 취할 조치가 무엇인지 등을 가장 잘 엿볼 수 있는 것은 ‘뉴욕 타임스’ 백악관 출입기자 데이빗 생어의 기사다. 북한 선박 해상 저지가 현실화하기 2개월 전에 데이빗 생어의 기사에는 이미 ‘부시 행정부 한 고위 관리’의 말을 인용, ‘해상 봉쇄 등을 통한 대북 제재 가능성’이 언급됐다. 북한의 제2 핵시설을 다룬 7월20일자 ‘뉴욕 타임스’ 기사의 작성자 역시 데이빗 생어고, 콘돌리자 라이스의 말을 인용해 대북 협상 무용론→핵 야망 불포기론→정권교체 불가피론을 만질만질한 외교용어로 포장한 6월21일자 분석기사도 데이빗 생어의 작품이다.
물론 제목에 ‘북한 정권교체 임박’ 같은 자극적인 제목이 달린 것도 아니다. ‘2개의 핵무기 도전, 2개의 다른 전략’이 제목이다. 제목만 봐서는 그다지 눈길을 끌지도 않는다. ‘북한’이니 ‘정권교체’니 같은 말은 들어 있지도 않다. 한국 언론이 거의 기사화하지 않는 기사의 공통적인 요소는 모두 갖추었다. 그러나 이런 종류의 기사야말로 대북정책을 끌고 나가는 정책 결정자들이 여론을 형성해가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다.
일요일 아침 주요 방송사가 앞다투어 내보내는 ‘선데이 모닝 토크쇼’야말로 행정부 관리들의, 말 그대로 정책 ‘선전장’이다.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은 물론 행정부처 장관에서부터 부통령까지 모두 나서 여론몰이를 하고, 이튿날인 월요일 아침 신문에 큼지막한 기삿거리를 제공한다.
노련한 정책 결정자일수록 언론이 무엇을 좋아하고, 언론을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지를 꿰뚫어보고 있다. 주한 미군 재배치 현안 등에서 펜타곤은 미국 언론보다 한국 언론을 십분 활용했다.
미 2사단 재배치는 이미 한국 국방부와 상의가 끝난 상태였고, 누가 언제 입을 여느냐 하는 껄끄러운 문제만 남겨놓은 상태였다. 펜타곤은 슬쩍 가능성만 비쳤으나 한국 언론은 벌집 쑤신 모양새가 되었고, 펜타곤은 별 어려움 없이 2사단 재배치라는 미묘한 현안을 기정사실화할 수 있었다. 이 역시 프로의 작품이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북한이 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을 보유했다는 기사다. 북한이 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을 가동중이라는 소식은 당시 대북 특사로 평양을 다녀온 제임스 켈리 국무부 부차관보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이 소식은 ‘유에스 뉴스 앤 월드 리포트’의 국무부 담당 기자 바브라 슬래빈의 기사를 통해 처음 전해졌다. 처음 보도되던 날 퇴근시간 이후에 백악관측이 서둘러 발표하는 형식을 취했지만, 현재 북핵 위기의 시발점이 된 북한의 농축 우라늄 프로그램 보유 사실은 이렇게 언론을 통해 처음 공개된 것이다.
‘北 정권교체’ 용어도 언론이 소개
슬래빈 기자는 지금도 행정부 내 취재원의 이름을 밝히지 않는다. 그러나 강경파로 알려진 국무부의 한 고위 관리가 슬래빈 기자에게 이 정보를 의도적으로 흘려주었다는 사실이 국무부 출입기자들의 입을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다.
당시는 고이즈미 일본 총리가 평양을 방문하고 있었고, 러시아와 중국이 북한과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강화하고 있었으며, 남북간 교류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였다. 그러나 북한이 우라늄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미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한순간에 북미 관계가 얼어붙었고, 이후 9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상황은 호전되지 않고 있다.
부시 행정부가 처음부터 ‘정권교체’를 입에 올렸던 것은 아니다. 정권교체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한 것 또한 언론을 통해서였다. 물론 미국 언론이 기사에서 북한의 정권교체를 처음 거론한 때인 지난해 11월부터 이미 펜타곤(미 국방부) 관리들은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부시 대통령의 관심은 김정일 정권의 붕괴”라는 말을 당연하다는 듯이 입 밖에 내고 다녔다.
그로부터 8개월이 지난 올 7월 말 현재, 북한의 정권교체라는 말은 어느새 낯설지 않아졌다. 부시 행정부 내 강경파들이 그만큼 시간을 투자한 결과고 언론, 논객, 싱크탱크 등을 총동원해 집요하게 대북 강경여론을 형성해놓은 결과다. 강경파들의 성공작인 셈이다.
정권교체론에 이르는 동안 워싱턴의 여론은 2~3개월 간격을 두고 단계별 흐름을 탔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는 용납할 수 없다”(비핵화론)쭻“협상은 하지만 북한을 믿을 수는 없다”(협상 무용론)쭻“북한은 끝까지 핵을 포기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핵 야망 불포기론)쭻“남은 방법은 정권교체뿐이다”(정권교체 불가피론).
북한 비핵화론은 두 갈래다. 도널드 럼스펠드 국방장관은 북한이 핵을 보유했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한 지 오래다. 펜타곤 정례 기자회견 때 나온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다’는 럼스펠드의 발언에 한국 언론은 눈을 동그랗게 떴다. 그러나 미국 언론은 그리 놀라는 기색이 아니었다. 그때 이미 ‘뉴욕 타임스’는 럼스펠드 발언의 진의를 이렇게 해석했다. 부시 행정부가 진짜 우려하는 것은 북한이 핵을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핵을 수출하는 것이며, 이것이 북한을 ‘테러와의 전쟁’ 대상국에 포함시키는 논리고, 북한의 정권교체를 목표로 하는 논리적 근거라는 것이다.
미 행정부 내 강경파들은 이러한 논리를 결코 우격다짐으로 유포하지 않았다. 그건 아마추어들이나 하는 짓이다. 부시 행정부 내 매파들은 프로다. 중견 관리 시절이던 레이건 행정부 때부터 갈고 닦은 실력을 갖추었고, 부시 행정부에서 그 실력을 본격적으로 발휘하고 있다.
행정부 내 매파와 비둘기파 간의 갈등이 있는 듯 보이고, 그런 것이 사실이기도 하지만, 미국의 국익이라는 깃발을 치켜들 때마다 이런 구분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곤 했다. 여기에 언론이 동참했다. 서둘지도 않는다. 이미 오래 전에 마련한 시간표대로 갈 뿐이다.
정책 결정자들의 역할도 각기 다르다. 백악관의 국가안보회의가 주도하고 국무부가 뒤처리를 하는 사안이 있고, 국무부가 앞장서고 국방부가 거드는 사안이 있다. 지난해 10월 불거진 북한의 우라늄 프로그램 보유건은 국가안보회의 내 강경파의 작품이다. 겉으로는 주체가 전혀 드러나지 않았지만, 지금까지도 북핵 현안에 관한 한 주역은 바뀌지 않았다. 펜타곤은 이 현안에서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조연 역할을 잘 해내고 있다.
행정부 관리들 TV 통해 정책 선전
최근의 대북 불가침 서면 보장설 역시 국무부가 ‘워싱턴 포스트’를 통해 의견을 밝혔을 뿐이다. 이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참모들과의 사전 토의를 거쳤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다. 국무부의 말에 힘이 실리지 않았던 것이다. 결국 불가침 서면 보장설은 하루 만에 백악관이 직접 나서 설거지를 했다. 보도 이튿날 저녁에 나온 백악관 성명에서는 어느 구석에서도 대북정책에 변화가 있다는 냄새를 맡을 수 없다.
국가안보회의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대북정책과 관련해 설정해놓은 단기 목표가 무엇이며, 다음 단계에 취할 조치가 무엇인지 등을 가장 잘 엿볼 수 있는 것은 ‘뉴욕 타임스’ 백악관 출입기자 데이빗 생어의 기사다. 북한 선박 해상 저지가 현실화하기 2개월 전에 데이빗 생어의 기사에는 이미 ‘부시 행정부 한 고위 관리’의 말을 인용, ‘해상 봉쇄 등을 통한 대북 제재 가능성’이 언급됐다. 북한의 제2 핵시설을 다룬 7월20일자 ‘뉴욕 타임스’ 기사의 작성자 역시 데이빗 생어고, 콘돌리자 라이스의 말을 인용해 대북 협상 무용론→핵 야망 불포기론→정권교체 불가피론을 만질만질한 외교용어로 포장한 6월21일자 분석기사도 데이빗 생어의 작품이다.
물론 제목에 ‘북한 정권교체 임박’ 같은 자극적인 제목이 달린 것도 아니다. ‘2개의 핵무기 도전, 2개의 다른 전략’이 제목이다. 제목만 봐서는 그다지 눈길을 끌지도 않는다. ‘북한’이니 ‘정권교체’니 같은 말은 들어 있지도 않다. 한국 언론이 거의 기사화하지 않는 기사의 공통적인 요소는 모두 갖추었다. 그러나 이런 종류의 기사야말로 대북정책을 끌고 나가는 정책 결정자들이 여론을 형성해가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다.
일요일 아침 주요 방송사가 앞다투어 내보내는 ‘선데이 모닝 토크쇼’야말로 행정부 관리들의, 말 그대로 정책 ‘선전장’이다.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은 물론 행정부처 장관에서부터 부통령까지 모두 나서 여론몰이를 하고, 이튿날인 월요일 아침 신문에 큼지막한 기삿거리를 제공한다.
노련한 정책 결정자일수록 언론이 무엇을 좋아하고, 언론을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지를 꿰뚫어보고 있다. 주한 미군 재배치 현안 등에서 펜타곤은 미국 언론보다 한국 언론을 십분 활용했다.
미 2사단 재배치는 이미 한국 국방부와 상의가 끝난 상태였고, 누가 언제 입을 여느냐 하는 껄끄러운 문제만 남겨놓은 상태였다. 펜타곤은 슬쩍 가능성만 비쳤으나 한국 언론은 벌집 쑤신 모양새가 되었고, 펜타곤은 별 어려움 없이 2사단 재배치라는 미묘한 현안을 기정사실화할 수 있었다. 이 역시 프로의 작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