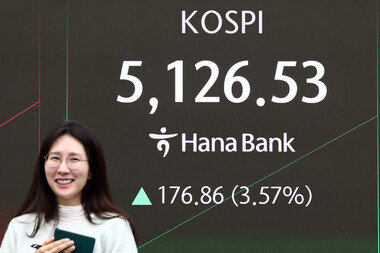그러나 컴퓨터가 놓이고 인터넷이 깔린다고 해서 곧바로 지식정보사회가 오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도식적인 믿음은 사실 위험하기 짝이 없는 것이다. 단순한 컴퓨터와 인터넷 보급률이 그 사회의 지식정보화 여부를 가늠하고 결정하는 척도가 될 수는 없다. 보다 중요한 문제는 컴퓨터와 인터넷을 사람들이 어떤 용도로 어떻게 사용하는지다. 문제는 테크놀로지의 발전 그 자체가 아니라 이러한 정보 기술의 발달이 어떻게 쓰이는지에 달려 있다. 똑같은 정보기술도 그 쓰임새에 따라 ‘정보적’이 될 수 있는가 하면, 정반대로 철저히 ‘비정보적’으로 쓰일 수도 있다. 양적 보급이 질적 쓰임새로 연결될 때라야만 정보화사회의 길이 열리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국가간, 계층간, 지역간의 ‘디지털 디바이드’뿐만이 아니다. 보다 긴요한 것은 정보 테크놀로지와 전통적 인쇄매체인 ‘책’ 사이에서 발생하고 있는 ‘매체간 디바이드’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의 상황은 낙관적이지 못하다.
우리나라의 정보 테크놀로지 보급은 선진국에 필적할 만한 수준에 도달하고 있지만, 우리 국민의 독서량은 일본 등 선진국 국민에 비해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조사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컴퓨터를 쓰는 시간이 증가하는 만큼 독서 시간은 그에 반비례하면서 급격히 줄고 있다. 가뜩이나 책을 읽지 않고 있는데 인터넷이 알량한 독서 시간마저도 앗아가고 있는 것이다. 컴퓨터가 책과 함께 가는 것이 아니라 책과 독서를 몰아내고 있다.
이런 현상은 장차 우리 사회에 큰 문제를 유발하기에 충분하다. 책을 읽는 사람은 컴퓨터를 ‘정보적’으로 쓸 수 있지만, 책을 읽지 않는 사람은 컴퓨터를 ‘비정보적’으로 쓰는 경향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정보 테크놀로지가 오히려 ‘지식’과 ‘정보’를 몰아낼 수 있는 것이 현대판 지식정보사회의 역설이다. 전국 어느 곳이든 초고속통신망으로 연결되고 펜티엄Ⅲ 컴퓨터가 모든 가정에 보급돼 있어도 인문사회과학적 풍토와 기반이 없는 한 지식정보화사회는 오지 않는다.
오늘날 한국의 청소년들은 컴퓨터를 순수 정보 테크놀로지로서 활용하기보다는 게임이나 채팅 등 여가 활용 수단으로만 활용하고 있지 않은가. 게임을 위하여 부모를 속이거나 가출하여 게임방을 전전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게임에 몰입하다 사망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다. 한국 청소년들은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한 집단적 게임에 있어서도 다른 나라에 비해 가히 초일류급이라고 한다. 게임을 모르면 친구들 사이에서 ‘왕따’를 당하는 현실부터가 비상식적이다. 이러한 사례는 일본에도 없고 미국에도 없다. 그만큼 한국은 게임의 천국이다.
게임·채팅 등 여가 수단 활용에 그쳐서는 곤란
물론 게임을 통하여 즐거움도 얻을 수 있고 휴식을 취할 수도 있을 것이다. 게임산업이 고부가가치를 낳는다는 사실도 잘 안다. 그러나 문제는 게임의 중독성이다. 요즘 게임은 최신 그래픽 디자인 기술을 차용하면서 다른 어떠한 오락보다 강력한 흡인력을 발휘하고 있다. 더욱이 게임은 사용자와 오락화면 사이에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강제함으로써 영화 등 전통적 오락매체에 비해 강력한 중독성을 유발할 수 있다. 이러한 견해는 최근의 심리학적 실험 결과에서도 입증되고 있다.
기회비용의 관점에서 보아도 이러한 게임 중독성은 큰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우리 청소년들이 컴퓨터 게임에서 얻는 즐거움과, 대신 그 시간에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를 읽거나 운동을 하면서 얻는 이득을 비교하면 장기적으로 과연 어떤 것이 나을까. 그러므로 진정한 지식정보사회를 이루려면 “너도나도 컴퓨터” “자나깨나 인터넷”을 합창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오늘날 보다 필요한 것은 정보 테크놀로지 캠페인이 아니라 오히려 독서 캠페인일지도 모른다. 책 없이 인터넷만으로 지식정보사회가 올 수는 없다. 만일 컴퓨터만 믿고 우리 청소년들에게 책을 읽히지 않는다면, 자칫 그들의 영혼과 미래를 ‘그릇된 정보사회’에 팔아 넘기는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