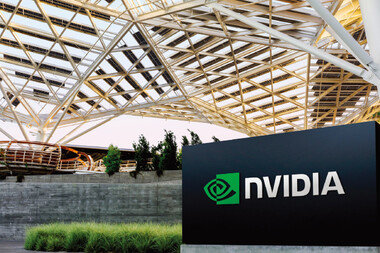‘티베트에 자유를’이라는 낙서 앞에 서 있는 티베트 승려. 티베트의 독립 요구는 북아일랜드 사태와 같이 공존할 수 없는 목적을 가진 사람들의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
티베트인의 혈통적 기원은 야루장푸 강 유역의 실발인(悉勃人)이 북쪽으로 세력을 확대해 칭하이성(靑海省), 쓰촨성(四川省)의 강인(羌人)과 융합했다는 게 일반적인 견해다. 여러 소국으로 분산돼 있던 티베트인들은 이후 실발인을 중심으로 뭉치는데, 7세기 초 손챈감포 왕이 세운 통일국가 ‘토번’이 역사상 최초의 티베트 왕국이다. 수도 라싸(拉薩)의 중심부에 있는 조캉사원(大昭寺)은 손챈감포 왕이 죽은 뒤 네팔 출신의 왕비와 당나라 출신의 왕비가 협력해 세운 것이다. 이 사원은 라마교(티베트 불교)의 최대 교파인 겔룩파 창시자 총카파(宗喀巴)의 상이 있는 최고의 성지다. 이 때문에 외국 관광객은 포탈라궁에 갈지 몰라도 티베트 순례자들은 조캉사원에 간다. 1959년과 1987년 라싸 대봉기도 조캉사원에서 불이 붙었고, 현재 티베트인들의 최후 저항지도 바로 이곳이다.
뉴욕 바드대학 교수인 이안 부르마는 티베트인들의 실제 속마음을 파악해보기 위해 라싸와 궁벽진 농촌에서 티베트인들을 만난 후 ‘뉴욕 리뷰’ 2000년 7월20일자에 기행문 ‘주박에서 풀린 티베트(Tibet Disenchanted)’를 실었다. 조캉사원 근처의 식당에서 만난 두 티베트 친구의 논쟁을 소개하면서 과연 티베트인들은 티베트 독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생생하게 전해준다. 둘은 모두 중국식 교육의 혜택을 입고 중국계 금융기관에서 일하고 있다.
티베트 현대화로 인해 전통과 민족주의 말살 불가피
열성적인 불교도 친구 A는 “라마교는 매우 소중하며 이 종교가 없다면 티베트인의 영혼은 시들어버릴 것”이라고 말한다. 중국식 현대화가 티베트를 부유하게 할지는 모르지만 티베트 전통(라마교)이 사라지면 삶의 질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견해다. 밤이 되자 이안 부르마는 한족이 거의 없는 나이트클럽으로 자리를 옮겨 A의 이야기를 좀더 솔직하게 들을 수 있었다. A는 베이징에서 공식행사가 열릴 때면 무슬림·몽골·먀오·위구르 등 55개 소수민족이 다채로운 민속의상을 입고 마오쩌둥(毛澤東) 초상화와 단상의 지도자들을 향해 춤을 추는 장면을 지적한다. 이 행사는 세부적으로 많은 것이 잘못된 데다 가소롭다. 그리고 은인인 체하는 중국 정부는 되레 소수민족에게 모욕감을 심어준다는 것이 그의 고백이다. 또한 종교가 없이는 티베트의 정체성이 소멸할 수밖에 없는데, 종교에 진지한 관심을 가지면 독립 선동자, 분열주의자라는 의심을 받기 때문에 티베트 종교를 공부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반면 그의 친구 B는 무슬림 티베트인이다. 그는 “라마교는 낡았고 중국 정부의 서부대개발과 같은 현대화가 티베트의 미래”라고 말한다. 또한 무슬림 티베트인들은 불교도 티베트인들에게 박해를 받았다며, ‘라마교 중심의 티베트’도 민족주의일 수밖에 없다고 항변한다. B는 중국어가 티베트어를 대체하고, 중국적인 세속경제와 대중문화가 티베트를 점령하는 것을 염려하지 않는다. 중국어가 티베트어보다 더 실용적이라면 중국어를 배우고, 앞으로 영어가 더 실용적이라면 영어를 배우는 게 낫다고 말한다. B의 처지에서 과거를 그리워하는 것은 낭비일 뿐이고 중국 정부가 은행 병원 기차 등 근대문명의 시혜를 더 많이 줄수록 좋다는 것이다. 굳이 우리에게 비유하자면, A는 독립운동 지지파이고 B는 식민지 근대화론을 지지하는 입장이지 않을까.
그런데 이안 부르마는 중국의 문화제국주의에 고통을 당했던 티베트인들은 가장 교육을 잘 받고 중국식 현대화와 중화주의로부터 이익을 얻은 사람들인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이 중국인의 역할을 잘하면 할수록 이에 얽매이는 딜레마에 빠진다면서, 결국 불교도 티베트인 A의 현실비평이 옳다는 견해를 견지한다. 중국의 티베트 현대화는 티베트 전통과 민주주의 말살, 종교 불관용 등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자신은 달라이 라마를 두둔한다는 것이다. 또 중국어로 교육받은 모든 엘리트 티베트인들이 티베트 전통의 ‘(불교적) 정교일치 신권정치’를 바라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설령 있다 해도 극소수이고 그들도 어쩔 수 없이 중국적인 세속 경제에 살아남기 위해 문화적 정체성을 잃어야 함을 인정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티베트인이라면 누구나,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더 큰 식민지적 굴욕감을 느낄 것이라는 게 부르마의 결론이다.
리처드 기어, 스티븐 시걸, 해리슨 포드, 우마 서먼 등 할리우드 스타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형태로 티베트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장 자크 아노 감독은 영화 ‘티베트에서의 7년’에서 중국을 악(惡)으로 묘사한 바 있다. 하지만 이안 부르마는 ‘뉴욕 리뷰’에 실은 또 다른 기행문 ‘찾아낸 지평선(Found Horizon)’에서 1950년 티베트를 중국이 강제 합병한 이후 큰 해를 끼친 것은 사실이지만, 절대악(중국)이 순진무구한 티베트를 파괴했다는 신화 역시 경계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시하마 교수도 “중국의 티베트 점령으로 수많은 티베트인이 살해됐으며 사원들이 파괴됐다”는 엔딩 자막이 흐르는 ‘티베트에서의 7년’은 서양인의 관점이라면서, 이보다는 마틴 스코시즈 감독의 ‘쿤둔’(달라이 라마의 존칭)이 티베트인의 관점에서 티베트 현대사를 그린 영화라고 말한다. ‘쿤둔’은 평화적인 시대의 티베트, 중국의 군사력에 의해 비폭력 종교국가인 티베트가 소멸되는 과정, 고뇌하는 어린 시절의 달라이 라마 14세, 라싸를 탈출해 인도로 망명하는 달라이 라마의 극적인 장면이 나오면서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 적을 증오하는 마음 어느 것도 번뇌이며, 그 번뇌로부터 자신을 해방하는 것이 진정한 해방”이라는 달라이 라마의 음성이 오버랩된다. 이시하마 교수는 이 장면이 달라이 라마의 ‘자신으로부터의 해방’과 비교해 ‘중국의 (군사적) 강제적 해방’이 얼마나 얄팍한 것인지를 나타내려는 감독의 의도라고 한다.
티베트는 중국의 나라? 달라이 라마의 나라?
그러면 티베트는 과연 누구의 나라여야 좋은가. 중국? 달라이 라마? A? B? 극소수의 라마교 신권정치 지지자? 만약 현재의 티베트 자치구만 독립한다면 500만명의 티베트인 중에 티베트 자치구 바깥, 즉 1950년 쓰촨, 윈난, 칭하이 등으로 떨어져나가 그곳에 살고 있는 티베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만약 그들을 포함한 티베트의 독립이라면 과연 중국이 현재의 영토 중 4분의 1을 포기할까. 또한 모든 티베트인들은 달라이 라마의 해결책, 즉 중앙정부가 외교와 국방을 담당하고 티베트인들이 자치를 하는 형태를 지지하고 있는 것일까. 그렇게 되면 티베트에 살고 있는 한족과 B 같은 무슬림 티베트인들은 어떻게 되는가. 이안 부르마는 한 영국 역사가의 말을 빌려, 티베트는 북아일랜드와 같이 공존할 수 없는 목적을 가진 사람들의 갈등이 계속되는 곳이라고 지적한다.
아니면 티베트는 역사적 공동체는 있지만 국가가 없는 쿠르드족과 같은 처지일까. 그렇다면 이안 부르마의 탄식대로 달라이 라마의 나라 사람들은 독립이 불가능하더라도 ‘내년에는 라싸에서라는 희망 속에서’ 달라이 라마를 경배하고 그 자신들을 연민하는 도리밖에 없는 것일까. 티베트 독립으로 동아시아에 제국의 종언이 올지, 새로운 형태의 연방국가가 탄생할지, 또는 중화민족 대가정주의가 성공할지 귀추가 주목되는 요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