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힘이 딸리는 쪽이 먼저 땅바닥으로 굴러떨어져 마치 죽은 것처럼 꼼짝도 하지 않는다. 배를 위로 하고 발은 자유롭게 벌리거나 꼬부린 자세다. 한마디로 죽은 척하는 것이다. 그런 상태로 1~2분 지나 안전하다고 판단하면 사슴벌레는 다리를 부르르 떨며 다시 몸을 뒤집고는 아무렇지도 않게 제 갈 길을 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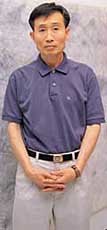
곤충학자 김정환씨는 수사슴벌레의 투쟁을 “승자도 패자도 없는 싸움”이라고 말한다. “어찌 보면 이 싸움에서는 죽은 척 잘하는 녀석이 승자죠. 상대가 누워 꼼짝도 안 하면 큰 턱을 가진 힘센 녀석이 넌더리를 내고 그 자리를 떠나니까요.” 수컷들의 죽은 척하기에 비하면 산란을 앞둔 암컷들의 싸움은 사생결단이다. “시장통에서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싸우는 여자들 모습과 비슷해요. 웬만한 힘으로는 떼어놓을 수도 없죠.”(김정환)

그러려면 성급한 드로잉 이전에 진득한 관찰이 필요했다. 호리병벌이 반죽한 흙을 풀잎에 문질러 바르면서 흙덩이를 길고 가늘게 늘여 얇은 벽을 쌓아올리는 모습을 보지 않고서는 질그릇 같은 호리병벌의 둥지를 제대로 그릴 수 없다. 물방울 같은 알에서 깜찍한 애벌레가 되고, 번데기 속에서는 죽은 듯하다 어느 날 나비 공주로 변신하는 생의 신비를 모르고선 아름다운 나비의 날갯짓조차 식상한 드라마에 불과하다.

우연히 생태모임에 갔다가 곤충학자 김정환씨를 만난 것은 행운이었다. 1년이면 절반 이상을 산과 들에서 보내는 김씨의 생태답사에 동행하며 김교수는 풀벌레와 잡초에서 생명의 기운을 포착했다. 변산으로, 영월로, 우포로 답사를 다니는 동안 어느새 그의 화폭에는 나비, 메뚜기, 꿀벌, 호리병벌, 왕잠자리, 사슴벌레, 무당벌레, 물장군, 소금쟁이가 가득했다.

그림 ‘비’(飛)(한지에 채색, 95년) 속의 왕잠자리는 짝짓기 대신 곡예비행 연습에 몰두하는 남다른 구석이 있다. 그는 짝을 찾고 영역싸움을 하느라 정신없는 동료들을 바라보며 ‘이렇게 사는 건 너무 부질없다’고 생각하는 철학자이기도 하다. 맞바람을 타고 비행하거나 공중회전 하는 법을 익히는 한편, 날개를 접지 못하는 잠자리의 운명을 거부하고 하루에 몇 백번씩 날개 접는 연습을 통해 퇴화한 힘살을 되살리려 애쓴다. 모두들 그를 비웃지만 씩씩한 날개잠자리가 제자가 되겠다고 찾아온다. 잠자리의 한계에 도전하며 진화를 꿈꾸던 두 잠자리는 회오리바람 속으로 사라진다.

그림 ‘물장군’(한지에 채색, 2002년)에서 늪의 폭군 물장군(수중생활을 하는 노린재)은 지금 어디로 갔을까. 덩치 크고 힘 좋은 물장군은 둔치에 집을 짓고 물방개를 앞세워 수서곤충들을 노예로 삼는다. 그러나 물장군의 횡포에 반발한 장구애비가 오른팔 물방개를 죽이고 물장군의 궁전도 폭발시키면서 혁명은 끝난다. 이 모든 둔치의 역사를 전하는 것은 당시 애벌레의 몸으로 둔치를 탈출한 하루살이.
‘넓적사슴벌레 죽은 척하다’를 펼치면 우리는 한 마리 곤충이 되어 동양화 속으로 들어간다. 나는 장자인가, 나비인가.
















